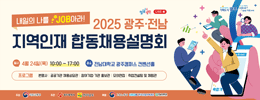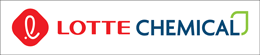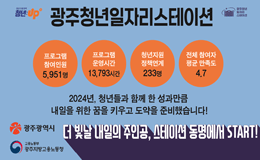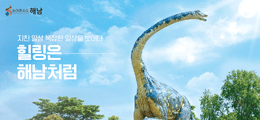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6월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聖오월’ 검은방
 ‘인산’ |
그의 작품을 보면 시가 떠오른다. 강렬하면서도 무참하다. 흥미로운 것은 시를 환기하는 작품은 다시 시를 잉태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준석 작가는 황지우 시인의 시 ‘聖오월’을 모티브로 판화작업을 했다고 했다. 해골 위에 놓인 붉은 꽃은 섬뜩하면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하늘로부터 꽃을 향해 빛이 내려오지만 우울한 아우라를 거둘 수는 없다.
이준석 작가가 오월 시·판화 전을 연다.
오는 6월 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B1 전시실에서 ‘검은방’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모두 30여 점이 출품됐다. 판화 25을 비롯해 회화 등 모두 30여 점은 작가의 5월에 대한 관점, 작업에 대한 심미안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다.
이밖에 전시장에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2’를 소재로 작업한 ‘인산’, 박선욱 시인의 ‘누이야’를 모티브로 한 ‘누이야’ , 최하림 시인의 ‘죽은자들이여 너희는 어디 있는가’에서 작품을 뽑아낸 ‘귀가’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작가는 80년대, 90년대 시를 연계한 전시를 많이 했다. 80년대는 시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현장성을 강조하는 시가 많이 창작됐다. 오월시 동인들과 함께 책을 묶어낼 만큼 그는 5월에 대한 책임의식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듯했다.
입구에서 만나는, 앞서 언급한 황지우 시인의 시를 모티브로 한 작품 ‘聖오월’은 이번 전시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검은방’이라는 전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오늘의 시점에서 왜 오월이 현재형인지를 반문한다.
“망월가는 이맘때쯤이면/ 아카시아 꽃봉지 들고 다가오는 산 전체에서/ 막 양치질한 딸아이/ 입내 같은 것이 났지/ 꼭 죽음이 아니어도/ 이렇듯 신성이 찰나에 임하는,/ 잎새로 噴射(분사)되는 햇살 샤워/ 낯뜨거워라…”
황지우의 시는 해마다 돌아오는 오월이 의례적이며 정치인들의 명분을 위한 ‘제의’로 전락한 것을 통탄한다. 그러므로 ‘聖오월’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이준석 작가는 판화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에 몰입했다. 하나는 시에 맞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를 읽고 난 느낌을 옮긴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작품이 주는 울림과 ‘검은방’의 상징성은 무겁고 깊다.
이 작가는 “시와 판화는 80, 90년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형을 바꿀 만큼 강력한 문화예술매체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 중심에 광주5·18민중항쟁이 있었다”며 “그 시절 목숨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 유효한 것인지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는 심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 이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상(1999)를 수상했다. 광주미술인공동체회장과 제1·2회 통일미술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오월시·판화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준석 작가는 황지우 시인의 시 ‘聖오월’을 모티브로 판화작업을 했다고 했다. 해골 위에 놓인 붉은 꽃은 섬뜩하면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하늘로부터 꽃을 향해 빛이 내려오지만 우울한 아우라를 거둘 수는 없다.
오는 6월 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B1 전시실에서 ‘검은방’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모두 30여 점이 출품됐다. 판화 25을 비롯해 회화 등 모두 30여 점은 작가의 5월에 대한 관점, 작업에 대한 심미안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다.
이밖에 전시장에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2’를 소재로 작업한 ‘인산’, 박선욱 시인의 ‘누이야’를 모티브로 한 ‘누이야’ , 최하림 시인의 ‘죽은자들이여 너희는 어디 있는가’에서 작품을 뽑아낸 ‘귀가’ 등도 만날 수 있다.
입구에서 만나는, 앞서 언급한 황지우 시인의 시를 모티브로 한 작품 ‘聖오월’은 이번 전시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검은방’이라는 전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오늘의 시점에서 왜 오월이 현재형인지를 반문한다.
“망월가는 이맘때쯤이면/ 아카시아 꽃봉지 들고 다가오는 산 전체에서/ 막 양치질한 딸아이/ 입내 같은 것이 났지/ 꼭 죽음이 아니어도/ 이렇듯 신성이 찰나에 임하는,/ 잎새로 噴射(분사)되는 햇살 샤워/ 낯뜨거워라…”
황지우의 시는 해마다 돌아오는 오월이 의례적이며 정치인들의 명분을 위한 ‘제의’로 전락한 것을 통탄한다. 그러므로 ‘聖오월’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이준석 작가는 판화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에 몰입했다. 하나는 시에 맞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를 읽고 난 느낌을 옮긴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작품이 주는 울림과 ‘검은방’의 상징성은 무겁고 깊다.
이 작가는 “시와 판화는 80, 90년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형을 바꿀 만큼 강력한 문화예술매체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 중심에 광주5·18민중항쟁이 있었다”며 “그 시절 목숨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 유효한 것인지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는 심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 이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상(1999)를 수상했다. 광주미술인공동체회장과 제1·2회 통일미술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오월시·판화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