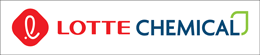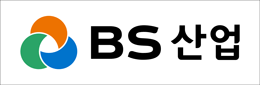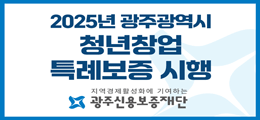고령사회와 요양보호사-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전 카트만두대학교 객원교수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를 넘긴 노인이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노인 인구의 약 1.6%가 100세 장수할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는데 곧 두 번째 환갑도 낯설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치매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돌봄이 개인과 가족 단위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요즈음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요양보호사는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등급 판정을 받은 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월 남짓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취업 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과 국고 지원 외에 일부만 대상자가 부담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첫째 신체 활동 지원으로 식사, 목욕 도움, 누워 지내는 환자들의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이나 배뇨·배변 도움 외에 기저귀 교환 등을 한다. 둘째,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청소·세탁이 주를 이루고 셋째,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는 산책·병원 동행·일상 업무 대행 등이다. 또 말벗, 이메일·편지 대필, 생활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거동이 불편하고 뼈가 약하여 골절 위험성이 큰 노인들을 돌보는 데는 세심한 주의와 따뜻한 심성,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도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 1월 초부터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 시간씩 총 240시간 이수하였다. 매일 8시간의 강의를 듣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단 한 번의 결석이나 지각도 없이 6주간 완주하였다. 노인, 특히 치매 환자 돌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기 강의를 듣고 실습을 통하여 위기 상황 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국시원에서 보내온 자격 시험의 합격 통지 일련번호는 160만을 훌쩍 넘었다.
이렇듯 자격증 소지자가 많고 구인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취업하는 이는 많지 않다. 가족을 돌보고 일정 비율의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는 교육 자체가 유익하기에 취업과 무관하게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어떤 이들은 짧은 기간 취업했다가 그만 둔다. 막중한 책임 업무에 비해 보수가 최저 임금 수준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이 요양 돌봄 외에 텃밭 일, 대청소, 김장이나 잔칫상 차림을 요구하는 등 파출부처럼 대해서 마찰을 빚는다. 남성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도 있다.
최근의 출생률 급감은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통폐합과 폐쇄로 나타나고 유치원과 학원 등은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 맞벌이하는 젊은이, 초로의 자녀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앓는 노부모를 전담하여 돌보기는 어렵다.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재가 요양 복지, 요양시설 입주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기존 역할의 일부이다. 즉 개인활동 지원서비스의 병원 동행만을 떼어서 ‘병원 동행 매니저’라 부르고 대상자와 함께 병원 오가는 일, 병원 내에서의 돌봄으로 한정한다. 비교적 수월하고 보수도 좋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만 명 이상의 미취업 요양 보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며 초고령사회를 향한 대안이다.
필자가 지난 1월 초부터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 시간씩 총 240시간 이수하였다. 매일 8시간의 강의를 듣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단 한 번의 결석이나 지각도 없이 6주간 완주하였다. 노인, 특히 치매 환자 돌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기 강의를 듣고 실습을 통하여 위기 상황 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국시원에서 보내온 자격 시험의 합격 통지 일련번호는 160만을 훌쩍 넘었다.
이렇듯 자격증 소지자가 많고 구인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취업하는 이는 많지 않다. 가족을 돌보고 일정 비율의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는 교육 자체가 유익하기에 취업과 무관하게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어떤 이들은 짧은 기간 취업했다가 그만 둔다. 막중한 책임 업무에 비해 보수가 최저 임금 수준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이 요양 돌봄 외에 텃밭 일, 대청소, 김장이나 잔칫상 차림을 요구하는 등 파출부처럼 대해서 마찰을 빚는다. 남성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도 있다.
최근의 출생률 급감은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통폐합과 폐쇄로 나타나고 유치원과 학원 등은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 맞벌이하는 젊은이, 초로의 자녀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앓는 노부모를 전담하여 돌보기는 어렵다.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재가 요양 복지, 요양시설 입주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기존 역할의 일부이다. 즉 개인활동 지원서비스의 병원 동행만을 떼어서 ‘병원 동행 매니저’라 부르고 대상자와 함께 병원 오가는 일, 병원 내에서의 돌봄으로 한정한다. 비교적 수월하고 보수도 좋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만 명 이상의 미취업 요양 보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며 초고령사회를 향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