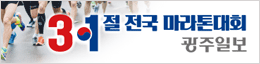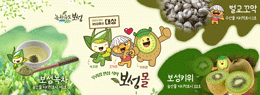[이태원 희생 광주·전남 가슴 아픈 사연들] “우리 세 모녀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목포서 간호사 꿈 키우던 딸
뇌사 하루만에 끝내 숨져
뇌사 하루만에 끝내 숨져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31일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내 딸, 이제 고생 끝났다고, 세 모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니….”
광주시 북구의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모(28)씨의 빈소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하염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문객이 찾아와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흐느끼던 박씨 어머니는 고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여동생 또한 간신히 일어서 조문객을 맞고자 했으나 한 마디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박씨 어머니는 “뒤엉킨 사람들 사이에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며 “사진 속 눈망울을 보면 금방이라도 ‘엄마’하고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다”고 오열했다.
박씨는 간호사 꿈을 갖고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착실한 딸이었다.
광주가 고향인 박씨는 부산으로 건너가 간호 보조로 근무하면서 일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대학 학비를 마련했다. 이후 영암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웠다.
2년여 전에는 유명 대학병원에 입사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박씨는 목포에서 방을 구해 생활하면서도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할 만큼 정이 많았다고 한다. 박씨 지인들 또한 그를 의지가 되는 사람, 밝고 친근하면서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참사 당시 박씨는 목포에서 같은 건물 내 원룸을 얻어 거주하던 친구 노모(28)씨와 함께 이태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박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면서도 꼬박 하루를 버텼다.
병원을 지키던 가족들 또한 “살아만 있어 달라”며 희망을 품고 박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 북구의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모(28)씨의 빈소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하염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문객이 찾아와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흐느끼던 박씨 어머니는 고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여동생 또한 간신히 일어서 조문객을 맞고자 했으나 한 마디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박씨는 간호사 꿈을 갖고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착실한 딸이었다.
광주가 고향인 박씨는 부산으로 건너가 간호 보조로 근무하면서 일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대학 학비를 마련했다. 이후 영암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웠다.
박씨는 목포에서 방을 구해 생활하면서도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할 만큼 정이 많았다고 한다. 박씨 지인들 또한 그를 의지가 되는 사람, 밝고 친근하면서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참사 당시 박씨는 목포에서 같은 건물 내 원룸을 얻어 거주하던 친구 노모(28)씨와 함께 이태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박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면서도 꼬박 하루를 버텼다.
병원을 지키던 가족들 또한 “살아만 있어 달라”며 희망을 품고 박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