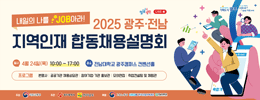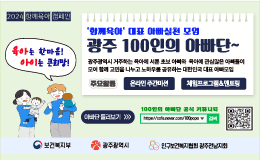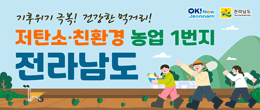4월은 가장 잔인한 달-권순긍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
영국 시인 T.S.엘리엇(Eliot, 1888~1965)은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불렀다. 그 시의 첫 구절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로 시작된다.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이리라. 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한다.
묘하게도 우리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4월에 ‘잔인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본다. 해방 후 1948년 제주 4·3을 시작으로 1960년 4·19를 지나 2014년 4·16 ‘세월호’까지 우리 역사의 처참한 구비들을 4월이 장식하고 있다.
제주 4·3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947년 3월 1일, 기념식을 하던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해 여섯 명이 죽고 여덟 명이 중경상을 입는 ‘3·1절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분노한 도민들이 총파업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군정 경찰들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과 2500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을 구속하였다. 더욱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맞서 1948년 4월 3일 경찰서를 습격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4·3이 터진 것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도민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3만 명이 군경의 총에 사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성이 작동을 멈춘 학살과 광기의 시대였다.
제주 4·3의 억울한 희생은 1989년 4월 3일에 와서야 41년 만에 처음으로 ‘4·3 추모제’를 지낼 정도로 금기시됐었다. 엄혹한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줄기차게 4·3을 소설화한 현기영은 ‘목마른 신들’에서 4·3의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슬픔이란 대체로 눈물과 한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3의 슬픔은 눈물로도 필설로도 다 할 수 없다. 그 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나온다고 말한다.”
4·19는 또 어떤가? 이른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로 시작하여 마산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자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4·18 고려대 시위가 정치 깡패들에 의해 습격당하자 이에 격분한 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4월 19일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피의 화요일’이 시작됐다. 경무대로 진격하던 185명의 무고한 학생들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죽어갔다. 결국 4월 25일 300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까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승객 476명을 실은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한 일반 탑승객 74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조류가 거센 전남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 51분 단원고 학생들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계속 흘러나왔다. 9시 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지만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선장을 비롯한 기관부 선원 일곱 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께 침몰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침몰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아홉 명으로 생때같은 304명의 젊은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니 ‘세월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이런 역사의 횡포나 과오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 4·3의 슬픔을, 4·19 혁명의 함성을, 그리고 4·16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기억을 해야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도 4월이지 않은가!
제주 4·3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947년 3월 1일, 기념식을 하던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해 여섯 명이 죽고 여덟 명이 중경상을 입는 ‘3·1절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분노한 도민들이 총파업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군정 경찰들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과 2500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을 구속하였다. 더욱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맞서 1948년 4월 3일 경찰서를 습격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4·3이 터진 것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도민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3만 명이 군경의 총에 사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성이 작동을 멈춘 학살과 광기의 시대였다.
4·19는 또 어떤가? 이른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로 시작하여 마산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자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4·18 고려대 시위가 정치 깡패들에 의해 습격당하자 이에 격분한 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4월 19일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피의 화요일’이 시작됐다. 경무대로 진격하던 185명의 무고한 학생들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죽어갔다. 결국 4월 25일 300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까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승객 476명을 실은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한 일반 탑승객 74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조류가 거센 전남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 51분 단원고 학생들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계속 흘러나왔다. 9시 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지만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선장을 비롯한 기관부 선원 일곱 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께 침몰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침몰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아홉 명으로 생때같은 304명의 젊은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니 ‘세월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이런 역사의 횡포나 과오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 4·3의 슬픔을, 4·19 혁명의 함성을, 그리고 4·16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기억을 해야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도 4월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