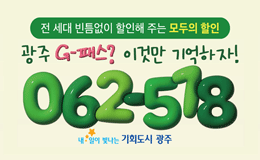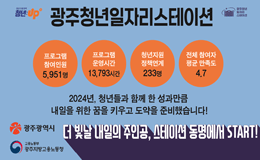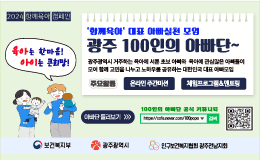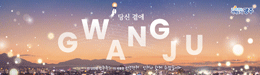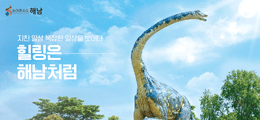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16> 의병장들의 화려한 승전의 기록 ⑥
의병장들에 시호·벼슬 내려 삶과 업적 기리다
고경명 ‘충렬’, 김천일 ‘문열’
최경회 ‘충의’, 김덕령 ‘충장’
임계영, 병조판서로 증직
변사정, 사헌부 장령 추증
정려·사당 지어 배향
후손에 충신의 모범으로 삼아
고경명 ‘충렬’, 김천일 ‘문열’
최경회 ‘충의’, 김덕령 ‘충장’
임계영, 병조판서로 증직
변사정, 사헌부 장령 추증
정려·사당 지어 배향
후손에 충신의 모범으로 삼아
 선조가 1630년 고경명에게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아들 종후, 인후, 월파 유팽로, 청계 안영 등과 함께 배향하기 위해 1601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에 지은 포충사. 1868년 전국적으로 사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도 충신의 사당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
임란 의병장들에 대해 조정은 시호와 벼슬을 내리거나 더 올려주며 그 공을 기렸다. 특히 시호는 가문의 큰 영광으로 여겼다. 또 정려나 사당을 지어 배향하게 하면서 후손과 지역민들에게 충신의 모범으로 삼았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 새로 설치되거나 복원된 사당 대부분이 겉모습만 과거 그대로해 외진 곳에 자리하고, 돌보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방문객들의 발길 역시 뜸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호는 왕·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한다.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증직돼 시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왕을 제외한 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는데, 시호를 받을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인척 등이 행장(行狀)을 작성해 예조에 제출하면, 봉상시에서 세 가지 시호를 정해 홍문관에 보낸다. 여러 관원들이 논의해 이를 이조에 넘기고 국왕이 낙점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순신의 경우 봉상시에서 의논한 세 가지 시호는 ‘충무(忠武)’·‘충장(忠壯)’·‘무목(武穆)’이었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의 수도 정해져 있었는데, 1438년 194자에서 107자가 첨가돼 301자가 됐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120자 정도였다. 예를 들어 ‘문(文)’은 ‘온 천하를 경륜해 다스리다’,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다’, ‘공경하고 곧으며 자혜롭다’, ‘총민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등 15가지로 쓰였다.
고경명에게는 1630년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학예문관 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등에 추서되고, 의정부 좌찬성으로 가증되기도 했다. 1630년 함께 전사한 둘째 아들 인후에게는 예조참의가 추서돼 나중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가증되고, ‘의열’이라는 시호가, 큰아들 종후는 도승지로 추서됐다가 이조판서로 가증되고, ‘효열’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01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에 포충사를 짓고 선조가 편액을 하사했으며, 월파 유팽로, 청계 안영도 배향됐다. 1868년 전국적으로 사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도 충신의 사당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김천일은 1618년 ‘문열’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603년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고, 나주 서문 밖에 정열사를 짓게 하고 헌액을 하사했다. 1604년 진주에도 창열사를 짓게 하고 숭정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가증했다. 정열사에는 천일의 아들 상건, 양산숙 등이, 진주 창열사에는 김시민, 최경회 등과 배향됐다. 1966년에는 나주읍 남산에 동상 이 세워졌다.
최경회에게는 1633년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593년 8월 7일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증직되고, 1627년 좌찬성에 가증되며 화순 능주 포충사에 배향됐다. 1747년 관노 귀동과 득손이 경회의 경상우도병사마사인(1582년 3월 제조)을 발견했는데, 영조가 감동해 동으로 갑을 만들고 진주에 인각(印閣)을 세웠다.
형제의병장인 강희보는 영조 때 호조좌랑, 강희열은 병조참의에 각각 추증됐다. 오봉 정사제는 1754년 홍문관 부수찬으로 증직됐다가 1868년 도승지 겸 홍문관 직제학, 1884년 이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가증됐다.
김덕령에게는 1785년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면서 덕령이 태어난 석저촌을 충효리라고 부르고 비를 세웠다. 1661년 신원이 복구되고 1668년 병조참의에 추증됐다. 1678년 벽진서원에 제향됐고, 1681년 병조판서에 가증됐다. 형 덕홍은 지평, 동생인 덕보는 집의로 추증됐다. 1788년에는 좌찬성에 가증됐다.
임계영은 귀향한 뒤 양주목사, 정주목사, 순창군수 등을 역임했으며, 1597년 10월 27일 화순 모후산 유마사에서 숨지자 병조판서로 증직됐다.
도탄 변사정은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고 운봉의 용암서원에 배향됐다. 왕득인 등 7의사의 공적은 조정에 1804년에야 알려졌다. 왕득인,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은 지평에, 왕의성에게는 좌승지에, 고정철, 오종은 호조좌랑에 각각 추증되고, 충효사에 배향됐다. 모의장 최대성에 대해서는 1750년 우산 안방준 등 보성지역 사림 36명이 그의 공적을 적은 상소를 올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충사 건립이 허락된 바 있다. 보성 충절사에 대성과 그의 아들 언립·후립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퇴은당 염걸은 1649년 자헌대부 병조판서, 동생인 염서와 염경은 각각 통정대부 병조참의와 승정원 부승지, 염홍립은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각각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오천 김경수는 장성에서 3차례 거병했는데, 이후 군자감정, 공조참판, 의금부동지사, 중추부동지사 등에 임명됐으나 출사를 거부하고 장성에 머물렀다. 열사 최욱은 숙종 때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소포 나덕명은 순조 때 윤광보가 장계를 올려 정려가 내리고, 나주의 금호사, 충장사, 금산의 금곡사, 종성의 창렬사, 무안의 소포사 등에 각각 배향됐다. 금산대첩비에도 덕명의 사적이 기록돼 있다.
해광 송제민은 1789년 사헌부 지평에 추증됐으며, 운암서원에 배향됐다.
삽봉 김세근은 1605년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선무원종훈에 공신으로 기록됐으며, 부인은 정부인으로 하고 정려를 내렸다.
습정 임환은 숙종 때 좌승지에 추증돼 유림에서 사우를 지어 위패를 모셨다. 충민공 양산숙은 좌승지에 증직됐으며, 1635년 그와 그 가족 7명에게 충신, 효자, 열녀, 절부라며 정려(양씨삼강문)가 내려졌다. 이정란은 1807년 ‘충민’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등에 추증됐다.
표의장 심우신은 선무공신록에 기록되고, 병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증직됐다.
월파 유팽로는 사간원 사간에, 아내는 정열부인에 추증되고 정려가 하사됐다. 충장공 양대박은 1592년 7월 7일 숨졌으며, 4년 뒤 병조참의에 제수됐다가 나중에 병조판서로 추증됐다. 아들 시호와 함께 모신 부자충의문이 남원에 있다. 죽천 범기생은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복룡사에 배향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경명에게는 1630년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학예문관 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등에 추서되고, 의정부 좌찬성으로 가증되기도 했다. 1630년 함께 전사한 둘째 아들 인후에게는 예조참의가 추서돼 나중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가증되고, ‘의열’이라는 시호가, 큰아들 종후는 도승지로 추서됐다가 이조판서로 가증되고, ‘효열’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01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에 포충사를 짓고 선조가 편액을 하사했으며, 월파 유팽로, 청계 안영도 배향됐다. 1868년 전국적으로 사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도 충신의 사당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1618년 ‘문열’이라는 시호를 받은 김천일을 모시기 위해 진주성 안에 지은 창열사. 그는 의정부 영의정에 가증됐다. |
 1633년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진 최경회와 문홍헌, 을미왜변 때 순국한 조현 등을 모신 화순 능주의 삼충각. |
형제의병장인 강희보는 영조 때 호조좌랑, 강희열은 병조참의에 각각 추증됐다. 오봉 정사제는 1754년 홍문관 부수찬으로 증직됐다가 1868년 도승지 겸 홍문관 직제학, 1884년 이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가증됐다.
 1785년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김덕령을 기리기 위해 1975년 조성된 충장사. |
임계영은 귀향한 뒤 양주목사, 정주목사, 순창군수 등을 역임했으며, 1597년 10월 27일 화순 모후산 유마사에서 숨지자 병조판서로 증직됐다.
도탄 변사정은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고 운봉의 용암서원에 배향됐다. 왕득인 등 7의사의 공적은 조정에 1804년에야 알려졌다. 왕득인,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은 지평에, 왕의성에게는 좌승지에, 고정철, 오종은 호조좌랑에 각각 추증되고, 충효사에 배향됐다. 모의장 최대성에 대해서는 1750년 우산 안방준 등 보성지역 사림 36명이 그의 공적을 적은 상소를 올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충사 건립이 허락된 바 있다. 보성 충절사에 대성과 그의 아들 언립·후립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퇴은당 염걸은 1649년 자헌대부 병조판서, 동생인 염서와 염경은 각각 통정대부 병조참의와 승정원 부승지, 염홍립은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각각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오천 김경수는 장성에서 3차례 거병했는데, 이후 군자감정, 공조참판, 의금부동지사, 중추부동지사 등에 임명됐으나 출사를 거부하고 장성에 머물렀다. 열사 최욱은 숙종 때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추증되고 정려를 세워 배향했다.
소포 나덕명은 순조 때 윤광보가 장계를 올려 정려가 내리고, 나주의 금호사, 충장사, 금산의 금곡사, 종성의 창렬사, 무안의 소포사 등에 각각 배향됐다. 금산대첩비에도 덕명의 사적이 기록돼 있다.
해광 송제민은 1789년 사헌부 지평에 추증됐으며, 운암서원에 배향됐다.
삽봉 김세근은 1605년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선무원종훈에 공신으로 기록됐으며, 부인은 정부인으로 하고 정려를 내렸다.
습정 임환은 숙종 때 좌승지에 추증돼 유림에서 사우를 지어 위패를 모셨다. 충민공 양산숙은 좌승지에 증직됐으며, 1635년 그와 그 가족 7명에게 충신, 효자, 열녀, 절부라며 정려(양씨삼강문)가 내려졌다. 이정란은 1807년 ‘충민’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등에 추증됐다.
표의장 심우신은 선무공신록에 기록되고, 병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증직됐다.
월파 유팽로는 사간원 사간에, 아내는 정열부인에 추증되고 정려가 하사됐다. 충장공 양대박은 1592년 7월 7일 숨졌으며, 4년 뒤 병조참의에 제수됐다가 나중에 병조판서로 추증됐다. 아들 시호와 함께 모신 부자충의문이 남원에 있다. 죽천 범기생은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복룡사에 배향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