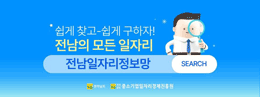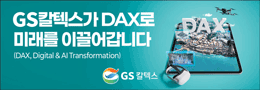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신호남지] 강진 칠량옹기 - 김형주
전라도 들여다보기
‘남도답사 1번지’로 일컬어지는 강진은 다종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 먹거리가 지천으로 어우러진 보배로운 땅이다.
강진은 백제때 도무군(道武郡)과 동음현(冬音縣)이 있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도무군을 양무군(陽武郡)으로, 동음현은 탐진현(耽津縣)으로 개칭하였다. 940년 양무군이 도강현(道康縣)으로 개칭되어 1018년에 영암군에 이속되었다. 탐진현은 처음 영암군에 속했다가 후일 장흥부에 속하게 되었다. 1417년에 도강과 탐진의 두 현을 합쳐서 강진현으로 만들고 탐진에 치소를 둠으로써 강진이 탄생하였다.
고려시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청자기술을 도입해 점차 독창적인 기술로 독자적인 청자문화를 일구어냈는데, 남부지방에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산출지가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 산재하고 있었다. 양질의 점토가 풍부하고, 만들어진 청자를 해로를 통해 개경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청자는 희귀성으로 인해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에 속하여 서민들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기물(器物)이었다면, 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물로는 옹기를 들 수 있다. 청자와 더불어 강진 칠량면 봉황리 일대에서는 예로부터 옹기제작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옹기의 수요가 줄고 고된 일을 꺼리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현재 칠량옹기의 명맥은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옹기장 정윤석씨와 전수자인 아들 영균씨가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칠량옹기’(七良甕器)는 한때 내륙지방은 물론 범선에 실려 무안, 흑산도, 완도, 진도, 멀리는 경상도, 제주도까지 팔려나가기도 하였다. 칠량옹기를 비롯한 전라도옹기는 판장타렴법이라는 제작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판장(板張)타렴법’이란 잘 반죽한 점토를 널빤지처럼 형태를 만들어 놓아두고, 원형의 바닥을 형성한 다음 점토판을 그 위에 둥그렇게 세워 올리면서 옹기를 성형하는 기법이다. 판장타렴법의 장점은 옹기의 기벽(器壁)을 만드는데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벽의 두께가 일정하며 기벽이 튼튼하여 2∼3섬의 곡식의 저장이 가능한 대형옹기의 제작도 용이하다는 점이다.
강진 칠량지역에서 옹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자문화가 쇠퇴하면서 청자를 빚던 도공의 후예들이 옹기제조에 종사할 수 있었고, 선박을 이용한 옹기의 운송으로 대량판로의 확보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그릇인 옹기는 통기성과 저장성이 뛰어나고, 식생활용구에서 주생활용구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용기가 아닐 수 없다.
해방이후 한 동안은 광명단(光明丹: Pb3O4)이 들어간 유약을 발라 유난히 번들거리는 광택이 나는 개량옹기가 시중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량옹기는 납 성분이 기벽의 기포를 완전히 차단하여 간장이나 된장의 충분한 발효가 발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질박하면서도 정겨운 조상들의 일상생활의 동반자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 곁을 떠나버린 옹기를 다시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강진은 백제때 도무군(道武郡)과 동음현(冬音縣)이 있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도무군을 양무군(陽武郡)으로, 동음현은 탐진현(耽津縣)으로 개칭하였다. 940년 양무군이 도강현(道康縣)으로 개칭되어 1018년에 영암군에 이속되었다. 탐진현은 처음 영암군에 속했다가 후일 장흥부에 속하게 되었다. 1417년에 도강과 탐진의 두 현을 합쳐서 강진현으로 만들고 탐진에 치소를 둠으로써 강진이 탄생하였다.
청자는 희귀성으로 인해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에 속하여 서민들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기물(器物)이었다면, 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물로는 옹기를 들 수 있다. 청자와 더불어 강진 칠량면 봉황리 일대에서는 예로부터 옹기제작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옹기의 수요가 줄고 고된 일을 꺼리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현재 칠량옹기의 명맥은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옹기장 정윤석씨와 전수자인 아들 영균씨가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강진 칠량지역에서 옹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자문화가 쇠퇴하면서 청자를 빚던 도공의 후예들이 옹기제조에 종사할 수 있었고, 선박을 이용한 옹기의 운송으로 대량판로의 확보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그릇인 옹기는 통기성과 저장성이 뛰어나고, 식생활용구에서 주생활용구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용기가 아닐 수 없다.
해방이후 한 동안은 광명단(光明丹: Pb3O4)이 들어간 유약을 발라 유난히 번들거리는 광택이 나는 개량옹기가 시중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량옹기는 납 성분이 기벽의 기포를 완전히 차단하여 간장이나 된장의 충분한 발효가 발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질박하면서도 정겨운 조상들의 일상생활의 동반자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 곁을 떠나버린 옹기를 다시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