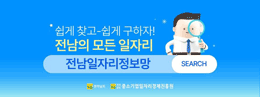신임 비엔날레 대표이사의 행보
 김 미 은 문화부장 |
수년 만의 미술 담당 기자 복귀 후 첫 현장 취재는 광주비에날레 신임 대표이사 기자회견이었다.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침 아시아문화전당 전시 취재차 광주를 찾았던 서울 지역 기자들까지 합류해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5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 자리엔 광주일보가 ‘미리’ 썼던 대로 김선정 선재아트센터 관장이 선임됐다. 당시 ‘유력’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전국적인 지명도와 해외를 포함한 미술계 네트워크,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장을 맡아 광주와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대표 공백으로 예술감독 임명이 늦춰진 상황에서 예술을 ‘잘 아는’ 데다 처음으로 행사가 용봉동 전시관이 아닌, 문화전당에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당에 익숙한 김 대표 선임은 괜찮은 카드였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 대표는 조금은 긴장한 듯했지만 차분히 질의에 응했다. 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비엔날레 자산이 광주에 남도록 하는 방안 강구, 교육과 아카이빙 확대, 광주 예술계와의 소통 강화, 어린이·가족 단위 관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추진 등 소신을 밝혔다.
지역과 소통 눈길 끌지만
질문의 또 다른 축은 경영자로서 김 대표의 비전이었다. 대표 내정 기사가 나갈 당시 그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있어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지역 문화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했다.
현 대표이사는 최근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폭 가져 오며 지위가 막강해졌다.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이사회 개최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재단 운영 총괄은 대표이사가 맡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권한이 많아진 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들도 늘어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문화계는 문화적 소양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한 기업 후원 등을 이끌어 낼 경영 마인드도 함께 갖춘 수장을 요구해 왔던 터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큐레이터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원론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예산 감소 문제 등은 ‘발등의 불’ 임에도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주었다.(일곱 차례 이상 국고 지원을 받는 국제행사는 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비엔날레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기업 협찬 등에 대해선 “비엔날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기업 ‘스폰’ 등을 받는 것은 쉬울 거다”, “전임 대표이사가 해 왔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예전 이용우 대표이사가 했던 역할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왔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깜짝 놀랐다. 당시와 지금은 대표이사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에는 ‘비엔날레와 차를’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기획도 시작했다. 어제는 첫 행사로,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강운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지역 작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회견 당시 김 대표는 웃으며 “큐레이터 출신이다 보니, 예술감독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난 기자회견 때 서울 기자들은 ‘큐레이터’ 김선정에 익숙한 탓인지 내년 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런 내용은 예술감독에게 물을 사항이고, 전시장 구성 등은 전적으로 예술감독이 맡아서 진행할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이 발언은 꼭 지켜야 한다.
예술감독 역할 넘어서야
김 대표가 새겨야 할 것은 자신의 역할이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분간 이사장 권한 대행 역할까지 하는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 비엔날레는 일몰제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85억 원 규모의 비엔날레 기금은 지난 2007년 이후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비가 새는 노후화된 전시관 문제 역시 골칫덩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 후원 유치도 급선무다.
물론 예술과 경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익숙한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쌓아 왔던 기획자로의 특장은 살리되, 경영과 행정 쪽에서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뚫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의 자격이 있다.
/mekim@kwangju.co.kr
5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 자리엔 광주일보가 ‘미리’ 썼던 대로 김선정 선재아트센터 관장이 선임됐다. 당시 ‘유력’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전국적인 지명도와 해외를 포함한 미술계 네트워크,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장을 맡아 광주와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 대표는 조금은 긴장한 듯했지만 차분히 질의에 응했다. 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비엔날레 자산이 광주에 남도록 하는 방안 강구, 교육과 아카이빙 확대, 광주 예술계와의 소통 강화, 어린이·가족 단위 관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추진 등 소신을 밝혔다.
질문의 또 다른 축은 경영자로서 김 대표의 비전이었다. 대표 내정 기사가 나갈 당시 그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있어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지역 문화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했다.
현 대표이사는 최근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폭 가져 오며 지위가 막강해졌다.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이사회 개최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재단 운영 총괄은 대표이사가 맡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권한이 많아진 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들도 늘어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문화계는 문화적 소양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한 기업 후원 등을 이끌어 낼 경영 마인드도 함께 갖춘 수장을 요구해 왔던 터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큐레이터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원론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예산 감소 문제 등은 ‘발등의 불’ 임에도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주었다.(일곱 차례 이상 국고 지원을 받는 국제행사는 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비엔날레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기업 협찬 등에 대해선 “비엔날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기업 ‘스폰’ 등을 받는 것은 쉬울 거다”, “전임 대표이사가 해 왔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예전 이용우 대표이사가 했던 역할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왔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깜짝 놀랐다. 당시와 지금은 대표이사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에는 ‘비엔날레와 차를’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기획도 시작했다. 어제는 첫 행사로,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강운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지역 작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회견 당시 김 대표는 웃으며 “큐레이터 출신이다 보니, 예술감독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난 기자회견 때 서울 기자들은 ‘큐레이터’ 김선정에 익숙한 탓인지 내년 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런 내용은 예술감독에게 물을 사항이고, 전시장 구성 등은 전적으로 예술감독이 맡아서 진행할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이 발언은 꼭 지켜야 한다.
예술감독 역할 넘어서야
김 대표가 새겨야 할 것은 자신의 역할이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분간 이사장 권한 대행 역할까지 하는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 비엔날레는 일몰제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85억 원 규모의 비엔날레 기금은 지난 2007년 이후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비가 새는 노후화된 전시관 문제 역시 골칫덩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 후원 유치도 급선무다.
물론 예술과 경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익숙한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쌓아 왔던 기획자로의 특장은 살리되, 경영과 행정 쪽에서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뚫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의 자격이 있다.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