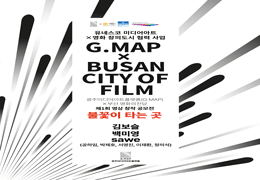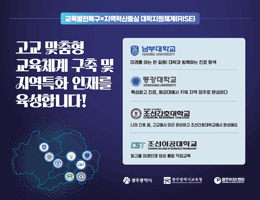[문화창고 '아트시네마'] ⑩ 라탱 지구 영화관들
자본 침탈 위기 관객들이 지켜낸 씨네아티스트 고향 ‘르 샹포’
 |
생 미셸 광장, 소르본느 대학 등이 자리한 파리 라탱 지구는 크고 작은 예술영화관들이 몰려 있는 극장 거리다. 다큐멘터리를 중점적으로 상영하는 극장도 있고, 고전영화에만 집중하는 상영관 등 저마다 특화된 공간들이다.
특히 이 지역 예술영화관의 상징같은 존재인 ‘르 샹포’ 극장을 비롯해 골목길 10여m를 따라 ‘라 필모 테크’, ‘르플레 메디시’ 등 3개 극장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거리가 정말 ‘예술영화관들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38년 문을 연 ‘르 샹포’(Le Champo)는 겉모습 부터가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 고풍스럽다. 극장 외관에 걸려 있는 영화는 레오 카락스 감독,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나쁜 피’와 더스틴 호프만의 ‘미드나잇 카우보이’다.
취재를 위해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극장 앞에는 첫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파리지앵들이 줄을 서 있다. 커피 한잔과 신문을 들고 극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오전 시간이어서인지 60대 이상이 많았다.
‘르 샹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씨네아티스트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프랑수와 트뤼포는 이곳을 자신의 ‘본부’라고 불렀고 ‘제2의 대학’이라고 선언한 이도 있었다. 아버지에 이어 1988년부터 극장을 이끌고 있는 마담 르나방 대표는 “세계 영화사의 수많은 씨네아티스트들이 영화를 발견한 곳이 바로 르 샹포였고, 영화팬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간”이라고 말했다.
‘르 샹포’는 개관 당시엔 120석짜리 스크린이 하나였고 1954년에 같은 규모의 2관을 오픈했다. 극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극장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 대표 영화감독 자크 타티의 영화 ‘윌로씨의 휴가’ 캐릭터다.
상영작은 ‘영화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품들로 특히 극장 측이 심혈을 기울이는 건 1년에 10여차례 열리는 유명 감독과 배우들의 ‘회고전’이다. 세계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 등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행사로 ‘미드나잇 카우보이’ 역시 극장이 진행하는 ‘더스틴 호프만 회고전’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파리 예술영화관들도 국내 예술영화관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 샹포’의 경우 운영비 중 정부 지원금은 16∼18% 수준. 티켓 수입, 공간 대여료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 관람객 감소, 특히 관객층의 고령화는 많은 극장의 고민거리다. ‘르 샹포’의 경우 단관 스크린 당시 1주일이면 5만명을 끌어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2개관에서 2000여명 정도가 관람한다. 지난해 연 관람객은 13만명 수준으로 주 관람객은 50∼60대다.
극장측은 젊은 관객 유치를 위한 기획을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게 인근 소르본느 대학과 함께 개최하는 ‘씨네클럽’이다. 소르본느대학 19세기 역사 센터 소속 교수 3명과 함께 역사와 영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일반 상영작도 젊은 관객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내건다. ‘나쁜 피’의 경우 젊은 관객들이 모여들면서 1주일간 12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그밖에 실직자와 구직자, 다자녀 가정 등에 가격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르 샹포’는 지난 2000년 건물을 매입한 의류업체가 영화관을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때 관객들과 씨네아티스트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 건물이 유적으로 지정됐고, 영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요즘같은 시절엔 아직까지 경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극장이 이 지역에서 제일 늙었다.(웃음) 운영은 항상 어렵지만 매 순간이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화관이 자식같고, 정열을 갖고 운영하는 공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이다, ‘샹포만의 프로그램’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왜곡된 예술극장 지원 사업에 항의해 광주극장 등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관객들이 후원회를 조직했다는 소식에 마담 르나방은 “우리 극장도 관객들이 지켜냈다”며 “광주극장도 관객들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르 샹포에서 5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르플레 메디시’(Reflet Medicis)는 당초 연극 등을 중점적으로 올리던 캬바레였다. 1920년대 문을 연 공간은 1950년대 말부터 지금처럼 영화관으로 운영됐다.
초창기에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방’이라는 별칭처럼 한밤중에도 많은 이들로 붐볐고 에릭 로메르의 작품들이 집중 상영되기도 했다.
150석, 128석, 90석 3개 관을 운영하는 이 극장은 ‘파격적인 기획’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는 상영 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자크 리베트의 영화를 상영해 파리 예술극장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르플레 메디시’ 역시 인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기획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기가 높았던 ‘홍상수 영화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칸느영화제가 끝나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을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베네수엘라, 폴란드 대사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기획전을 연다. 또 디지털 대신 35㎜ 필름영화도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으며 작가영화 기획전, 재발견된 옛날 명화의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한다.
365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며 연 관람객은 10만명 수준이다.
“옛날 라탱 지구에는 정말 극장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60∼70% 정도가 문을 닫았지만 말이다. 3개 극장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객이 분산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많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 거리에 오면 세 극장 중 한곳에서는 영화를 본다. 이 곳에 오면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같다.”(프로그래머 장 마크 젝리)
‘라 필모테크’(La Filmotheque)는 ‘르플레 메디시’와 바로 붙어 있다. 이곳에서는 고전영화들을 중점적으로 상영한다. 이날은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이 상영중이었다. 100여년전부터 공연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지금은 97석과 60석짜리 두 개관으로 운영된다. 오드리 햅번과 마를린 먼로를 컨셉으로 한 ‘블루관’과 ‘레드관’이 인상적으로 한해 관람객은 10만명 수준이다.
극장 관계자는 “고전영화 상영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극장”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네마 뒤 팡테옹’은 유명한 영화 전문 서점 ‘시네 르플레’와 상영관,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특히 이 지역 예술영화관의 상징같은 존재인 ‘르 샹포’ 극장을 비롯해 골목길 10여m를 따라 ‘라 필모 테크’, ‘르플레 메디시’ 등 3개 극장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거리가 정말 ‘예술영화관들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위해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극장 앞에는 첫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파리지앵들이 줄을 서 있다. 커피 한잔과 신문을 들고 극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오전 시간이어서인지 60대 이상이 많았다.
‘르 샹포’는 개관 당시엔 120석짜리 스크린이 하나였고 1954년에 같은 규모의 2관을 오픈했다. 극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극장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 대표 영화감독 자크 타티의 영화 ‘윌로씨의 휴가’ 캐릭터다.
상영작은 ‘영화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품들로 특히 극장 측이 심혈을 기울이는 건 1년에 10여차례 열리는 유명 감독과 배우들의 ‘회고전’이다. 세계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 등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행사로 ‘미드나잇 카우보이’ 역시 극장이 진행하는 ‘더스틴 호프만 회고전’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파리 예술영화관들도 국내 예술영화관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 샹포’의 경우 운영비 중 정부 지원금은 16∼18% 수준. 티켓 수입, 공간 대여료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 관람객 감소, 특히 관객층의 고령화는 많은 극장의 고민거리다. ‘르 샹포’의 경우 단관 스크린 당시 1주일이면 5만명을 끌어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2개관에서 2000여명 정도가 관람한다. 지난해 연 관람객은 13만명 수준으로 주 관람객은 50∼60대다.
극장측은 젊은 관객 유치를 위한 기획을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게 인근 소르본느 대학과 함께 개최하는 ‘씨네클럽’이다. 소르본느대학 19세기 역사 센터 소속 교수 3명과 함께 역사와 영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일반 상영작도 젊은 관객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내건다. ‘나쁜 피’의 경우 젊은 관객들이 모여들면서 1주일간 12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그밖에 실직자와 구직자, 다자녀 가정 등에 가격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르 샹포’는 지난 2000년 건물을 매입한 의류업체가 영화관을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때 관객들과 씨네아티스트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 건물이 유적으로 지정됐고, 영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요즘같은 시절엔 아직까지 경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극장이 이 지역에서 제일 늙었다.(웃음) 운영은 항상 어렵지만 매 순간이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화관이 자식같고, 정열을 갖고 운영하는 공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이다, ‘샹포만의 프로그램’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왜곡된 예술극장 지원 사업에 항의해 광주극장 등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관객들이 후원회를 조직했다는 소식에 마담 르나방은 “우리 극장도 관객들이 지켜냈다”며 “광주극장도 관객들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르 샹포에서 5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르플레 메디시’(Reflet Medicis)는 당초 연극 등을 중점적으로 올리던 캬바레였다. 1920년대 문을 연 공간은 1950년대 말부터 지금처럼 영화관으로 운영됐다.
초창기에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방’이라는 별칭처럼 한밤중에도 많은 이들로 붐볐고 에릭 로메르의 작품들이 집중 상영되기도 했다.
150석, 128석, 90석 3개 관을 운영하는 이 극장은 ‘파격적인 기획’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는 상영 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자크 리베트의 영화를 상영해 파리 예술극장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르플레 메디시’ 역시 인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기획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기가 높았던 ‘홍상수 영화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칸느영화제가 끝나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을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베네수엘라, 폴란드 대사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기획전을 연다. 또 디지털 대신 35㎜ 필름영화도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으며 작가영화 기획전, 재발견된 옛날 명화의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한다.
365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며 연 관람객은 10만명 수준이다.
“옛날 라탱 지구에는 정말 극장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60∼70% 정도가 문을 닫았지만 말이다. 3개 극장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객이 분산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많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 거리에 오면 세 극장 중 한곳에서는 영화를 본다. 이 곳에 오면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같다.”(프로그래머 장 마크 젝리)
‘라 필모테크’(La Filmotheque)는 ‘르플레 메디시’와 바로 붙어 있다. 이곳에서는 고전영화들을 중점적으로 상영한다. 이날은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이 상영중이었다. 100여년전부터 공연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지금은 97석과 60석짜리 두 개관으로 운영된다. 오드리 햅번과 마를린 먼로를 컨셉으로 한 ‘블루관’과 ‘레드관’이 인상적으로 한해 관람객은 10만명 수준이다.
극장 관계자는 “고전영화 상영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극장”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네마 뒤 팡테옹’은 유명한 영화 전문 서점 ‘시네 르플레’와 상영관,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