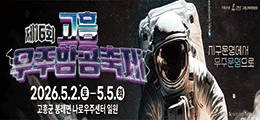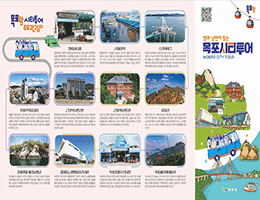군함도는 멀리 있지 않다 -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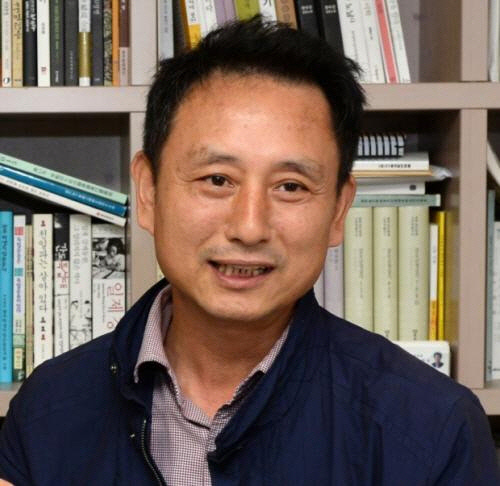 |
몇 년 전 일이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계신 한 선생님이 물어물어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다. 양림동 펭귄마을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델인 이옥선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한 탐방객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4살 때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3년간 모진 고역을 겪어야 했고 중국에 머물다 58년 만인 2000년에야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이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수요시위 현장에 때로는 각국을 순회하며 증언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써 왔다. 할머니는 지난 5월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광주 남구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2017년 소녀상 건립 당시 이러한 이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 출신임에도 소녀상의 모델로 선정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고초를 겪으신 할머니 대신 부산 출신 할머니를 광주 남구 소녀상의 모델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광주 6곳, 전남 16곳 등 22곳에 이른다. 소녀상 설치 숫자로 보면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지만 아쉽게도 지역성을 반영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 단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지역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소녀상’이라는 외형만 남고, 매년 갖는 ‘기림의날’ 행사는 실재하는 지역적 사례와 유리된 채 숙연함만이 요구되는 ‘의례’적 행사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광주시의 경우도 몇 년째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마다 소녀상 제작에 최소 3~4천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소녀상 건립에 들인 일부의 관심을 관련 연구사업에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광주·전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지역 사례가 결합 될 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광주시 사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선 광주시는 올해 ‘기림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일찍이 손잡고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에서는 광주여성재단이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현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초점을 뒀다. 광주에 거주지를 두거나 광주를 중간 매개로 동원됐던 13명의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지역에 소개함으로써 외형적 행사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내는데 힘을 기울였다.
행사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13명의 피해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됐는데 굳이 의례적인 추모사가 없어도 모두가 숙연해지는 자리였다. 그동안 잊혀졌던 13명의 피해자들이 광복 80년 만에 역사적 실체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그 중 곽금녀, 진화순, 이○○ 또는 최복애 피해자는 모두 광주 제사·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되었고, 최양순 피해자도 솜 타는 공장에 다니다가 동원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광주지역이 인근 농촌에서 동원된 여성들이 모이는 중간 집결지로 활용되거나 공장 등이 직접 동원의 매개가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위안부 동원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군함도’는 멀리 일본 나가사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일본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가까이 있어도 무용한 것이 되고 남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일제 식민지 산업수탈 현장인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또 다른 시험대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 못지 않게 80여 년 전 이곳에서 10대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치욕을 담지 못한다면 한갓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도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광주 남구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2017년 소녀상 건립 당시 이러한 이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 출신임에도 소녀상의 모델로 선정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고초를 겪으신 할머니 대신 부산 출신 할머니를 광주 남구 소녀상의 모델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마다 소녀상 제작에 최소 3~4천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소녀상 건립에 들인 일부의 관심을 관련 연구사업에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광주·전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지역 사례가 결합 될 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광주시 사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선 광주시는 올해 ‘기림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일찍이 손잡고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에서는 광주여성재단이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현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초점을 뒀다. 광주에 거주지를 두거나 광주를 중간 매개로 동원됐던 13명의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지역에 소개함으로써 외형적 행사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내는데 힘을 기울였다.
행사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13명의 피해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됐는데 굳이 의례적인 추모사가 없어도 모두가 숙연해지는 자리였다. 그동안 잊혀졌던 13명의 피해자들이 광복 80년 만에 역사적 실체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그 중 곽금녀, 진화순, 이○○ 또는 최복애 피해자는 모두 광주 제사·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되었고, 최양순 피해자도 솜 타는 공장에 다니다가 동원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광주지역이 인근 농촌에서 동원된 여성들이 모이는 중간 집결지로 활용되거나 공장 등이 직접 동원의 매개가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위안부 동원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군함도’는 멀리 일본 나가사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일본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가까이 있어도 무용한 것이 되고 남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일제 식민지 산업수탈 현장인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또 다른 시험대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 못지 않게 80여 년 전 이곳에서 10대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치욕을 담지 못한다면 한갓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도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