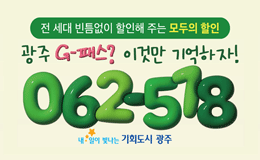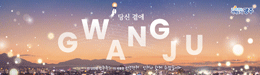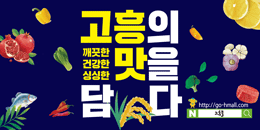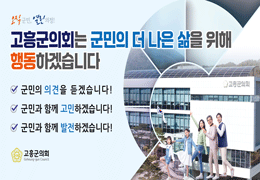[지방자치 30년 <중> 지방자치의 한계]지자체 권한·재원 중앙정부에 예속 … ‘홀로서기’ 버겁다
자치 입법·행정·재정권 없어 소멸 위기 극복 어려움
광주·전남, 지방의회 일당 독점에 ‘무용론’까지 거론
광주·전남, 지방의회 일당 독점에 ‘무용론’까지 거론
 |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과 밀접한 민원 해결, 생활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제도 운영만으로는 지역의 홀로서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없는 상태의 지방자치는 ‘팥 없는 팥빵’이나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자치단체장과 시·구·군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견제 없는 일당 독점에 따른 지방자치의 폐쇄성 등 여러 한계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 제자리걸음…지방자치 ‘무용론’=지역정가 등에선 개헌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자치단체에게 행정과 재정 집행권만 부여하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부활 당시 대통령 직선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중심의 편성을 답습한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방교부세 등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약속했지만, 권한 이양 없이 형식적인 지방시대만 반복한 점도 지방자치 제자리걸음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진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지방분권 논의는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이 도입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개막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후속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당 독점·재정권 없는 것도 ‘한계’=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한 당에 소속돼 있어 지방자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지금껏 지방선거가 경쟁을 통해 ‘지역의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중앙정당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로 치러진 점도 지방자치가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점’이다 보니 그동안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의회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나눠 먹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내 소속 의원들 간 ‘불협화음’도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방이 지방자치 제도만 가지고 있을 뿐 지방자치권이 없는 것도 지역의 역량을 억누르는 방해물이다. 2022년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권 확대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개정안조차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화두로=부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안정한 지방자치 대개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집행·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 지자체 간 협력 등은 필수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당 독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은 그런 경쟁들이 생략되면서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각 행정구역 속에서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전 지자체 간 협력 등으로 지방자치의 낭비와 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없는 상태의 지방자치는 ‘팥 없는 팥빵’이나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년 제자리걸음…지방자치 ‘무용론’=지역정가 등에선 개헌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자치단체에게 행정과 재정 집행권만 부여하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방교부세 등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약속했지만, 권한 이양 없이 형식적인 지방시대만 반복한 점도 지방자치 제자리걸음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진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지방분권 논의는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이 도입되며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개막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후속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당 독점·재정권 없는 것도 ‘한계’=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한 당에 소속돼 있어 지방자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지금껏 지방선거가 경쟁을 통해 ‘지역의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중앙정당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로 치러진 점도 지방자치가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점’이다 보니 그동안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의회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나눠 먹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내 소속 의원들 간 ‘불협화음’도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방이 지방자치 제도만 가지고 있을 뿐 지방자치권이 없는 것도 지역의 역량을 억누르는 방해물이다. 2022년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권 확대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개정안조차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화두로=부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안정한 지방자치 대개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집행·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 지자체 간 협력 등은 필수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 간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당 독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은 그런 경쟁들이 생략되면서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각 행정구역 속에서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전 지자체 간 협력 등으로 지방자치의 낭비와 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