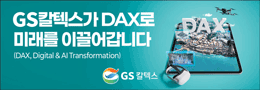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이건희 컬렉션’이 쏘아 올린 공-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
미국 LA의 산타모니카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가 있다. 지난 1966년 유전(油田)을 통해 미국인 최초로 10억 달러의 오일머니를 벌어들인 J. 폴 게티(1892∼1976)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다. 수십 년간 모은 게티의 방대한 미술품과 기부금를 모태로 미국인들의 문화적 허기를 달래 주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하지만 생전 게티는 칼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구두쇠였다. 수천 평의 대저택에서 살면서도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해 거실 한 쪽에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줄 정도였다. 지난 2018년 개봉된 영화 ‘올 더 머니’(All of the money in the world)는 돈 앞에서는 천륜도 저버리는 비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그는 1973년 자신의 열여섯 살 손자를 유괴한 인질범들이 몸값으로 1700만 달러(약 186억 원)를 요구하자 “내가 인질범에게 돈을 보내면 다른 손자들도 위험하다.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건 어렵다”며 꿈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한 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17세기 네덜란드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품은 주저 없이 사들인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게티는 추악한 기업인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의 통 큰 기부로 탄생한 게티 센터 덕분에 유럽에 가지 않아도 세기의 걸작들을 LA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 큰 기부로 탄생한 게티 센터
그런 점에서 지난 2021년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은 척박한 기증 문화의 풍토를 바꾼 쾌거다. 광주시립미술관 30점, 전남도립미술관 20점을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들에게 2만 3000여 점의 방대한 미술품을 기증한 예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건희 컬렉션’이 지닌 가치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였다는 점이다.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부터 클로드 모네의 ‘수련’까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컬렉션들을 국공립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에도 전국 각지에서 18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삼성가의 기증으로 ‘그림의 떡’이었던 이중섭 화백의 작품 여덟 점, 한국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김환기(1913-1974)의 작품 다섯 점을 품에 안은 호사를 누리게 됐다. 한 해 작품 구입 예산이 7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립미술관이 만약 지난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73억 원에 낙찰된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의 ‘05-IV-71 #200(Universe)’을 구입하려면 10년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기증이 공립 미술관에게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증받은 미술품들이 있다. 다름 아닌 ‘하정웅 컬렉션’이다. 지난 1993년 재일교포 사업가인 영암 출신 하정웅(83) 씨가 평생 수집한 212점을 필두로 여섯 차례에 걸쳐 2603점을 기증했다. 이는 시립미술관 컬렉션 5385점(2022년 12월 기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이우환·곽인식·손아유·전화황·조양규·오일 등 재일 한국인의 인권과 휴머니즘을 다룬 작품들은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제2의 ‘하정웅 컬렉션’ 나오려면
그럼에도 하정웅 컬렉션을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립미술관의 브랜딩은 미흡하다. 지난 2017년 하정웅의 이름을 딴 ‘하정웅 미술관’이 개관해 그나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차렸지만 기증 당시 약속한 연중 상설 전시와 대중에 널리 알리는 ‘전국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정웅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하정웅 컬렉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서너 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고작 학예사 한 명만이 배치돼 있다. 게다가 하정웅 컬렉션 등을 연구하는 ‘아시아 디지털아트 아카이빙 플랫폼’이 올 9월 완공되지만 필요한 인력 운용 계획은 아직 없다. 비슷한 시설인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연구팀이 학예사 다섯 명 등 11명(시간제 인력 포함)을 배치해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침 올해는 1993년 시작된 하정웅 컬렉션이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공립 미술관의 수장고가 풍성해졌듯이 하정웅 컬렉션은 척박한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방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지닌 공립 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증 미술품에 대한 브랜딩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정웅 컬렉션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증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지역의 컬렉터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다. 뜻있는 기증자들이 늘어날수록 미술관의 컬렉션은 화려해진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그는 1973년 자신의 열여섯 살 손자를 유괴한 인질범들이 몸값으로 1700만 달러(약 186억 원)를 요구하자 “내가 인질범에게 돈을 보내면 다른 손자들도 위험하다.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건 어렵다”며 꿈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한 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17세기 네덜란드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품은 주저 없이 사들인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게티는 추악한 기업인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의 통 큰 기부로 탄생한 게티 센터 덕분에 유럽에 가지 않아도 세기의 걸작들을 LA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21년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은 척박한 기증 문화의 풍토를 바꾼 쾌거다. 광주시립미술관 30점, 전남도립미술관 20점을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들에게 2만 3000여 점의 방대한 미술품을 기증한 예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건희 컬렉션’이 지닌 가치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였다는 점이다.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부터 클로드 모네의 ‘수련’까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컬렉션들을 국공립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에도 전국 각지에서 18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삼성가의 기증으로 ‘그림의 떡’이었던 이중섭 화백의 작품 여덟 점, 한국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김환기(1913-1974)의 작품 다섯 점을 품에 안은 호사를 누리게 됐다. 한 해 작품 구입 예산이 7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립미술관이 만약 지난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73억 원에 낙찰된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의 ‘05-IV-71 #200(Universe)’을 구입하려면 10년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기증이 공립 미술관에게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증받은 미술품들이 있다. 다름 아닌 ‘하정웅 컬렉션’이다. 지난 1993년 재일교포 사업가인 영암 출신 하정웅(83) 씨가 평생 수집한 212점을 필두로 여섯 차례에 걸쳐 2603점을 기증했다. 이는 시립미술관 컬렉션 5385점(2022년 12월 기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이우환·곽인식·손아유·전화황·조양규·오일 등 재일 한국인의 인권과 휴머니즘을 다룬 작품들은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제2의 ‘하정웅 컬렉션’ 나오려면
그럼에도 하정웅 컬렉션을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립미술관의 브랜딩은 미흡하다. 지난 2017년 하정웅의 이름을 딴 ‘하정웅 미술관’이 개관해 그나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차렸지만 기증 당시 약속한 연중 상설 전시와 대중에 널리 알리는 ‘전국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정웅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하정웅 컬렉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서너 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고작 학예사 한 명만이 배치돼 있다. 게다가 하정웅 컬렉션 등을 연구하는 ‘아시아 디지털아트 아카이빙 플랫폼’이 올 9월 완공되지만 필요한 인력 운용 계획은 아직 없다. 비슷한 시설인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연구팀이 학예사 다섯 명 등 11명(시간제 인력 포함)을 배치해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침 올해는 1993년 시작된 하정웅 컬렉션이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공립 미술관의 수장고가 풍성해졌듯이 하정웅 컬렉션은 척박한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방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지닌 공립 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증 미술품에 대한 브랜딩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정웅 컬렉션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증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지역의 컬렉터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다. 뜻있는 기증자들이 늘어날수록 미술관의 컬렉션은 화려해진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