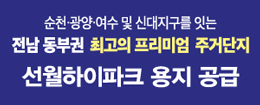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중 고용효과 1위
KDI, 10개 혁신도시 이전효과 분석
6년간 평균 고용효과 나주 12.8%P ‘최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산업’은 꼴찌
‘영화·금융’ 특화 부산·‘의료’ 강원과 대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인력 배치해야”
6년간 평균 고용효과 나주 12.8%P ‘최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산업’은 꼴찌
‘영화·금융’ 특화 부산·‘의료’ 강원과 대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인력 배치해야”
 나주 혁신도시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나주 혁신도시 고용효과가 가장 컸지만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6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의 고용증대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산업이 뚜렷하지 않았던 나주지역 특성상 지식기반산업 고용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정책포럼’ 보고서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자료에 담겼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분산·고용효과를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됐고 2019년 마무리됐다.
문 위원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해 지난 2006~2012년 대비 2013~2018년 평균 혁신도시 모든 산업부문 고용증감을 인근 시·도와 비교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인근 광역시인 광주의 고용 증감율보다 1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충북(21.4%포인트)과 전북(13.8%포인트), 강원(11.3%포인트), 부산(0.7%포인트), 경북(0.7%포인트), 대구(0.3%포인트) 등 순으로 고용효과가 높았다. 평균적으로 9개 혁신도시 고용효과는 인근 시·도보다 0.7%포인트 높았다.
고용효과가 오히려 떨어진 지역은 경남(-3.1%포인트), 울산(-4.4%포인트) 등 2곳이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고용효과가 가장 컸지만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식기반산업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높은 산업을 말하며, 지식기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일차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 혁신도시는 같은 기간 동안 광주 지식기반산업 고용증가에 비해 49.6%포인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소 폭은 9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
지식기반산업 고용이 크게 늘어난 부산(24.0%포인트)과 강원(14.6%포인트), 전북(13.8%포인트) 등과 대조적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감율(4.8%포인트)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문 위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부산의 금융 및 영화산업이나 강원도의 의료산업과 같이 이전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도시의 건설방식에 따라 모(母)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도시형으로 건설된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1조4734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갔다. 10개 도시 가운데 전북(1조5851억원)과 대구(1조529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속한 나주시 인구는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순유입을 이어오고 있다.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한 인구는 지난 2014년 192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17년 1061명, 2018년 181명으로 급감해왔으며 급기야 2019년에는 155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 순유입 인구는 7566명(2015년)→6168명(2016년)→5756명(2017년)→3746명(2018년)→998명(2019년) 등으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간 순유입(725명)과 전남도 내 순유입(7428명) 등 1153명에 달하는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직업 때문에 나주로 거주지를 옮긴 순유입 인구는 2014년 2461명에서 2015년 38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987명, 2017년 1911명, 2019년 740명, 2019년 545명 등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 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공기관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지만 기존 산업이 뚜렷하지 않았던 나주지역 특성상 지식기반산업 고용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정책포럼’ 보고서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자료에 담겼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됐고 2019년 마무리됐다.
문 위원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해 지난 2006~2012년 대비 2013~2018년 평균 혁신도시 모든 산업부문 고용증감을 인근 시·도와 비교했다.
충북(21.4%포인트)과 전북(13.8%포인트), 강원(11.3%포인트), 부산(0.7%포인트), 경북(0.7%포인트), 대구(0.3%포인트) 등 순으로 고용효과가 높았다. 평균적으로 9개 혁신도시 고용효과는 인근 시·도보다 0.7%포인트 높았다.
고용효과가 오히려 떨어진 지역은 경남(-3.1%포인트), 울산(-4.4%포인트) 등 2곳이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고용효과가 가장 컸지만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식기반산업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높은 산업을 말하며, 지식기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일차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 혁신도시는 같은 기간 동안 광주 지식기반산업 고용증가에 비해 49.6%포인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소 폭은 9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
지식기반산업 고용이 크게 늘어난 부산(24.0%포인트)과 강원(14.6%포인트), 전북(13.8%포인트) 등과 대조적이었으며, 전국 평균 증감율(4.8%포인트)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
신도시형으로 건설된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1조4734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갔다. 10개 도시 가운데 전북(1조5851억원)과 대구(1조529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속한 나주시 인구는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순유입을 이어오고 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 순유입 인구는 7566명(2015년)→6168명(2016년)→5756명(2017년)→3746명(2018년)→998명(2019년) 등으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간 순유입(725명)과 전남도 내 순유입(7428명) 등 1153명에 달하는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직업 때문에 나주로 거주지를 옮긴 순유입 인구는 2014년 2461명에서 2015년 38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987명, 2017년 1911명, 2019년 740명, 2019년 545명 등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 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공기관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