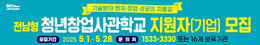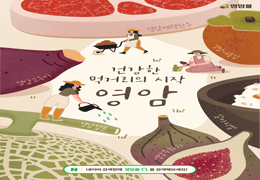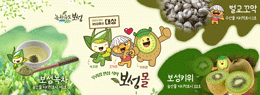관리직인데 현장업무까지… 업무협의 중 쓰러져 숨졌는데 산재 아니라고?
항소심은 산재 인정
 |
A씨는 지난 2017년 입사, 도정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리직이지만 때로는 원료 상·하차, 지게차 작업까지 했고 회사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퇴근, 창고 청소 등 노무직 업무도 맡았다. 2018년에는 경리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도 병행했었다.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이들 회사를 오가며 일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회사에 출근한 뒤 가공 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찾아 업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혈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2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우선,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여러 회사를 오가며 일한 사실을 들었다. 관리직이지만 현장 도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먼지, 벌레 썩는 냄새 등으로 피부병, 두통, 어지러움 등을 가족에게 호소한 정황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을 동반한 노동 업무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A씨의 발병 무렵 실제 근무시간도 주당 44시간을 넘겨 평균 54시간에 가까운 점, 사업주 요청으로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체납 보험료·임금 등으로 인한 불안·스트레스에도 시달린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이들 회사를 오가며 일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2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우선,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여러 회사를 오가며 일한 사실을 들었다. 관리직이지만 현장 도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먼지, 벌레 썩는 냄새 등으로 피부병, 두통, 어지러움 등을 가족에게 호소한 정황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을 동반한 노동 업무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A씨의 발병 무렵 실제 근무시간도 주당 44시간을 넘겨 평균 54시간에 가까운 점, 사업주 요청으로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체납 보험료·임금 등으로 인한 불안·스트레스에도 시달린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