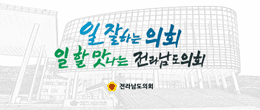사랑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역사가 되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다 - 권경률 지음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다 - 권경률 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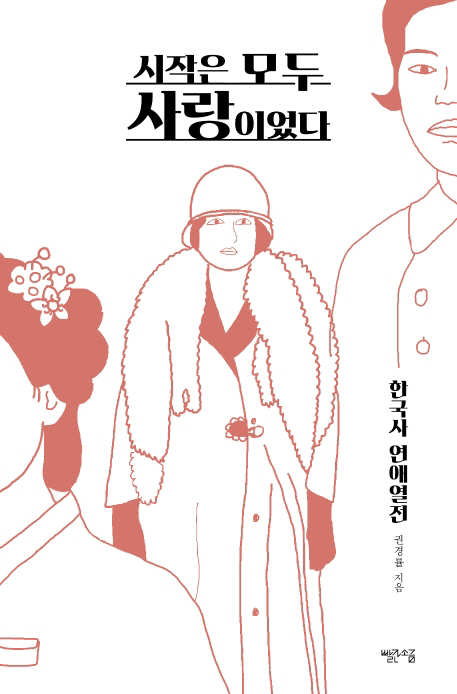 |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표면적인 힘은 공포와 욕망이다. 하지만 사람의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사랑이다. 고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는 우왕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었다. 공민왕과 신돈이 한 여인 반야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선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왕비로 삼기 위해 집권당을 갈아치우며 당쟁을 사생결단으로 격화시켰다. 여전사 박차정과의 사랑과 결혼이 없었다면 김원봉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사에서 금지된 사랑을 꿈꾼 여인들은 구시대로부터 가혹한 응징과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내 그들이 꿈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본문 중)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다. “사랑은 가장 사소한 개인사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사회적인 관심사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지나온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앞을 내다볼 수도 있다.
저자는 ‘금지된 사랑’의 역사를 ‘가부장제’의 역사로 상정한다. 그 예로 나혜석과 어우동을 든다. 나혜석이 1935년 2월 잡지 ‘삼천리’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나혜석이 활동하던 시대는 자유연애가 막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부장 사회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혜석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다름없는 발언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 이후 나혜석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1949년 3월 14일자 ‘대한민국 관보’에는 ‘나이 34세. 주소 미상. 이름 나혜석’이라는 부고가 실렸다. 그것은 행려병자의 부고였는데, 사실상 ‘사회적인 타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의 어우동은 왕명에 따라 처형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양반가 여인이 각계각층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눴다는 것이다. 일명 ‘간통죄’였다. 조선의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 처벌 조항에는 곤장 80~90대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그녀와 간통했던 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배에서 복귀했다.
저자는 사랑을 이용했던 남자들의 이야기도 다룬다. 지금까지 양녕대군은 문치의 시대를 열기 위한 아버지 태종의 뜻을 이해하고 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러 음주가무에 빠진 척했다는 게 전해오는 얘기다. 그러나 사실 양녕은 원로대신의 첩과의 스캔들로 파멸을 자초했다.
그 뿐 아니다.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왕비로 삼기 위해 집권당을 갈아치웠다. 특별한 처소 취선당을 지어줬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로 인해 “피의 숙청과 왕비 교체라는 태풍”이 조선을 덮쳤다.
저자는 “한국사의 지배층은 남녀의 사랑을 다스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때로는 사랑을 죄악시하면서 민중에게 공포심을 심었고, 때로는 사랑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웠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사의 진실이다. 사랑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역사가 되었다.” <빨간소금·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