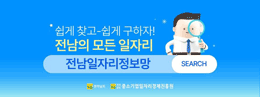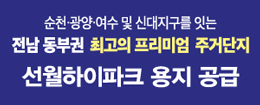스마트폰 쓰면서도 수천년 전통 잇는 무룻 족 젊은이들
① 코타키나발루 ‘7의 전설’
 수백년 간 내려져 온 전통 방식으로 혼례식과 장례식에 입을 의복을 만들고 있는 무룻 족. 여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으로 실을 엮으며 다음 세대에 직조방식을 전수하고 있다. |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대지가 열리기 전 ‘빰삥’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이 있었다. 드넓은 우주 속에는 세상을 비춰줄 빛도 어둠도 없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빰삥만 있을 뿐이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있던 빰삥이 세상을 열었다.
위대한 빰삥은 둘로 나눠지면서 키노호링언, 수미닌둥이란 신을 낳았다. 이렇게 우주가 열리고 세상은 첫날을 맞이했다. 남성을 상징하는 키노호링언, 여성을 대표하는 수미닌둥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빚어갔다.
빰삥이 갈라지고, 이튿날 빛이 나타났다. 그러자 땅에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다양한 씨앗이 만들어졌다. 다음날 땅을 딛고 과일을 먹이로 삼는 동물이 나타났고, 이후 이를 지배하는 인간이 탄생했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정확히 7일이 걸렸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휴양도시 코타키나발루. 이곳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진 크닝아우 마을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민족 중 무룻 족 35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마을 촌장인 모하마드 헬미(mohd hilmi·51)씨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온 전설을 설명하며 숫자 7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신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따뜻함과 차가움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세상에서 인간 역시 그러한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룻 족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현대문물은 받아들이면서도 직접 만든 옷으로 전통 혼례를 치르는 등 수 천년 간 내려져 오는 의복과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옷과 장신구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직물을 염색할 때 7일 동안 작업을 하는 이유도 숫자 7에 대한 믿음이자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다.
그의 부인 살리타 사니든(salitah sanadon·49)씨는 직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 노란색까지 네 가지 색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염료를 사용해 만들지만 가장 좋은 색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 직물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지켜야 할 뿌리 같은 전통이기에 과정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심혈을 기울인다.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은 소수민족으로 태어났더라도 고향을 떠나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갖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일을 하는 등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이다.
이곳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 6일째 되는 날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반드시 불을 끈다.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7일째 되는 날 새벽 불을 밝히면 육신을 찾아온 영혼이 제대로 영면에 들 수 없다고 믿는다. 장례식에서 돼지, 닭, 버펄로, 염소 중 하나를 재물로 바치는데 이 역시 동물들이 영혼을 저승으로 이끈다는 전설의 영향이다. 7에 대한 믿음은 또 있다.
소수민족들은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자신들이 만드는 직물에 신화와 전설을 담았다. 사람, 뱀, 호랑이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손수 만든 직물을 의복으로 제작하는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 건강과 평화 등 다양한 염원을 담은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직물은 할머니가 결혼하는 손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통방식으로 실을 만들어 염색하고 직물을 만들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시장에서 사거나 아예 전통혼례 대신 현대적인 방법으로 혼례를 치르기 때문이다.
전통직물의 중심지로 불리는 크닝아우 마을은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직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이들이 마을에 여럿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64가구 35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전국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그 영향으로 우거진 숲을 가진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키나바타난 강을 활용해 목재를 운반하고 그곳에서 잡히는 풍부한 물고기까지. 크닝아우 지역은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원래 이곳에 있던 무룻 족을 포함해 두순틴달 족, 룽구스 족 등 서로 다른 민족이 집결하며 그들이 가진 직조기술도 자연스럽게 합쳐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가진 기술을 공유하며 융합된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은색은 진흙과 7가지 식물 잎사귀를 빻은 후 염료를 만든다. 액운을 쫓아 평화를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붉은색. 이는 마을 주변에서 채집되는 식물 뿌리와 나무 껍질을 갈아서 물을 섞으면 얻을 수 있다. 강황을 갈아서 만드는 노란색까지. 이들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활용해 고유한 염료를 만들어 7일간 염색하고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했다.
과거에는 직물을 만드는 이유가 결혼식이나 명절에 입을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염료로 네 가지 색만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화학염료를 활용해 파란색, 보라색 등을 첨가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값싼 직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소수민족이 만드는 직물을 찾는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조상이 그래왔듯이 자신들도 고유한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촌장의 딸이자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띠라 빈티(Athirah binti·24) 씨는 빠르고 편한 것만 따라가기보다는 느리지만 본래 것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350명이 사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불과 4년 전이에요. 한 집에 콘센트가 하나뿐이라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편리함을 쫓아 마을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전통방식대로 의복을 만들고, 옛날처럼 혼례를 치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룻 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무룻 족 젊은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빰삥은 둘로 나눠지면서 키노호링언, 수미닌둥이란 신을 낳았다. 이렇게 우주가 열리고 세상은 첫날을 맞이했다. 남성을 상징하는 키노호링언, 여성을 대표하는 수미닌둥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빚어갔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휴양도시 코타키나발루. 이곳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진 크닝아우 마을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민족 중 무룻 족 35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마을 촌장인 모하마드 헬미(mohd hilmi·51)씨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온 전설을 설명하며 숫자 7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신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따뜻함과 차가움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세상에서 인간 역시 그러한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부인 살리타 사니든(salitah sanadon·49)씨는 직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 노란색까지 네 가지 색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염료를 사용해 만들지만 가장 좋은 색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 직물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지켜야 할 뿌리 같은 전통이기에 과정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심혈을 기울인다.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은 소수민족으로 태어났더라도 고향을 떠나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갖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일을 하는 등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이다.
이곳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 6일째 되는 날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반드시 불을 끈다.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7일째 되는 날 새벽 불을 밝히면 육신을 찾아온 영혼이 제대로 영면에 들 수 없다고 믿는다. 장례식에서 돼지, 닭, 버펄로, 염소 중 하나를 재물로 바치는데 이 역시 동물들이 영혼을 저승으로 이끈다는 전설의 영향이다. 7에 대한 믿음은 또 있다.
소수민족들은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자신들이 만드는 직물에 신화와 전설을 담았다. 사람, 뱀, 호랑이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손수 만든 직물을 의복으로 제작하는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 건강과 평화 등 다양한 염원을 담은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직물은 할머니가 결혼하는 손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통방식으로 실을 만들어 염색하고 직물을 만들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시장에서 사거나 아예 전통혼례 대신 현대적인 방법으로 혼례를 치르기 때문이다.
전통직물의 중심지로 불리는 크닝아우 마을은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직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이들이 마을에 여럿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64가구 35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전국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그 영향으로 우거진 숲을 가진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키나바타난 강을 활용해 목재를 운반하고 그곳에서 잡히는 풍부한 물고기까지. 크닝아우 지역은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원래 이곳에 있던 무룻 족을 포함해 두순틴달 족, 룽구스 족 등 서로 다른 민족이 집결하며 그들이 가진 직조기술도 자연스럽게 합쳐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가진 기술을 공유하며 융합된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은색은 진흙과 7가지 식물 잎사귀를 빻은 후 염료를 만든다. 액운을 쫓아 평화를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붉은색. 이는 마을 주변에서 채집되는 식물 뿌리와 나무 껍질을 갈아서 물을 섞으면 얻을 수 있다. 강황을 갈아서 만드는 노란색까지. 이들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활용해 고유한 염료를 만들어 7일간 염색하고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했다.
과거에는 직물을 만드는 이유가 결혼식이나 명절에 입을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염료로 네 가지 색만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화학염료를 활용해 파란색, 보라색 등을 첨가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값싼 직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소수민족이 만드는 직물을 찾는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조상이 그래왔듯이 자신들도 고유한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촌장의 딸이자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띠라 빈티(Athirah binti·24) 씨는 빠르고 편한 것만 따라가기보다는 느리지만 본래 것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350명이 사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불과 4년 전이에요. 한 집에 콘센트가 하나뿐이라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편리함을 쫓아 마을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전통방식대로 의복을 만들고, 옛날처럼 혼례를 치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룻 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무룻 족 젊은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