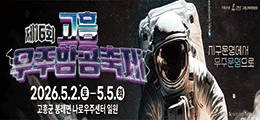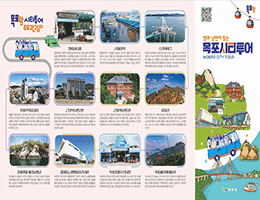나홀로 집, 할 게 없어…이웃도 줄어들며 고립감 깊어져
농촌 어르신 외로운 삶, 오늘도 집 밖으로 돈다 <2>
농사 밖엔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식 신신당부에도 밭일 나가
사람 줄고 남일 관심도 안가져
군에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해도
마을 인구 적어 신청도 힘들어
농사 밖엔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식 신신당부에도 밭일 나가
사람 줄고 남일 관심도 안가져
군에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해도
마을 인구 적어 신청도 힘들어
 26일 화순군 도곡면의 한 찰벼논에서 고령 농민이 삽으로 논둑을 정비하고 있다. |
“난 촌에서 태어나 땅만 파먹고 살아왔으니 농사 밖엔 할 줄 아는 게 없지.”
담양군 담양읍 용주마을 박공례(89) 할머니의 하루는 고요한 집에서 시작된다. 남편은 올봄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인천·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각자 삶이 바쁘다.
새벽부터 일어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할머니는 결국 못 참겠다는 듯 하우스로 발길을 향한다. 자식들이 전화로 “날이 더우니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최근엔 폭우로 마을회관까지 침수되면서 박 할머니를 반기는 곳은 평생 일궈 왔던 밭밖에 없다고 한다.
박 씨는 “날이 덥다고 회사 안가느냐, 자식들 뒷바라지, 학교 등록금, 결혼까지 일궈 낸 밭이 내겐 평생의 직장”이라면서 “남편이 떠난 뒤론 외롭고 쓸쓸해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인구는 1983년 218명에서 올해 51명으로 줄었다. 40여년 사이 인구가 4분의 1로 줄고 70~80대가 아닌 주민을 찾기도 어렵게 된 것.
한때 북적이던 농촌 마을은 고령화·인구 유출로 점차 텅 비어가 원로들 사이에서도 “할 게 없어 밭에 나가 일한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활지도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말동무를 해 준다 한들 무료함이 해소될 턱이 없다. 결국 가족, 이웃과 정(情)을 잃어버린 채 고립감에 빠진 노인들은 논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의 중한실마을에서 거주하는 이영님(여·80)씨도 과거 북적였던 이웃들이 떠나가고 ‘남은 이’가 돼버렸다. 이씨는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은 회관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회관마다 20명 넘게 모였다”며 “요새는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회관에 밥 먹으러 나오는 이도 이제 대여섯 뿐”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 많이 살아계실 때는 ‘옆집 숟가락 갯수도 알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을 누구네 몇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집 제사가 며칠인지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고 살았다는 이씨. 지금 마을에는 사람도 얼마 없고 점점 남일에 관심을 안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 이씨의 말이다.
사람이 그리워 멀리 읍내로 나가 보려고 해도, 교통편이 열악하다 보니 쉽지 않다.
화순군 덕산마을에는 하루에 4번 운행되는 218번 농어촌 버스가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 20분, 11시 30분, 오후 2시 20분, 7시로 버스 한 대라도 놓치면 최소 1시간 50분에서, 길게는 4시간 40분을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한다.
덕산마을 주민 문병구(85)씨는 “마을에 버스도 잘 안 들어와서 병원 한번 가려면 읍이나 광주까지 먼 길을 나서야 한다. 다른 마을은 회관에선 노래도 가르치고 운동도 하던데 우리 마을은 드물다”고 토로했다.
덕산마을 이장 김재철(53) 씨는 “현재 마을에는 10명 남짓이 거주하고 있으며, 명목상 주소만 남긴 집이나 빈집도 크게 늘었다”며 “과거에는 집집마다 사람이 북적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혼자 사는 고령자, 남은 집들도 점점 비워지고 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고 마을 안에 남아 있어도 적적함이 나아질 길이 없다. 인구가 적은 외곽·고립 마을과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리 마을은 인구가 적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4~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했었지만 강사들이 인원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표했다”며 “인원이 적은 마을은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마을 간 거리가 멀어 노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워 한다”고 했다.
화순군은 폭염 대응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경로당) 250여곳 중 26곳을 선정해 노래교실·요리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한 달간 지원하고 있지만 덕산마을은 신청서도 못 냈다. 인원이 적다 보니 문화 프로그램 신청하기도, 버스편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농촌 마을의 생활 인프라와 정보 부족 등 문제는 노인들을 복지 서비스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고립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한 소외감이 노인들을 무더위 땡볕에 논밭을 헤매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의 핵심은 사회적 연결과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복지 정책만으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전남 등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역 밀착형 복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지자체의 우선순위 조정, 주민 의견 반영 등이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복지 프로그램도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남 지역은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가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당사자 중심의 문제 인식과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담양군 담양읍 용주마을 박공례(89) 할머니의 하루는 고요한 집에서 시작된다. 남편은 올봄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인천·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각자 삶이 바쁘다.
새벽부터 일어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할머니는 결국 못 참겠다는 듯 하우스로 발길을 향한다. 자식들이 전화로 “날이 더우니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최근엔 폭우로 마을회관까지 침수되면서 박 할머니를 반기는 곳은 평생 일궈 왔던 밭밖에 없다고 한다.
이 마을 인구는 1983년 218명에서 올해 51명으로 줄었다. 40여년 사이 인구가 4분의 1로 줄고 70~80대가 아닌 주민을 찾기도 어렵게 된 것.
화순군의 중한실마을에서 거주하는 이영님(여·80)씨도 과거 북적였던 이웃들이 떠나가고 ‘남은 이’가 돼버렸다. 이씨는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은 회관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회관마다 20명 넘게 모였다”며 “요새는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회관에 밥 먹으러 나오는 이도 이제 대여섯 뿐”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 많이 살아계실 때는 ‘옆집 숟가락 갯수도 알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을 누구네 몇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집 제사가 며칠인지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고 살았다는 이씨. 지금 마을에는 사람도 얼마 없고 점점 남일에 관심을 안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 이씨의 말이다.
사람이 그리워 멀리 읍내로 나가 보려고 해도, 교통편이 열악하다 보니 쉽지 않다.
화순군 덕산마을에는 하루에 4번 운행되는 218번 농어촌 버스가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 20분, 11시 30분, 오후 2시 20분, 7시로 버스 한 대라도 놓치면 최소 1시간 50분에서, 길게는 4시간 40분을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한다.
덕산마을 주민 문병구(85)씨는 “마을에 버스도 잘 안 들어와서 병원 한번 가려면 읍이나 광주까지 먼 길을 나서야 한다. 다른 마을은 회관에선 노래도 가르치고 운동도 하던데 우리 마을은 드물다”고 토로했다.
덕산마을 이장 김재철(53) 씨는 “현재 마을에는 10명 남짓이 거주하고 있으며, 명목상 주소만 남긴 집이나 빈집도 크게 늘었다”며 “과거에는 집집마다 사람이 북적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혼자 사는 고령자, 남은 집들도 점점 비워지고 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고 마을 안에 남아 있어도 적적함이 나아질 길이 없다. 인구가 적은 외곽·고립 마을과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리 마을은 인구가 적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4~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했었지만 강사들이 인원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표했다”며 “인원이 적은 마을은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마을 간 거리가 멀어 노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워 한다”고 했다.
화순군은 폭염 대응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경로당) 250여곳 중 26곳을 선정해 노래교실·요리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한 달간 지원하고 있지만 덕산마을은 신청서도 못 냈다. 인원이 적다 보니 문화 프로그램 신청하기도, 버스편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농촌 마을의 생활 인프라와 정보 부족 등 문제는 노인들을 복지 서비스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고립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한 소외감이 노인들을 무더위 땡볕에 논밭을 헤매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의 핵심은 사회적 연결과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복지 정책만으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전남 등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역 밀착형 복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지자체의 우선순위 조정, 주민 의견 반영 등이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복지 프로그램도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남 지역은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가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당사자 중심의 문제 인식과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