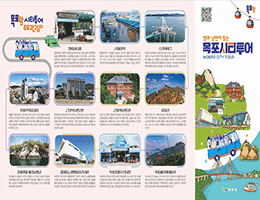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아버지가 천착했던 ‘동학’ 매개로 인간 본연의 감정 투시하고 싶었죠”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5주년 ‘여울물 소리’ 황석영 동명 소설 원작
황석영 문단 데뷔 50주년 발표작…최초로 극화 허락, 아들 황호준 연출
‘짙은 어둠을 가르며’, ‘고고천변’ 등 주요 대목 시연, 강렬한 통성의 한
황석영 문단 데뷔 50주년 발표작…최초로 극화 허락, 아들 황호준 연출
‘짙은 어둠을 가르며’, ‘고고천변’ 등 주요 대목 시연, 강렬한 통성의 한
 광주시립창극단이 16일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에서 창극 ‘여울물 소리’ 프리뷰 공연을 선보였다. 작품 창작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석영 소설가의 아들 황호준 연출가. |
“12년 전부터 기획한 창극 ‘여울물 소리’는 한 편의 조선 미학론에 가깝습니다. 구한 말 재담꾼이던 ‘광대’를 소재 삼아 시대담론과 당대 개인의 미시적 역사를 투사하고, 창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박승희)이 창극 ‘여울물 소리’를 오는 11월 7~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에 앞서 16일 국악당에서 주요 대목을 미리 만나는 프리뷰 시간이 마련됐다.
황석영 작가가 문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했던 소설 ‘여울물 소리’를 동명 창극으로 극화한 이번 작품은 황 작가의 아들 황호준 씨가 연출을 맡았다. 황 연출가는 ‘새야 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국립창극단 ‘메디아’, 광주시립창극단 ‘솔의 노래’ 등을 작업했다.
원작 소설은 동학 혁명의 실패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소시민적 삶을 초점화한다. 이를 모티브 삼은 창극은 어떤 모습일까.
황 연출가는 “아버지가 구사했던 원작의 말맛, 운율을 살리면서 완성도 있는 창극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원작을 따라가면서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원작자가 항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개작’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원작 소설의 서사에 얼개를 두면서 공연 형식을 잘 접목한 점은 ‘여울물 소리’만의 매력이다. 원작의 여러 인물을 한 명으로 통합하거나 시공간의 편집, 특정 에피소드를 삭제하는 등 개작을 거쳐 흥미를 배가시켰다.
극은 동학의 대규모 전쟁 장면도 과감하게 덜어냈다. 주인공 연옥은 강경 객주를 운영하다가 동학 혁명에 참여한 이신통과 사랑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주목할 수도 있으나 개개인의 감정 표현에 방점을 뒀다.
원작에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의 감정변화, 시간 흐름은 창극에서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궁금했다.
황 연출가는 “출연진이 이런 점을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정 인물이 죽는 시간대를 뒤틀거나, 장소와 시간을 교차시키는 드라마틱한 변주를 통해 해결했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작품의 세 가지 주요 대목을 미리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통성으로 지르는 목구멍 소리가 인상적인 ‘짙은 어둠을 가르며’ 대목은 황석영 소설 속 “검고 짙은 어둠 저 너머로 아시아의 또 다른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는데” 등 원문의 감동과 연결돼 있다.
수십 명의 단원들은 횡대로 늘어 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 역사의 주인의식을 투영한 가사를 집단 창(唱)했다. 연창자들의 공통 음률과 장단을 뚫고 나오는 선명한 아니리는 뮤지컬·오페라의 아리아와 겹쳐 보인다.
일자별 주역들의 페어(한 쌍의 배역)가 다른 점도 감상 포인트 중 하나, 7일에는 상임단원 정승기와 이서희가, 8일에는 비상임단원 박준현과 고혜수가 출연해 합을 맞춘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이 같은 구성은 국악계 신예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정통의 ‘단단한 소리’와 비교적 ‘날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두 음향이 관객들에게 상이한 감각으로 전이될 것이다”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여주인공 정연옥이 홀로 살아남아 자연물(나무)에 한탄하는 ‘고고천변’도 울려 퍼졌다.
남녀 주역의 2인창인 이 대목은 판소리 사설과 감정선을 엮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창자의 구연에 가벼운 너름새까지 곁들여져 가무악이 혼합된 장면을 연출했다.
3인칭 서사에 갇혀 있던 판소리적 특징은 대화 중심의 앙상블로 변용됐다. 판소리가 ‘일종의 솔로 오페라’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국악관현악기와 창자들의 성음이 조화를 이룬 ‘음향’ 측면에서도 이번 창극은 동시대적(컨템퍼러리) 효과를 실험한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여백의 음향인 ‘여향’은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동서양 역사가 아직 미완 상태임을 암시하는 계제로 활용된다”면서 “순환하는 잔향과 여향의 향연 속에서 관객들은 불완전한 역사가 완성으로 향해가는 메시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박승희)이 창극 ‘여울물 소리’를 오는 11월 7~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에 앞서 16일 국악당에서 주요 대목을 미리 만나는 프리뷰 시간이 마련됐다.
원작 소설은 동학 혁명의 실패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소시민적 삶을 초점화한다. 이를 모티브 삼은 창극은 어떤 모습일까.
원작 소설의 서사에 얼개를 두면서 공연 형식을 잘 접목한 점은 ‘여울물 소리’만의 매력이다. 원작의 여러 인물을 한 명으로 통합하거나 시공간의 편집, 특정 에피소드를 삭제하는 등 개작을 거쳐 흥미를 배가시켰다.
극은 동학의 대규모 전쟁 장면도 과감하게 덜어냈다. 주인공 연옥은 강경 객주를 운영하다가 동학 혁명에 참여한 이신통과 사랑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주목할 수도 있으나 개개인의 감정 표현에 방점을 뒀다.
원작에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의 감정변화, 시간 흐름은 창극에서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궁금했다.
황 연출가는 “출연진이 이런 점을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정 인물이 죽는 시간대를 뒤틀거나, 장소와 시간을 교차시키는 드라마틱한 변주를 통해 해결했다”고 답했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요, 하늘이 바로 사람”이라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가사에 담은 ‘짙은 어둠을 가르며’ 대목. |
특히 통성으로 지르는 목구멍 소리가 인상적인 ‘짙은 어둠을 가르며’ 대목은 황석영 소설 속 “검고 짙은 어둠 저 너머로 아시아의 또 다른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는데” 등 원문의 감동과 연결돼 있다.
수십 명의 단원들은 횡대로 늘어 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 역사의 주인의식을 투영한 가사를 집단 창(唱)했다. 연창자들의 공통 음률과 장단을 뚫고 나오는 선명한 아니리는 뮤지컬·오페라의 아리아와 겹쳐 보인다.
일자별 주역들의 페어(한 쌍의 배역)가 다른 점도 감상 포인트 중 하나, 7일에는 상임단원 정승기와 이서희가, 8일에는 비상임단원 박준현과 고혜수가 출연해 합을 맞춘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이 같은 구성은 국악계 신예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정통의 ‘단단한 소리’와 비교적 ‘날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두 음향이 관객들에게 상이한 감각으로 전이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연옥 역을 맡은 창극단 고혜수 단원이 세번째 씬 ‘고고천변’을 선보이는 장면. |
남녀 주역의 2인창인 이 대목은 판소리 사설과 감정선을 엮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창자의 구연에 가벼운 너름새까지 곁들여져 가무악이 혼합된 장면을 연출했다.
3인칭 서사에 갇혀 있던 판소리적 특징은 대화 중심의 앙상블로 변용됐다. 판소리가 ‘일종의 솔로 오페라’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국악관현악기와 창자들의 성음이 조화를 이룬 ‘음향’ 측면에서도 이번 창극은 동시대적(컨템퍼러리) 효과를 실험한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여백의 음향인 ‘여향’은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동서양 역사가 아직 미완 상태임을 암시하는 계제로 활용된다”면서 “순환하는 잔향과 여향의 향연 속에서 관객들은 불완전한 역사가 완성으로 향해가는 메시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