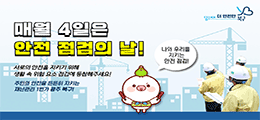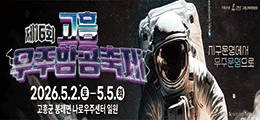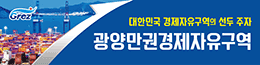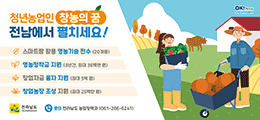한국고전문학사 강의 - 박희병 지음
고전문학은 내가 내 땅에 내린 거대한 뿌리
한국 고전문학사 강의 (전 3권)
한국 고전문학사 강의 (전 3권)
 최근 국립 중앙도서관이 실감형 체험공간 ‘열린마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실감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송강 정철의 가사작품 ‘관동별곡’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
“심학자(心學者)는 덕을 세우고 구학자(口學者)는 말을 세우니 덕이란 것은 혹 말에 의지해야 가히 일컬어질 수 있으며, 말이란 것은 혹 덕에 기대어야 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은 ‘낭혜화상비명’에서 비문을 쓰게 된 내적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심학자’(마음을 닦는 학자)는 승려를, ‘구학자’(언어로 학문을 하는 사람)는 문인을 의미한다. 오래도록 전해질 한편의 창의적인 글, 불후의 문장을 쓰기 위해 그 역시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박희병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고전문학사 강의’(전 3권)에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문인적 자의식을 최치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전기(傳奇)소설이라 할 수 있는 ‘호원’(虎願)에 대해서도 “자기 희생의 문제를 우리 문학사에 처음으로 뚜렷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치원은 우리 문학사에서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소설작가라 할 것”이라 설명한다.
대학에서 한국고전문학을 40년 가깝게 가르쳐온 박 교수는 정년을 앞둔 2021년 1학기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지막 수업’을 비대면 ‘줌 강의’로 진행했다. 보통 30명가량 듣던 ‘한국고전문학사’ 수업을 61명이 수강했다. ‘한국고전문학사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뼈대로 수정·보완해 32개 주제 3권의 책으로 엮었다.
1권은 ‘문학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시작으로 ‘건국신화와 광개토왕 비문’부터 ‘고려말 신흥 사대부층의 형성과 그 문학’을 살핀다. 2권은 ‘조선 전기 문학을 보는 시각-훈구파와 사림파’에서 조선 후기 ‘중인문학’과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들’까지 나아간다. 3권은 실학자 홍대용과 박지원, 담연그룹을 비롯해 추방된자의 글쓰기-정약용·이학규, 그리고 ‘근대와 고전문학의 행방’까지를 보여준다.
박 교수는 1강 ‘문학사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며 “문학의 역사속에 구현된 인간의 다양한 마음이며 정신과 대면함으로써 삶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 문학사 수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전문학사 공부는 역사 속에 궤적을 남긴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정신을 엿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보면 학창 시절 배웠던 한국 고전문학사는 피상적이었음을 단번에 깨닫는다. 그저 문인과 작품·책 제목만을 암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신간은 마치 박 교수의 ‘마지막 수업’을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주몽에게 보리종자를 건네는 모습을 얘기하며 “동명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상고시대 문학사의 눈대목”이라고 평가한다.
16~17세기 여성 문인들(황진이, 허난설헌, 이옥봉, 매창, 설죽)과 최치원, 이규보, 김시습, 임제, 이언진 등 세상과 불화했거나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문인들에 주목한다. 특히 중인(中人) 역관 출신 이언진(1740~1766)이 생소하다. 26살이라는 짧은 생을 산 그는 호로 골목길이라는 의미의 ‘호동’을 사용했다. 사후 100년 가까운 1860년 후배 역관시인들이 중국에서 유고집(송목관집)을 간행했고, 후손들이 유고집(송목관신여고)을 펴냈다. ‘신여고’는 ‘타다남은 원고’를 의미한다.
저자를 따라 한국 고전문학이라는 울창한 숲속을 걷다보면 이제껏 보지 못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게 된다. 저자는 시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인용하며 한국 고전문학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나’의 거대한 뿌리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이지요.”
<돌베개·각권 2만7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통일신라시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은 ‘낭혜화상비명’에서 비문을 쓰게 된 내적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심학자’(마음을 닦는 학자)는 승려를, ‘구학자’(언어로 학문을 하는 사람)는 문인을 의미한다. 오래도록 전해질 한편의 창의적인 글, 불후의 문장을 쓰기 위해 그 역시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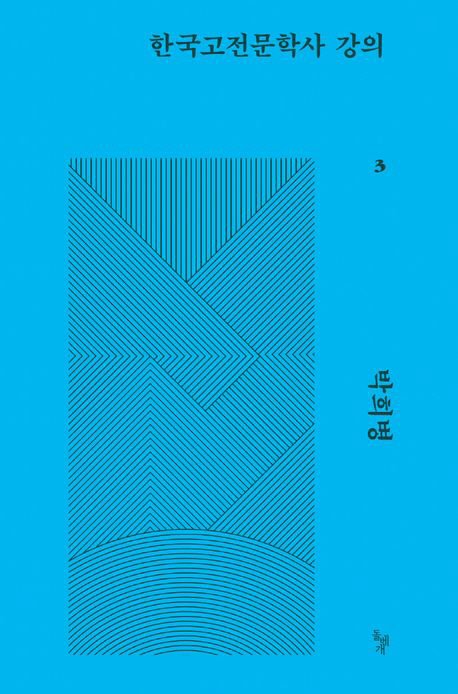 |
박 교수는 1강 ‘문학사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며 “문학의 역사속에 구현된 인간의 다양한 마음이며 정신과 대면함으로써 삶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 문학사 수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전문학사 공부는 역사 속에 궤적을 남긴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정신을 엿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보면 학창 시절 배웠던 한국 고전문학사는 피상적이었음을 단번에 깨닫는다. 그저 문인과 작품·책 제목만을 암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신간은 마치 박 교수의 ‘마지막 수업’을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주몽에게 보리종자를 건네는 모습을 얘기하며 “동명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상고시대 문학사의 눈대목”이라고 평가한다.
16~17세기 여성 문인들(황진이, 허난설헌, 이옥봉, 매창, 설죽)과 최치원, 이규보, 김시습, 임제, 이언진 등 세상과 불화했거나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문인들에 주목한다. 특히 중인(中人) 역관 출신 이언진(1740~1766)이 생소하다. 26살이라는 짧은 생을 산 그는 호로 골목길이라는 의미의 ‘호동’을 사용했다. 사후 100년 가까운 1860년 후배 역관시인들이 중국에서 유고집(송목관집)을 간행했고, 후손들이 유고집(송목관신여고)을 펴냈다. ‘신여고’는 ‘타다남은 원고’를 의미한다.
저자를 따라 한국 고전문학이라는 울창한 숲속을 걷다보면 이제껏 보지 못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게 된다. 저자는 시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인용하며 한국 고전문학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나’의 거대한 뿌리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이지요.”
<돌베개·각권 2만7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