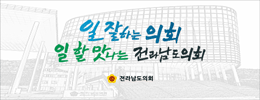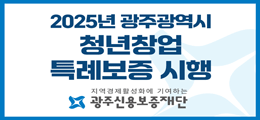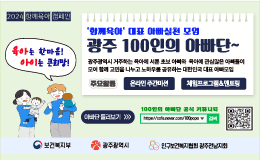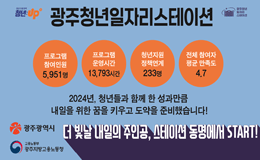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경주 옥산서원] 시대와 불화했지만 ‘선비의 길’ 걸었던 이언적의 고뇌와 깨달음
사림 시련기 활동…조선 성리학 깊이 궁구했던 첫세대 학자
양재역벽서사건 연루 유배…‘구인록’·‘대학장구보유’ 등 남겨
선조 현판 내려 사액서원으로…구인당·체인당·경각 등 자리
양재역벽서사건 연루 유배…‘구인록’·‘대학장구보유’ 등 남겨
선조 현판 내려 사액서원으로…구인당·체인당·경각 등 자리
 경주 옥산서원은 조선의 성리학을 깊이 궁구했던 유학자 이언적이 배향된 곳이다. |
이름이나 명칭은 대상을 규정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대상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모든 만물에는 그에 합당한 이름이나 명칭이 있다. ‘이름대로 된다’는 말은 그래서 대상을 가장 적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곳에 가면서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다. 궁극의 의미까지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범인의 협량에서만이라도 대략이나마 가늠해보고 싶었다. 옛날 선비들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엿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사실 시대의 격랑을 헤쳐 온 이들의 깊은 심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그 비탈의 순간에 ‘선비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같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까지 그 정신이 현현된 특징을 지닌다. 바로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이 격동의 시간을 무화해 영속성을 획득했기 때문일 터다.
9월 중순을 지났지만 여전히 한낮의 햇볕은 날카롭고 눈부시다. 조석으로 한기는 조금 배어 있지만 낮의 절정에는 여름 못지않은 열기가 느껴진다.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을 때라 햇볕의 은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따사로움이 봄을 지지한다면 따가움은 가을을 떠받친다. 처음은 동일한 볕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볕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제 한두 번의 고비를 넘기면 급속도로 볕의 기세는 누그러질 것이다.
상상을 해보았다. 얼마나 주변 산세와 풍경이 그림 같으면 그런 이름을 들였을까 라고. 옥산서원(玉山書院). 오늘 행선지는 경주 옥산서원이다. 동으로 횡단하여 가는 길, 빛고을에서 서라벌까지 간다. 서에서 동으로, 마치 역류하듯, 그렇게 가는 여정이다.
경주는 신라와 통일신라의 본산이다. 단순한 수도를 넘어 정신과 문화와 철학과 학문, 모든 사람살이의 중심이 그곳을 접점으로 이루어졌다. 서라벌의 문화와 역사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끝없이 이어진 산줄기 위에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내내 옥산(玉山)이라는 명칭이 뇌리를 맴돈다. 옥산의 사전적 의미는 “외모와 풍채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또 하나는 “신선이 사는 곳”을 일컫기도 한다.
과연 어떤 풍광 위에 서원이 자리하고 있을까. 곱디고운 기와, 처마와 아귀 맞아 떨어지는 기둥들의 빛나는 조화 등도 그려졌다. 자태와 품까지도 분명 옥산에 값할 것이라며 막연한 예상을 해보았다.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1491~1553)이 배향된 곳이다. 그의 생몰에서 보듯 조선 서화의 광풍이 불던 시기를 살았다. 그를 일컬어 조선의 성리학을 깊이 궁구했던 첫 세대 학자라고 평하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는 불우했다. 아니 참담했고 무참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들 수 있다. 반대의 목소리, 반대의 관점을 포용하지 않는 사화는 비인간화된 사회다. 한마디로 야만의 사회다. 아량과 넉넉함, 다를 수 있다는 사유의 유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세상의 이치는 정반합의 원리와 일정부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회재는 사화가 반복되는 사림의 시련기에 활동했다. 경주 출신의 그는 함경도 강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성리학적 이상의 추구는 한낱 가뭇없는 일장춘몽이었을까.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표상을 붙들고자 했던 선비의 기상을 불의한 시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언적은 성균관 유생 이번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 살 무렵에 아버지를 여의고 외삼촌 손중돈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요직을 두루 거쳤던 외삼촌의 영향으로 이언적은 당대 문사들로부터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당시 훈구파인 김안로의 재임용을 반대했으며 그로 인해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수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에 안겨 홀로 독락당을 짓고 시문을 지었다. 그러다 오랜 칩거 끝에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지만 그것도 잠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돼 함경도로 유배를 당한다.
그곳에서 이언적은 꾸준히 저술활동을 펼쳐 ‘구인록’(求仁錄)과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등을 남겼다. 그는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를 토대로 자신만의 학문적 성취를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인록’은 인(仁)에 대한 그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책이다. 아울러 이언적은 ‘대학’에 바탕을 두고 성리학적 세계에 근거한 왕의 치세와 자세를 주창하기도 했다. ‘일강십목소’에서는 임금의 근본 강령을 비롯해 하늘과 민심에 기반한 도학적 수양론을 펼쳤다.
말 그대로 옥산서원은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자리했다. 도덕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서원 앞을 지나 사시사철 맑은 물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서원은 야트막한 화개산을 배경으로 맞춤하니 들어 앉아 있고, 앞의 자옥산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계곡에 부려지듯 펼쳐진 세심대(洗心臺)는 물살에 닳고 닳은 바위들이 연하여 수묵화의 분위기를 발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글귀는 성리학적 이념을 단순 명쾌하게 집약해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서원이 자리한 곳은 신선들의 놀음판을 그린 동양화의 한 장면을 옮겨온 모습이다. 이곳 사람들은 옥산서원을 명당이라 해석하는데 ‘봉황이 알을 품은 곳’으로 보는 것은 그런 연유다. 1574년 선조가 현판을 내려주고 사액서원이 됐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무변루와 마주한다. 누마루 형식의 건물은 자옥산 풍경을 일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강학공간인 구인당에는 옥산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 가운데 외부 현판은 이산해가 썼지만 화재로 소실되자 추사 김정희가 다시 썼다고 전해온다. 내부의 현판은 옛날 것을 모각했다고 전해온다.
구인당 뒤로는 이언적 위패가 봉안된 체인당이 있으며 구인당 좌우로는 유생들이 기숙하던 민구재와 암수재가 있다. 옥산서원에는 유림들의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경각이 그것이다. 이언적의 서자인 이전인이 1554년 건립했다. 이언적의 서적과 유품, 퇴계 수필 등을 보관했다.
전체적으로 서원은 이언적이 지향했던 이상세계를 포괄한다. 시대와 불화했지만 결코 선비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그의 고뇌와 깨달음이 드리워져 있다. 조변석개로 변하고 아세를 위해 곡학을 서슴지 않는 오늘의 허다한 선비들과는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다. 궁극의 의미까지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범인의 협량에서만이라도 대략이나마 가늠해보고 싶었다. 옛날 선비들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엿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사실 시대의 격랑을 헤쳐 온 이들의 깊은 심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9월 중순을 지났지만 여전히 한낮의 햇볕은 날카롭고 눈부시다. 조석으로 한기는 조금 배어 있지만 낮의 절정에는 여름 못지않은 열기가 느껴진다.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을 때라 햇볕의 은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상상을 해보았다. 얼마나 주변 산세와 풍경이 그림 같으면 그런 이름을 들였을까 라고. 옥산서원(玉山書院). 오늘 행선지는 경주 옥산서원이다. 동으로 횡단하여 가는 길, 빛고을에서 서라벌까지 간다. 서에서 동으로, 마치 역류하듯, 그렇게 가는 여정이다.
 강당인 구인당에서 바라본 부벽루. |
과연 어떤 풍광 위에 서원이 자리하고 있을까. 곱디고운 기와, 처마와 아귀 맞아 떨어지는 기둥들의 빛나는 조화 등도 그려졌다. 자태와 품까지도 분명 옥산에 값할 것이라며 막연한 예상을 해보았다.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1491~1553)이 배향된 곳이다. 그의 생몰에서 보듯 조선 서화의 광풍이 불던 시기를 살았다. 그를 일컬어 조선의 성리학을 깊이 궁구했던 첫 세대 학자라고 평하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는 불우했다. 아니 참담했고 무참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들 수 있다. 반대의 목소리, 반대의 관점을 포용하지 않는 사화는 비인간화된 사회다. 한마디로 야만의 사회다. 아량과 넉넉함, 다를 수 있다는 사유의 유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세상의 이치는 정반합의 원리와 일정부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회재는 사화가 반복되는 사림의 시련기에 활동했다. 경주 출신의 그는 함경도 강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성리학적 이상의 추구는 한낱 가뭇없는 일장춘몽이었을까.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표상을 붙들고자 했던 선비의 기상을 불의한 시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언적은 성균관 유생 이번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 살 무렵에 아버지를 여의고 외삼촌 손중돈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요직을 두루 거쳤던 외삼촌의 영향으로 이언적은 당대 문사들로부터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유림들의 도서관 역할을 했던 경각. |
그곳에서 이언적은 꾸준히 저술활동을 펼쳐 ‘구인록’(求仁錄)과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등을 남겼다. 그는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를 토대로 자신만의 학문적 성취를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인록’은 인(仁)에 대한 그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책이다. 아울러 이언적은 ‘대학’에 바탕을 두고 성리학적 세계에 근거한 왕의 치세와 자세를 주창하기도 했다. ‘일강십목소’에서는 임금의 근본 강령을 비롯해 하늘과 민심에 기반한 도학적 수양론을 펼쳤다.
말 그대로 옥산서원은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자리했다. 도덕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서원 앞을 지나 사시사철 맑은 물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서원은 야트막한 화개산을 배경으로 맞춤하니 들어 앉아 있고, 앞의 자옥산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계곡에 부려지듯 펼쳐진 세심대(洗心臺)는 물살에 닳고 닳은 바위들이 연하여 수묵화의 분위기를 발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글귀는 성리학적 이념을 단순 명쾌하게 집약해 보여준다.
 세심대(洗心臺)라고 불리는 서원 앞을 흐르는 맑은 계곡. |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무변루와 마주한다. 누마루 형식의 건물은 자옥산 풍경을 일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강학공간인 구인당에는 옥산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 가운데 외부 현판은 이산해가 썼지만 화재로 소실되자 추사 김정희가 다시 썼다고 전해온다. 내부의 현판은 옛날 것을 모각했다고 전해온다.
구인당 뒤로는 이언적 위패가 봉안된 체인당이 있으며 구인당 좌우로는 유생들이 기숙하던 민구재와 암수재가 있다. 옥산서원에는 유림들의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경각이 그것이다. 이언적의 서자인 이전인이 1554년 건립했다. 이언적의 서적과 유품, 퇴계 수필 등을 보관했다.
전체적으로 서원은 이언적이 지향했던 이상세계를 포괄한다. 시대와 불화했지만 결코 선비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그의 고뇌와 깨달음이 드리워져 있다. 조변석개로 변하고 아세를 위해 곡학을 서슴지 않는 오늘의 허다한 선비들과는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