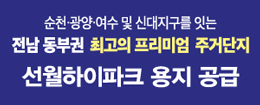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23>오감으로 마시는 茶…사람을 잇고 예술을 싹틔우다
<제3부> 전라도, 문화예술 꽃피우다 ⑥ 차문화, 예술과 대화를 우려내다
차문화는 심신수양이자 전통문화
초의선사 해남서 제다·다도 완성
다구 발달, 시서화 등 예술로 승화
차주산지 보성, 전국 생산량의 40%
커피 대신 차문화 되살릴 대책 절실
차문화는 심신수양이자 전통문화
초의선사 해남서 제다·다도 완성
다구 발달, 시서화 등 예술로 승화
차주산지 보성, 전국 생산량의 40%
커피 대신 차문화 되살릴 대책 절실
 보성은 차 주산지이다. 대한다원은 1939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대 다원으로, 약 50여만평의 차밭에서 580만 그루의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 전국 유일의 차 관광농원이다. 여름향기·태왕사신기 등 드라마·영화·CF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보성=최현배 기자 choi@ |
“나는 요즘 다(茶)만 탐식하는 사람이 되어 겸하여 약으로 마신다네. … 산에 나무도 하러가지 못할 병이 있어 차를 얻고자 하는 뜻을 전하네. 듣건대 고해(苦海)를 건너는 데는 보시를 가장 중히 여긴다는데, 이름난 산의 고액(苦液)이며 풀 중의 영약으로 으뜸인 차가 제일이 아니겠는가. 목마르게 바라는 뜻을 헤아려 달빛과 같은 은혜를 아끼지 말기 바라네.”
전통차를 즐기는 다인(茶人)들에게 유명한 다산 정약용의 ‘걸명소(乞茗疏)’다. ‘차를 구걸한다’는 의미로, 다산이 백련사 주지 ‘혜장스님’에게 보낸 편지다. 대학자 다산의 명성·무게에 걸맞지 않게 사정하는 모양새가 입꼬리를 살며시 들어올리게 하는 글이다. 차를 즐긴 다산은 관련 저술은 물론 제자 18명과 ‘다신계(茶信契)’까지 조직했다.
더 재미난 편지도 있다. 추사 김정희가 평생지기인 초의선사에게 보낸 글이다.
“편지를 해도 답할 생각을 않는 건 산중이 바쁜 탓만이 아니고 세속과 교섭할 뜻이 없다고 보여지네. … 이 백수의 늙은이가 가소롭게도 한 때 절연할 생각까지 품었음을 고백하네. … 나는 스님을 보는 것은 물론 스님의 글까지도 보고 싶지 않네. 다만 차와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 없으니 … 두 해나 쌓인 체납세를 보내시게. 다시 미루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좋을 것이네. 그렇지 않으면 … 덕산선사의 몽둥이를 맞아야 마땅할 것이고, 백천겁을 지낸다해도 이 몽둥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네.”
애교스러운 협박이다. 따뜻한 농(弄)이 가득하면서도 차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
◇다산이 구걸한 영약 ‘茶’
이들은 왜 이처럼 차를 갈망했을까. 차는 인간의 삶과 닮았고, 무욕과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는 여망이 닮아서 일 테다.
차 한 잔에 ‘쓰고, 떫고, 시고, 짜고, 단’ 맛이 들어있다고 한다. 차는 또 오감(五感)으로 마신다고 한다. 귀로 찻물 끓이는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눈으로 다구와 차를 보고, 입으로 차를 맛보며, 손으로 찻잔의 감촉을 즐기라는 것이다. 마치 ‘귀한 이와 교감’하는 모양새다. 차를 귀하게 대하다보니 ‘선(禪)’과 함께 발달했다.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차와 좋은 물, 차를 끓이는 여러가지 일을 ‘다도(茶道)’라 했고, 차를 마시는 행위와 수행을 하나로 봐 ‘다선일미(茶禪一味)’가 뿌리내렸다. 고려 이규보는 “한 잔의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도를 완성한 이는 ‘초의대선사’다. 초의선사는 나주 사람으로 속성은 장(張)씨이며, 자는 중부, 법명은 의순, 호는 초의, 별호는 일지암이다. 그는 제다법·끽다법 등을 정립했고, ‘한국판 다경’이라는 ‘동다송’(東茶頌)을 쓰고, ‘다신전’(茶神傳)을 엮어냈다. 그래서 초의를 ‘다성(茶聖)’으로 추앙한다. 그는 차에 깃든 정신을 ‘중정(中正)’이라고 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름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일지암에서 40여 년간 주석하며 ‘선다일여(禪茶一如), 제법일여(諸法一如)’ 사상을 구현했다.
일지암은 대흥사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30여분 더 오른 곳에 있다. 오솔길이었으면 더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커피에 내어준 자리 되찾을 순 없을까
발걸음을 광주로 되돌렸다. 점심식사 후 도심 충장로의 광경 중 하나는 거니는 이들 모두의 손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이 들려있는 것이다. ‘식후연초’를 뛰어넘는 ‘식후아메’다. ‘별다방’ 커피라면 자아도취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언제부터 다방이 커피숍이 된 것일까.
또 있다. 식후 ‘차 한 잔 주세요’ 부탁하면 차는 나오지 않고 커피가 나온다. 커피가 차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차는 제 이름을 커피에 내어주고, 자신은 내어줘버린 차와 구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앞에 전통을 덧대어 ‘전통차’ 또는 ‘녹차’라 개명하고 말았다.
가짜가 진짜 자리를 차지했지만 불평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마치 정치권의 모습과 닮았다. 부정이 관행이 되고, 관행은 잘못이 아니라는 어거지 등식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 차문화를 세우고, 이끌어 온 곳은 전남이다. 차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예술의 싹을 틔웠다. 차문화의 발전은 다구의 발달로 이어졌다. 다구는 소유자의 취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공예품이자 당대의 조형미와 정서를 표현한다. 강진의 청자 다구가 대표적이다. 차문화는 또 다실이나 다실에 접하는 정원에 영향을 미쳤고, 그림과 시로 승화됐다. 차밭 또한 지리산을 기점으로 산청·하동에서 광양·보성·강진·해남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을 따라 띠처럼 펼쳐져 있다. 보성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차문화는 수양과 수행, 교류와 소통, 성찰로 이어지는 심신수양이요, 제다·다도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다. 차문화가 살아나면 전라도의 문화와 예술, 경제도 다시 꿈틀거리게 된다.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생각해볼 때다. 전라도 혼이 담긴 차문화가 본고장에서 사라져가는 아쉬움의 단상이다.
/보성·해남=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녹차 요리법
차를 항상 마시는 사람의 피부는 탄력성이 있다. 녹차가 질 좋은 알칼리성식품인 덕분이다.
선조들은 우려먹고 난 차찌거기를 한 잎도 버리는 않고 활용했다. 차잎으로 요리를 했고, 술을 담그어 차술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상의 식품’인 차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요리를 소개한다.
▲돼지삼겹살과 차구이
돼지갈비찜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권할만한 요리다. 돼지고기를 프라이팬이나 석쇠에 얹어놓고 녹차를 뿌려가며 구운다.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하고 차향기가 스며들어 누린내가 나지않아 다른 고기로 알 정도다. 고기 위에 얹어놓은 차잎은 그대로 먹어도 좋다. 차잎은 위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볶음밥
2인분을 만들려면 차숟갈 한개 정도의 녹차가 필요하다. 뜨거운 물에 녹차를 한 번 우려낸다. 쇠고기, 감자, 양파, 애호박, 당근을 잘게 썬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먼저 고기를 볶는다. 야채를 넣어 볶다가 익어갈즈음 밥을 넣고 우려낸 차잎과 풋고추를 다져넣는다. 먹을 때 우려둔 차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따로 국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차나물
녹차를 마신 다음 우려낸 차잎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갑자기 손님이 와 반찬이 없을때 무쳐내면 훌륭한 반찬이 된다. 참기름, 깨소금, 조미료, 국간장을 넣어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맛있게 무쳐낸다. 차나물을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차를 한 번 정도만 우려 마시고 무쳐야 향이 남아있어 차나물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차술
소주가 적격이다. 소주는 알콜도수가 높아 술이 약하거나 술을 마셨다 하면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설사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소주에 녹차를 타 마시면 술이 쉽게 깨고 많이 마셔도 후유증이 별로 없다.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녹차를 차숟갈 3개 정도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 첫물은 우려 마시고 다음에 2홉들이 소주 한병을 붓는다. 20분 후에 마시면 맛있는 차술이 된다. 티백으로 된 녹차를 2홉들이 소주면 1~2개를 놓고 차가 누렇게 우러나올 때 마시기도 한다.
더 재미난 편지도 있다. 추사 김정희가 평생지기인 초의선사에게 보낸 글이다.
“편지를 해도 답할 생각을 않는 건 산중이 바쁜 탓만이 아니고 세속과 교섭할 뜻이 없다고 보여지네. … 이 백수의 늙은이가 가소롭게도 한 때 절연할 생각까지 품었음을 고백하네. … 나는 스님을 보는 것은 물론 스님의 글까지도 보고 싶지 않네. 다만 차와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 없으니 … 두 해나 쌓인 체납세를 보내시게. 다시 미루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좋을 것이네. 그렇지 않으면 … 덕산선사의 몽둥이를 맞아야 마땅할 것이고, 백천겁을 지낸다해도 이 몽둥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네.”
 초의선사가 다도를 일으켰던 해남 대흥사 일지암. |
◇다산이 구걸한 영약 ‘茶’
이들은 왜 이처럼 차를 갈망했을까. 차는 인간의 삶과 닮았고, 무욕과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는 여망이 닮아서 일 테다.
차 한 잔에 ‘쓰고, 떫고, 시고, 짜고, 단’ 맛이 들어있다고 한다. 차는 또 오감(五感)으로 마신다고 한다. 귀로 찻물 끓이는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눈으로 다구와 차를 보고, 입으로 차를 맛보며, 손으로 찻잔의 감촉을 즐기라는 것이다. 마치 ‘귀한 이와 교감’하는 모양새다. 차를 귀하게 대하다보니 ‘선(禪)’과 함께 발달했다.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차와 좋은 물, 차를 끓이는 여러가지 일을 ‘다도(茶道)’라 했고, 차를 마시는 행위와 수행을 하나로 봐 ‘다선일미(茶禪一味)’가 뿌리내렸다. 고려 이규보는 “한 잔의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도를 완성한 이는 ‘초의대선사’다. 초의선사는 나주 사람으로 속성은 장(張)씨이며, 자는 중부, 법명은 의순, 호는 초의, 별호는 일지암이다. 그는 제다법·끽다법 등을 정립했고, ‘한국판 다경’이라는 ‘동다송’(東茶頌)을 쓰고, ‘다신전’(茶神傳)을 엮어냈다. 그래서 초의를 ‘다성(茶聖)’으로 추앙한다. 그는 차에 깃든 정신을 ‘중정(中正)’이라고 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름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일지암에서 40여 년간 주석하며 ‘선다일여(禪茶一如), 제법일여(諸法一如)’ 사상을 구현했다.
일지암은 대흥사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30여분 더 오른 곳에 있다. 오솔길이었으면 더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초의대선사상. 해남 대흥사 경내에 있다. |
◇커피에 내어준 자리 되찾을 순 없을까
발걸음을 광주로 되돌렸다. 점심식사 후 도심 충장로의 광경 중 하나는 거니는 이들 모두의 손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이 들려있는 것이다. ‘식후연초’를 뛰어넘는 ‘식후아메’다. ‘별다방’ 커피라면 자아도취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언제부터 다방이 커피숍이 된 것일까.
또 있다. 식후 ‘차 한 잔 주세요’ 부탁하면 차는 나오지 않고 커피가 나온다. 커피가 차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차는 제 이름을 커피에 내어주고, 자신은 내어줘버린 차와 구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앞에 전통을 덧대어 ‘전통차’ 또는 ‘녹차’라 개명하고 말았다.
가짜가 진짜 자리를 차지했지만 불평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마치 정치권의 모습과 닮았다. 부정이 관행이 되고, 관행은 잘못이 아니라는 어거지 등식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 차문화를 세우고, 이끌어 온 곳은 전남이다. 차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예술의 싹을 틔웠다. 차문화의 발전은 다구의 발달로 이어졌다. 다구는 소유자의 취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공예품이자 당대의 조형미와 정서를 표현한다. 강진의 청자 다구가 대표적이다. 차문화는 또 다실이나 다실에 접하는 정원에 영향을 미쳤고, 그림과 시로 승화됐다. 차밭 또한 지리산을 기점으로 산청·하동에서 광양·보성·강진·해남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을 따라 띠처럼 펼쳐져 있다. 보성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차문화는 수양과 수행, 교류와 소통, 성찰로 이어지는 심신수양이요, 제다·다도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다. 차문화가 살아나면 전라도의 문화와 예술, 경제도 다시 꿈틀거리게 된다.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생각해볼 때다. 전라도 혼이 담긴 차문화가 본고장에서 사라져가는 아쉬움의 단상이다.
/보성·해남=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녹차 요리법
차를 항상 마시는 사람의 피부는 탄력성이 있다. 녹차가 질 좋은 알칼리성식품인 덕분이다.
선조들은 우려먹고 난 차찌거기를 한 잎도 버리는 않고 활용했다. 차잎으로 요리를 했고, 술을 담그어 차술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상의 식품’인 차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요리를 소개한다.
▲돼지삼겹살과 차구이
돼지갈비찜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권할만한 요리다. 돼지고기를 프라이팬이나 석쇠에 얹어놓고 녹차를 뿌려가며 구운다.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하고 차향기가 스며들어 누린내가 나지않아 다른 고기로 알 정도다. 고기 위에 얹어놓은 차잎은 그대로 먹어도 좋다. 차잎은 위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볶음밥
2인분을 만들려면 차숟갈 한개 정도의 녹차가 필요하다. 뜨거운 물에 녹차를 한 번 우려낸다. 쇠고기, 감자, 양파, 애호박, 당근을 잘게 썬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먼저 고기를 볶는다. 야채를 넣어 볶다가 익어갈즈음 밥을 넣고 우려낸 차잎과 풋고추를 다져넣는다. 먹을 때 우려둔 차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따로 국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차나물
녹차를 마신 다음 우려낸 차잎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갑자기 손님이 와 반찬이 없을때 무쳐내면 훌륭한 반찬이 된다. 참기름, 깨소금, 조미료, 국간장을 넣어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맛있게 무쳐낸다. 차나물을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차를 한 번 정도만 우려 마시고 무쳐야 향이 남아있어 차나물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차술
소주가 적격이다. 소주는 알콜도수가 높아 술이 약하거나 술을 마셨다 하면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설사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소주에 녹차를 타 마시면 술이 쉽게 깨고 많이 마셔도 후유증이 별로 없다.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녹차를 차숟갈 3개 정도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 첫물은 우려 마시고 다음에 2홉들이 소주 한병을 붓는다. 20분 후에 마시면 맛있는 차술이 된다. 티백으로 된 녹차를 2홉들이 소주면 1~2개를 놓고 차가 누렇게 우러나올 때 마시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