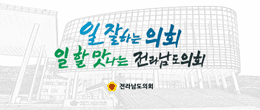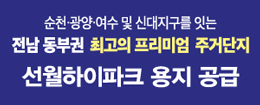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전라도 들여다보기] 보성소리와 서편제 - 김형주
녹차의 고장 보성은 전남 남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예당평야 등 기름진 들판과 득량만을 접하고 있어 쌀·감자·참다래·꼬막 등의 농수산 특산물이 그득하다. 보성은 풍요로운 물산의 산출과 더불어 예로부터 ‘소리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전라도에 발생의 기원을 두는 판소리 분야에서 눈부신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성지역 일대에서 연희된 판소리를 일컬어서 보성소리라 하였다. ‘보성소리’는 서편제를 창시한 박유전의 제자인 정재근이 정응민에게 전수시킨 소리의 유파를 지칭하는데, 서편제 가운데서도 19세기말 보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판소리의 분파인 셈이다. 한편, 박유전이 정재근에게 전수시킨 ‘심청가’를 ‘강산제’(江山制)라 하였는데, 보성소리 범주에 포함된다. ‘강산제’라는 명칭은 남원 출신의 박유전이 이주한 곳이 보성의 ‘강산리’였기 때문이라는 설과 그가 한양의 공연에서 보여준 탁월한 기량에 감복한 대원군이 “네가 강산 제일(第一)이다”는 극찬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와 아니리(사설)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는 국악의 종류를 말한다. 판소리의 중흥조인 신재효는 판소리꾼이 구비해야할 요건으로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得音), 너름새(동작)’ 등 4가지 법례를 들었다.
판소리는 조선중기까지 무려 12마당에 걸쳐 존재하였지만, 조선후기에 들어 신재효에 의해 대본의 내용이 정리되고 예술적으로 정제되면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5마당으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와 충청도 서부, 경기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전승하면서 지리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른 유파가 발생하였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東便制), 전라도 서남지역은 서편제(西便制), 경기·충청도지역은 중고제(中高制)라 하여 3개의 법제가 존재한다.
동편제는 운봉·구례·순창 등 전라도 동부지역에 전승되어 오는데, 순조 때의 명창 송흥록(宋興祿)에서 박만순·송우룡·송만갑·유성준으로 전해졌고 세부 분파로 ‘김세종제’가 추가된다. 동편제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꾸밈음)로 짜여 있어 남성적이다.
서편제는 보성·광주·나주·담양 등 전라도 중서부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로 철종 때의 명창 박유전(朴裕全)을 비조로 이날치·김채만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정창업·김창환·김봉학 등이 큰 줄기를 이루었다.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어 여성적이다.
이밖에 경기·충청지역에서 발달한 중고제는 김창룡·염계달 등의 명창이 있었으며 동편제에 가깝다.
보성소리를 일으킨 정응민의 심청가는 정권진·성우향·안채봉·성창순·조상현이 이어 받았고, 수궁가는 정권진·조상현, 적벽가는 정권진에게 전승되었다. 보성소리는 정재근-정응민-정권진 등 보성(寶城)의 정씨 문중을 통해 전수되었고 이후 성창순·성우향·조상현 등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판소리는 조선중기까지 무려 12마당에 걸쳐 존재하였지만, 조선후기에 들어 신재효에 의해 대본의 내용이 정리되고 예술적으로 정제되면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5마당으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와 충청도 서부, 경기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전승하면서 지리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른 유파가 발생하였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東便制), 전라도 서남지역은 서편제(西便制), 경기·충청도지역은 중고제(中高制)라 하여 3개의 법제가 존재한다.
동편제는 운봉·구례·순창 등 전라도 동부지역에 전승되어 오는데, 순조 때의 명창 송흥록(宋興祿)에서 박만순·송우룡·송만갑·유성준으로 전해졌고 세부 분파로 ‘김세종제’가 추가된다. 동편제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꾸밈음)로 짜여 있어 남성적이다.
서편제는 보성·광주·나주·담양 등 전라도 중서부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로 철종 때의 명창 박유전(朴裕全)을 비조로 이날치·김채만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정창업·김창환·김봉학 등이 큰 줄기를 이루었다.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어 여성적이다.
이밖에 경기·충청지역에서 발달한 중고제는 김창룡·염계달 등의 명창이 있었으며 동편제에 가깝다.
보성소리를 일으킨 정응민의 심청가는 정권진·성우향·안채봉·성창순·조상현이 이어 받았고, 수궁가는 정권진·조상현, 적벽가는 정권진에게 전승되었다. 보성소리는 정재근-정응민-정권진 등 보성(寶城)의 정씨 문중을 통해 전수되었고 이후 성창순·성우향·조상현 등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