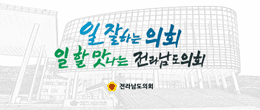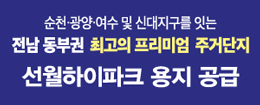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신 호남지- 제8부 여행과 문학] ④ 굴절의 근현대사와 벌교 태백산맥문학관
20세기 한민족 비극적 삶·통한의 역사 응축
 벌교에 있는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 〈광주일보 DB〉 |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믐달이 서편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10권)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한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아낸 작품에는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통한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장대한 소설의 여정은 이렇게 끝난다.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적막은 깊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멀리 스쳐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태백산맥’은 1983년 집필을 시작해 1986년 10월 ‘제1부 한(恨)의 모닥불’ 1∼3권이 출간됐다. 이후 1989년 10월 ‘제4부 전쟁과 분단’ 8∼10권으로 완간됐다. 이 기간 작가는 스스로가 만든 글 감옥에 갇혀 소설 창작에만 매달렸다.
소설에는 김범우, 염상구, 새끼무당 소화 등 270여 명이 등장한다.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정치하게 엮여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겼다. 흔히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인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태백산맥’을 읽고 나면 새삼 실감이 된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태백산맥’은 남도를 배경으로 근현대사를 다룬 소설 가운데 으뜸으로 친다.(대체적인 평자들의 견해가 그렇다) 벌교가 굴곡의 역사 배경이 되었던 데는 지리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 1922년 경전선 철도가 지나면서 벌교는 인근 순천, 고흥, 승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다. 일제는 벌교역을 전남 동부의 물산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는 창구의 일환으로 전략화했다. 이로 인해 급격히 인구가 늘어 1937년에는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번다해진다. 해방 이후에는 쇠락의 기운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성군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가 만만치 않다.
벌교에는 소설 속 공간들이 남아 있다. 만들어진 무대가 아닌 실재하는 공간은 상상력을 압도하는데, 명백한 실재성은 상상 너머의 현재를 강제한다. 길을 걷노라면 어디선가 열차가 달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 시커먼 철교는 소설속 인물 염상구가 벌교를 접수하기 위해 깡패 왕초 땅벌과 담력을 벌였던 곳이다. 그들은 철교 한 가운데 서서 열차가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했었다. “벌교에서 주먹자랑 말라”는 말은 그런저런 연유와 무관치 않으려니 싶다.
철교다리를 지나 걷다 보면 ‘소화다리’를 만날 수 있다. 1931년 6월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원래는 부용교(芙蓉橋)라 불렸다. 소화다리는 비극과 상처가 응집된 공간이다. 여순사건, 6·25의 격랑을 거치면서 양쪽의 세가 갈릴 때마다 총살형이 이루어졌다. 소설에는 참상의 현장이 이렇게 묘사돼 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 사람쥑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겄구만요.”
당시 포구의 갈대밭에 시체들이 뒤엉켜 있었다고 한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는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무참히 목숨을 위해하는 이념은 극단의 악(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읍내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유사하게 복원한 건물도 있다. ‘보성여관’과 ‘벌교금융조합’(현 벌교농민상담소)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감돈다. 원래 명칭보다 소설 속의 ‘남도여관’으로 알려진 보성여관은 당시 일본인들의 중심거리인 ‘본정통’에 있다. 2004년 12월 근대사적, 생활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제132호)로 지정됐다.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보전·관리하는 보성여관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숙박동, 전시실, 다다미방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태백산맥 문학거리를 걸어 나오면 현부자집과 소화의 집을 만난다. 현부자집은 소설 첫머리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한옥과 일본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새끼무당 소화는 무당인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정갈한 여인이다. 조직의 특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의 집에 드나든다.
태백산맥문학관은 소화의 집과 현 부자네 집 근처에 있다. 지난 2008년 건립된 태백산문학관은 연면적 1375㎡(415평), 2층 규모로 육필 원고를 비롯한 159건 719점이 전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은 작가가 생을 마감한 뒤 건립된다. 조정래 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문학관이 세워진 것은 ‘시대성’이라는 당위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작가의 철학은 글을 업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경구와도 같다.
무엇보다 문학관에 전시된 1만 66500장의 육필 원고가 시선을 압도한다.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혈서를 쓰듯’ 글을 썼을 작가의 고뇌가 읽혀진다. 취재수첩, 만년필, 카메라, 지팡이, 한복 정장 등에서도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필사본 전시관에는 ‘태백산맥’을 필사했던 위승환, 김기호, 노영희 씨 등의 원고를 포함해 독자 필사본 23세트가 놓여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높이 8m, 폭 81m의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 벽화다. 모두 4만여 개의 몽돌로 제작한 옹석벽화(擁石壁畵)는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몽돌을 수집해 만들었다. 민족의 염원이 투영된 벽화는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성천 프로필
-소설가
-문학박사
-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10권)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한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아낸 작품에는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통한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장대한 소설의 여정은 이렇게 끝난다.
‘태백산맥’은 1983년 집필을 시작해 1986년 10월 ‘제1부 한(恨)의 모닥불’ 1∼3권이 출간됐다. 이후 1989년 10월 ‘제4부 전쟁과 분단’ 8∼10권으로 완간됐다. 이 기간 작가는 스스로가 만든 글 감옥에 갇혀 소설 창작에만 매달렸다.
소설에는 김범우, 염상구, 새끼무당 소화 등 270여 명이 등장한다.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정치하게 엮여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겼다. 흔히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인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태백산맥’을 읽고 나면 새삼 실감이 된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벌교에는 소설 속 공간들이 남아 있다. 만들어진 무대가 아닌 실재하는 공간은 상상력을 압도하는데, 명백한 실재성은 상상 너머의 현재를 강제한다. 길을 걷노라면 어디선가 열차가 달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 시커먼 철교는 소설속 인물 염상구가 벌교를 접수하기 위해 깡패 왕초 땅벌과 담력을 벌였던 곳이다. 그들은 철교 한 가운데 서서 열차가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했었다. “벌교에서 주먹자랑 말라”는 말은 그런저런 연유와 무관치 않으려니 싶다.
철교다리를 지나 걷다 보면 ‘소화다리’를 만날 수 있다. 1931년 6월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원래는 부용교(芙蓉橋)라 불렸다. 소화다리는 비극과 상처가 응집된 공간이다. 여순사건, 6·25의 격랑을 거치면서 양쪽의 세가 갈릴 때마다 총살형이 이루어졌다. 소설에는 참상의 현장이 이렇게 묘사돼 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 사람쥑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겄구만요.”
당시 포구의 갈대밭에 시체들이 뒤엉켜 있었다고 한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는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무참히 목숨을 위해하는 이념은 극단의 악(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읍내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유사하게 복원한 건물도 있다. ‘보성여관’과 ‘벌교금융조합’(현 벌교농민상담소)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감돈다. 원래 명칭보다 소설 속의 ‘남도여관’으로 알려진 보성여관은 당시 일본인들의 중심거리인 ‘본정통’에 있다. 2004년 12월 근대사적, 생활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제132호)로 지정됐다.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보전·관리하는 보성여관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숙박동, 전시실, 다다미방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태백산맥 문학거리를 걸어 나오면 현부자집과 소화의 집을 만난다. 현부자집은 소설 첫머리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한옥과 일본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새끼무당 소화는 무당인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정갈한 여인이다. 조직의 특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의 집에 드나든다.
태백산맥문학관은 소화의 집과 현 부자네 집 근처에 있다. 지난 2008년 건립된 태백산문학관은 연면적 1375㎡(415평), 2층 규모로 육필 원고를 비롯한 159건 719점이 전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은 작가가 생을 마감한 뒤 건립된다. 조정래 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문학관이 세워진 것은 ‘시대성’이라는 당위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작가의 철학은 글을 업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경구와도 같다.
무엇보다 문학관에 전시된 1만 66500장의 육필 원고가 시선을 압도한다.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혈서를 쓰듯’ 글을 썼을 작가의 고뇌가 읽혀진다. 취재수첩, 만년필, 카메라, 지팡이, 한복 정장 등에서도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필사본 전시관에는 ‘태백산맥’을 필사했던 위승환, 김기호, 노영희 씨 등의 원고를 포함해 독자 필사본 23세트가 놓여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높이 8m, 폭 81m의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 벽화다. 모두 4만여 개의 몽돌로 제작한 옹석벽화(擁石壁畵)는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몽돌을 수집해 만들었다. 민족의 염원이 투영된 벽화는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성천 프로필
-소설가
-문학박사
-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