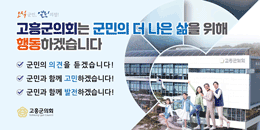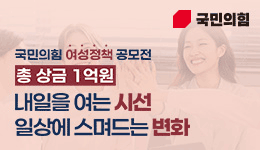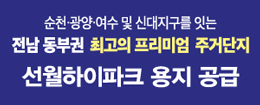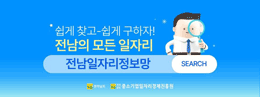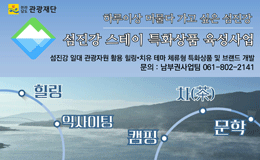윤동주 탄생 100주년
<10> 연재를 마치며
윤동주, ‘저항시인 틀’에서 자유롭게 하자
 우리 시대는 윤동주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를 기존의 ‘저항시인’틀에서 확장된 관점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동국대에서 열린 윤동주서시문학상 시상식에서 공연된 시극 ‘윤동주’.
/최현배기자 choi@ |
서시 -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2년을 전후한 무렵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탈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던 때라 일제의 발악은 극에 달했다.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징용과 징병을 강제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사지로 내몰았다. 그 뿐 아니라 조선어말살 정책 일환으로 일본어를 쓰도록 했으며 신사참배까지 강요했다.
그 즈음은 문학계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말로 글을 쓴다는 것은 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당시 ‘조선문인협회’라는 문학단체가 있었다. 일제 말기에 결성된 이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의미였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자 태평양 전쟁 수행에 동조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유약하거나 기회주의적 성향의 문인들은 이 단체에 가입해 친일활동을 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 또는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기가 문학적 암흑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 지점에서 윤동주의 존재는 빛을 발한다. 오늘 우리가 윤동주를 기억하고, 그의 시 세계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혹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결국 “일송정 푸른 솔”처럼 꿋꿋이 시대의 풍파에 맞섰던 ‘가엾은 사나이는’ 28세라는 푸른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윤동주의 연희전문 후배였던 故 정병욱(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은 추모기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런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려 줄 수 있게 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사진으로 읽는 하늘과 바람과 별’)
또한 정병욱은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일이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본받을 장점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일이었다”며 “술이 들어가면 흔히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다는 비판이나 공격이 오르내리게 마련이지만 그의 입에서 남을 헐뜯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정병욱의 회고나, 여타의 자료는 윤동주가 시인이기 전에 전인적인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학창시절의 그는 시뿐만 아니라 축구선수로도 활동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다. 직접 바느질을 할 정도로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물론 그것이 윤동주를 온전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의 탄생 100주년은 오늘의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준다.
2012년 복원된 중국 용정의 윤동주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2012년 용정시는 옛집을 단장했고 조선족 동포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그러나 표지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 생가, 中國 朝鮮族 愛國詩人 尹東柱 故居’라고 적혀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백두산과 두만강을 오가며 곧잘 시인의 고향을 방문한다. ‘윤동주’ ‘백두산’ ‘두만강’이 환기하는 것은 민족이나 통일과도 같은 정서적인 울림일 거였다. 얼핏 잘 단장돼 보이는 생가는 ‘중국’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에서 윤동주는 ‘한국의 시인’ 보다는 ‘중국 시인’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나 항의도 없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다.
한편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를 저항시인이라는 규정의 범주에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인에 대한 재평가가 확장된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유성호의 윤동주 100주년, 문학과 역사’(문화일보 4월 18일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윤동주는 좁은 의미의 저항 텍스트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예술적 차원에서 극적 생애와 죽음을 결속하면서, 항구적인 ‘보편적 인류애’의 매혹적 텍스트로 기억되어갈 것이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인협회 주최로 일본 도쿄 지요다 구 한국 YMCA 호텔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시인과 일본의 윤동주를 기리는 시민 등이 참석해 그의 시 세계를 기렸다. 우에무라 다카시 가톨릭대 교수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것이 1984년이었다”며 “윤동주가 옥사한 교도소가 있는 후쿠오카(福岡)에선 시민들이 1994년부터 그의 시를 읽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윤동주 관련 행사의 내실화 필요성도 있다. 윤동주는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났기에 사실상 한국에는 그의 연고가 없다. 그가 다닌 연희전문(연세대)과 유고시집이 발견된 광양의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이 있을 뿐이다. 문학적 가치로 봤을 때 광양의 망덕포구는 윤동주의 시정신과 생애를 방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곳을 매개로 윤동주 문학공원, 윤동주 문학벨트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윤동주의 시정신은 남도의 예술혼과 아울러 불의에 항거했던 의로운 정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오늘의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윤동주의 시 속에 녹아있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 “명동(明東)이 민족애라는 용광로 속에서 겨레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녹여서 찍어낸 최고의 작품이 윤동주였다면 윤동주가 민족애라는 용광로 속에 겨레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녹여서 찍어낸 작품은 ‘시’였다. 밤하늘을 스치는 바람을 웃어 주며 반짝이는 별,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사랑의 노래’였다.”(문익환 시인의 ‘윤동주 추모기’, ‘사진으로 읽는 하늘과 바람과 별’) <끝>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2년을 전후한 무렵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탈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던 때라 일제의 발악은 극에 달했다.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징용과 징병을 강제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사지로 내몰았다. 그 뿐 아니라 조선어말살 정책 일환으로 일본어를 쓰도록 했으며 신사참배까지 강요했다.
그 시기가 문학적 암흑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 지점에서 윤동주의 존재는 빛을 발한다. 오늘 우리가 윤동주를 기억하고, 그의 시 세계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혹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결국 “일송정 푸른 솔”처럼 꿋꿋이 시대의 풍파에 맞섰던 ‘가엾은 사나이는’ 28세라는 푸른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윤동주의 연희전문 후배였던 故 정병욱(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은 추모기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런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려 줄 수 있게 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사진으로 읽는 하늘과 바람과 별’)
또한 정병욱은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일이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본받을 장점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일이었다”며 “술이 들어가면 흔히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다는 비판이나 공격이 오르내리게 마련이지만 그의 입에서 남을 헐뜯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정병욱의 회고나, 여타의 자료는 윤동주가 시인이기 전에 전인적인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학창시절의 그는 시뿐만 아니라 축구선수로도 활동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다. 직접 바느질을 할 정도로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물론 그것이 윤동주를 온전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의 탄생 100주년은 오늘의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준다.
2012년 복원된 중국 용정의 윤동주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2012년 용정시는 옛집을 단장했고 조선족 동포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그러나 표지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 생가, 中國 朝鮮族 愛國詩人 尹東柱 故居’라고 적혀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백두산과 두만강을 오가며 곧잘 시인의 고향을 방문한다. ‘윤동주’ ‘백두산’ ‘두만강’이 환기하는 것은 민족이나 통일과도 같은 정서적인 울림일 거였다. 얼핏 잘 단장돼 보이는 생가는 ‘중국’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에서 윤동주는 ‘한국의 시인’ 보다는 ‘중국 시인’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나 항의도 없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다.
한편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를 저항시인이라는 규정의 범주에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인에 대한 재평가가 확장된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유성호의 윤동주 100주년, 문학과 역사’(문화일보 4월 18일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윤동주는 좁은 의미의 저항 텍스트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예술적 차원에서 극적 생애와 죽음을 결속하면서, 항구적인 ‘보편적 인류애’의 매혹적 텍스트로 기억되어갈 것이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인협회 주최로 일본 도쿄 지요다 구 한국 YMCA 호텔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시인과 일본의 윤동주를 기리는 시민 등이 참석해 그의 시 세계를 기렸다. 우에무라 다카시 가톨릭대 교수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것이 1984년이었다”며 “윤동주가 옥사한 교도소가 있는 후쿠오카(福岡)에선 시민들이 1994년부터 그의 시를 읽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윤동주 관련 행사의 내실화 필요성도 있다. 윤동주는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났기에 사실상 한국에는 그의 연고가 없다. 그가 다닌 연희전문(연세대)과 유고시집이 발견된 광양의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이 있을 뿐이다. 문학적 가치로 봤을 때 광양의 망덕포구는 윤동주의 시정신과 생애를 방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곳을 매개로 윤동주 문학공원, 윤동주 문학벨트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윤동주의 시정신은 남도의 예술혼과 아울러 불의에 항거했던 의로운 정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오늘의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윤동주의 시 속에 녹아있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 “명동(明東)이 민족애라는 용광로 속에서 겨레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녹여서 찍어낸 최고의 작품이 윤동주였다면 윤동주가 민족애라는 용광로 속에 겨레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녹여서 찍어낸 작품은 ‘시’였다. 밤하늘을 스치는 바람을 웃어 주며 반짝이는 별,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사랑의 노래’였다.”(문익환 시인의 ‘윤동주 추모기’, ‘사진으로 읽는 하늘과 바람과 별’) <끝>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