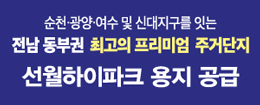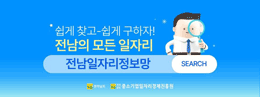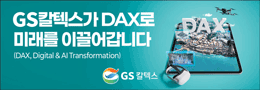그날의 부끄러운 기억들
 |
“정녕 광주는 버림받은 땅인가” 이것은 37년 전 내가 쓴 ‘거북장 살롱’ 화재 사건 기사의 리드(lead)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검열에서 잘렸기 때문이다. 거북장에 불이 난 것은 5·18 살육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0년 6월6일 새벽이었다. 이 화재로 당시 스물세 명이나 숨졌으니 난 그때 그 숱한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간(行間)에 ‘5·18’을 넣고 싶었다. 하지만 검열 당국은 내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여지없이 가위질을 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계엄하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줌의 진실이라도 더 내보내려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실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 보려 했던 시절. 그들이 사전 검열을 통해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의 ‘출범’이라는 단어마저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출범’을 삭제하라니-. 어리둥절해 있는 우리에게 검열 담당관은 새 시대가 열리는 이 기쁜 날에 호랑이(범)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당시 검열을 맡았던 보안사 부사관의 무식(無識)이 빚은 해프닝이었다.
‘무등산은 알고 있다’ 이는 항쟁 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신문 발행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 젊은 기자들의 검열 거부와 신문 제작거부 속에서도 속간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 6월2일 자 광주일보(당시 이름은 전남일보)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이다. 이 제목도 원래는 ‘무등산은 알고 있다 위대한 광주 시민정신’이었으나 뒷부분이 삭제됐다. 그들의 눈에는 ‘시민정신’이란 단어가 못마땅해 잘라 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함축적인 제목으로 오히려 잘된 셈이었다. 사실 그날의 참상이야 우리 모두 보았으니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는 한마디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도 ‘무등산은 알고 있다’
오늘, 오랜만에 어느 후배의 빛바랜 시집을 꺼내 읽는다.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하며 많은 책을 버렸는데도 30년 전에 나온 이 시집은 다행히 책장에 남아 있었다. 임동확의 ‘매장시편’이다. 나중에 그가 국문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만 해도 안면이 없었던 이 젊은 시인의 시에 크게 매료된 나는, 그의 시집을 몇 권 구입해서 주위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기억이 난다.
다시 읽어 봐도 그의 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기 힘든 고백과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처절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나는 그의 시에서 거울 속에 늘 자신을 비춰 봤던 윤동주를 보았다. 아울러 명색이 기자랍시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으되 계엄군에 쫓겨 마냥 도망 다니기에 바빴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보았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당돌하게 대들던 어느 여고생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그땐 겨우 2년차에 접어든 ‘병아리 기자’였지만, 대학생들의 전유물이던 시위에 여고생이 등장한 것은 큰 뉴스거리일 것이라는 것쯤은 알았었다. 당연히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어린 소녀의 앙칼진 반문(反問)이었다. “암껏도 쓰지 못할람서 이름은 알아서 뭣 할라고 물어 보요?” 난 그때 할 말을 잃었다. 부끄러웠다.
‘타타타탕’ 총탄이 쏟아지던 그때의 공포도 잊을 수 없다. 금동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한 무리의 군중과 함께 대문이 열려 있던 기와집으로 뛰어들었다. 마루 밑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찼다. 선배 기자(나의갑)와 나는 장독대 뒤에 바짝 엎드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광주 MBC가 불타던 그날 새벽, 계엄군과 마주쳐야 했던 아찔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옛 동구청 뒤 홍안과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우리는 언제 계엄군이 수색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새벽녘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기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 쪽에서 계엄군 한 명이 우리를 발견했는지 쫓아오는 것이었다. 한창 젊었던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대학생이었기에 특히 계엄군의 타깃이 되었다. 멋모르고 뛰어가던 젊은이 한 명이 어둠 속에서 계엄군의 곤봉 한방에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던 모습을 목격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걸리면 죽는다’ 죽자 사자 뛰는데 마침 그 골목 어귀에 있던 단골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다급하게 뛰어들어 식당 안쪽 깊숙한 골방에 숨었다. 그러나 이미 들킨 것이 분명했다. 계엄군이 주인아주머니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골방에까지 들려왔다. 하는 수 없었던지 아주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밖으로 좀 나와야겄구만이라우.” 우리는 계엄군에게 곤봉으로 몇 대 맞은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풀려났으니, 천행(天幸)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수첩을 내놓고 취재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계엄군이나 시위대 양쪽 모두 기자를 적대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몇 안 되었던 우리 기자들과는 달리 외신기자들은 때로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기까지 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다. 아마도 영화 ‘택시운전사’ 때문일 것이다. 그 질문은 적어도 나에게는 ‘힌츠페터가 그 눈부신(?) 활약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으로 들린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그동안 나온 5·18 관련 영화를 보면서는 늘 눈시울을 적셔야 했었다.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유쾌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 때때로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을 소환하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단발머리’나 ‘제3한강교’를 따라 부를 만큼 무겁지 않아서 좋았다. 사실과 다른 약간의 과장과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 추격 액션 등, 거슬리는 장면이 아주 없진 않았어도 그 정도면 그런대로 괜찮았다.
어찌 됐든 새 정부 출범과 영화 ‘택시운전사’의 상영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이제 발포 명령자 색출 등 5·18 진상 규명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벌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505보안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날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광주를 다녀간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傳言)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에 따르면 얼마 전 기무사(당시 보안사)에 들러 확인한 결과 많은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돼 있는데 상태도 양호하다고 한다.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묻혀 있는 자료들이 비밀 해제돼 햇볕을 보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날. 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글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
그래도 ‘무등산은 알고 있다’
오늘, 오랜만에 어느 후배의 빛바랜 시집을 꺼내 읽는다.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하며 많은 책을 버렸는데도 30년 전에 나온 이 시집은 다행히 책장에 남아 있었다. 임동확의 ‘매장시편’이다. 나중에 그가 국문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만 해도 안면이 없었던 이 젊은 시인의 시에 크게 매료된 나는, 그의 시집을 몇 권 구입해서 주위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기억이 난다.
다시 읽어 봐도 그의 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기 힘든 고백과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처절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나는 그의 시에서 거울 속에 늘 자신을 비춰 봤던 윤동주를 보았다. 아울러 명색이 기자랍시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으되 계엄군에 쫓겨 마냥 도망 다니기에 바빴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보았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당돌하게 대들던 어느 여고생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그땐 겨우 2년차에 접어든 ‘병아리 기자’였지만, 대학생들의 전유물이던 시위에 여고생이 등장한 것은 큰 뉴스거리일 것이라는 것쯤은 알았었다. 당연히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어린 소녀의 앙칼진 반문(反問)이었다. “암껏도 쓰지 못할람서 이름은 알아서 뭣 할라고 물어 보요?” 난 그때 할 말을 잃었다. 부끄러웠다.
‘타타타탕’ 총탄이 쏟아지던 그때의 공포도 잊을 수 없다. 금동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한 무리의 군중과 함께 대문이 열려 있던 기와집으로 뛰어들었다. 마루 밑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찼다. 선배 기자(나의갑)와 나는 장독대 뒤에 바짝 엎드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광주 MBC가 불타던 그날 새벽, 계엄군과 마주쳐야 했던 아찔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옛 동구청 뒤 홍안과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우리는 언제 계엄군이 수색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새벽녘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기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 쪽에서 계엄군 한 명이 우리를 발견했는지 쫓아오는 것이었다. 한창 젊었던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대학생이었기에 특히 계엄군의 타깃이 되었다. 멋모르고 뛰어가던 젊은이 한 명이 어둠 속에서 계엄군의 곤봉 한방에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던 모습을 목격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걸리면 죽는다’ 죽자 사자 뛰는데 마침 그 골목 어귀에 있던 단골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다급하게 뛰어들어 식당 안쪽 깊숙한 골방에 숨었다. 그러나 이미 들킨 것이 분명했다. 계엄군이 주인아주머니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골방에까지 들려왔다. 하는 수 없었던지 아주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밖으로 좀 나와야겄구만이라우.” 우리는 계엄군에게 곤봉으로 몇 대 맞은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풀려났으니, 천행(天幸)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수첩을 내놓고 취재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계엄군이나 시위대 양쪽 모두 기자를 적대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몇 안 되었던 우리 기자들과는 달리 외신기자들은 때로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기까지 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다. 아마도 영화 ‘택시운전사’ 때문일 것이다. 그 질문은 적어도 나에게는 ‘힌츠페터가 그 눈부신(?) 활약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으로 들린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그동안 나온 5·18 관련 영화를 보면서는 늘 눈시울을 적셔야 했었다.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유쾌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 때때로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을 소환하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단발머리’나 ‘제3한강교’를 따라 부를 만큼 무겁지 않아서 좋았다. 사실과 다른 약간의 과장과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 추격 액션 등, 거슬리는 장면이 아주 없진 않았어도 그 정도면 그런대로 괜찮았다.
어찌 됐든 새 정부 출범과 영화 ‘택시운전사’의 상영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이제 발포 명령자 색출 등 5·18 진상 규명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벌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505보안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날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광주를 다녀간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傳言)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에 따르면 얼마 전 기무사(당시 보안사)에 들러 확인한 결과 많은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돼 있는데 상태도 양호하다고 한다.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묻혀 있는 자료들이 비밀 해제돼 햇볕을 보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날. 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글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