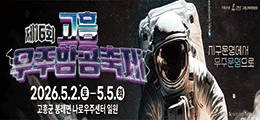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광주극장] 영화·쇼에서 권투 경기까지 … 그시절 뜨거웠던 ‘문화 해방구’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직접 그린 간판을 내건다. 극장 간판을 전담하는 화가 박태규씨가 작업한 소형 간판 작품들은 극장 곳곳에 전시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0년대 새로운 스타일의 미스테리 드라마. 끝내 후회없이 떠나는 가시 돋힌 여자의 일생을 그린, 김지미 신성일의 열띤 열연이 엿보이는 액션 거작 ‘그림자 없는 여자’ 를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구경하시고 돌아가시거든 이웃에 권장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발을 올려 좌석 번호가 지워지지 않도록하며 뺑기가 옷에 묻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요.”
광주극장의 오래된 자료들을 살피다 1970년 작성된 낡은 노트를 접했다. 그날 상영할 영화와 차기 작품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당시 극장에는 여성 장내 아나운서가 있었다. 아나운서는 마이크를 잡고, 맛깔스럽게 영화를 소개했다. 그녀가 낡은 스프링 노트에 볼펜으로 써내려간 글들은 흥미로웠다, 방송 시간을 기다리며 무료했을 그녀가 썼음직한 낙서와 그림들은 웃음을 자아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광주극장이 올해 80살이 됐다. 극장의 영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1935년 문예봉 주연의 ‘춘향전’을 틀었던 극장은 2015년 1월 19일 프랑스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을 상영중이다.
광주극장은 멀티플렉스 홍수 속에 살아남은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이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요즘 영화관에 비하면 광주극장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한겨울 추위는 영화 관람의 최대 적이다. 담요를 덮고 관람하는 풍경은 추위를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극장을 사랑하는 이들은 광주극장만의 의식이라고도 한다. 3층 규모의 광주극장을 찬찬히 둘러보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세월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로 대체된 낡은 영사기, 극장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진자료와 포스터들까지.
광주극장은 광주읍이 광주부(府)로 승격하던 1935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객석 수는 1250석. 당시 광주 인구가 5만2000여명 수준이었으니 엄청난 규모였다. 창업주는 이후 동성고 등 유은학원을 설립한 유은 최선진 선생이다.
광주극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꾸준히 상영했다. ‘한국영화사상 초유의 키쓰 영화’로 소개된 1953년작 ‘최후의 유혹’, 주제가 ‘홍도야 우지마라’가 히트쳤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하루 입장객 2900명을 동원해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57)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극장은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연극, 악극, 국극, 리사이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김구 선생의 시국 강연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광주 문화·사회사(史)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광주극장에서는 명창 김소희라 데뷔(1935) 무대를 가졌고, 남조선 축구대회 우승 기념식(1937)도 열렸다, 1945년에는 해방 기념축하 대공연과 오방 최흥종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식도 개최됐다. 같은 해 조아라 여사가 주인공을 맡은 ‘안중근 열사’도 공연됐다.
1948년에는 권투 경기도 열렸다. 일본 미들급 챔피언 문춘성의 시범 경기였다. 전남일보(현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전국학생연극제도 1956년 첫 선을 보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여성국극의 전성기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성국극단 ‘임춘앵과 그 일행’ 김진진이 출연하는 ‘여성국극단 진경’의 공연이 이어졌다. 1970년대는 ‘쇼’의 시대였다. ‘격노! 주먹! 폭소! 통쾌액숀스타쇼’, 새해맞이 미 8군 쇼, 송창식과 하춘화 쇼가 관객들을 흥분시켰다.
넓은 무대 공간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극장측은 매년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음악으로 通하다’ 행사를 통해 프랑스 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중이다.
현재 광주극장(864석)은 1968년 10월 4일 재개관했다. 그해 1월18일 새벽 극장에 침입한 절도범이 전기모터를 훔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아쉽게도 이 때 1968년까지의 자료도 함께 불타버렸다.
광주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게 좋다. 건물 구석 구석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다.극장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층 객석에서 눈여겨 볼 곳은 맨 뒤에 자리한 ‘임검석’. 일제 시대 영화 검열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이들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간판을 그리는 곳이 광주극장이다. 극장 곳곳에는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가 박태규씨의 작은 간판 작품이 놓여 있다. ‘여로’, ‘빙점’, ‘와영자의 전성시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익숙한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극장 건물 외벽에는 박씨가 관객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 ‘어머니’ 대형 간판이 걸려 있다.
3층에 걸린 사진들은 광주극장 8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다. 1956년 광주극장이 제작한 ‘산유화’ 상영 당시 광주극장을 찾은 배우 복혜숙의 사진, 간판쟁이라 불리던 시절의 추억이 서린 1955년 극장 미술실 풍경, 극장에서 제일 군기가 셌던 기도실 풍경, 1937년 여름 남조선 축구대회 우승 기념촬영 모습 등을 흑백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신문에 실린 영화 광고를 걸어둔 공간도 흥미롭다. ‘특별 봉사요금 65원 균일-다섯개의 단검’(1971), ‘어머니 주름살에 자란 아들아! 자식이면 이 한편을 생전에 어머니앞에 선물로 드리자’(모정에 우는 두 아들·1972), ‘스크린의 연인, 문희 은퇴 기념 작품’(지금은 남이지만·1971) 등 재미있는 문구와 김지미·장동휘 등 유명 배우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광주극장은 식민지 시대 전국에서 문을 연 극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관극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는 단성사(1907년 개관)도 문을 닫고 인천 애관극장(1923년 개관), 대구 만경관(1922년 개관)도 모두 멀티플렉스로 변신했어요. 지금까지 단관 형태를 유지하며 한번도 문을 닫거나 영화 상영을 중지한 적이 없이,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 대단하죠.”
‘광주의 극장 문화사’를 쓴 위경혜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관객들을 만나는 지금 광주극장의 모습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충장로 4가와 5가와 문화의 거리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80년이 넘은 지금도 광주극장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흐른다. 소소한 감동을 함께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이들이 언제나 함께여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광주극장이 올해 80살이 됐다. 극장의 영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1935년 문예봉 주연의 ‘춘향전’을 틀었던 극장은 2015년 1월 19일 프랑스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을 상영중이다.
광주극장은 광주읍이 광주부(府)로 승격하던 1935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객석 수는 1250석. 당시 광주 인구가 5만2000여명 수준이었으니 엄청난 규모였다. 창업주는 이후 동성고 등 유은학원을 설립한 유은 최선진 선생이다.
광주극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꾸준히 상영했다. ‘한국영화사상 초유의 키쓰 영화’로 소개된 1953년작 ‘최후의 유혹’, 주제가 ‘홍도야 우지마라’가 히트쳤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하루 입장객 2900명을 동원해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57)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극장은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연극, 악극, 국극, 리사이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김구 선생의 시국 강연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광주 문화·사회사(史)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광주극장에서는 명창 김소희라 데뷔(1935) 무대를 가졌고, 남조선 축구대회 우승 기념식(1937)도 열렸다, 1945년에는 해방 기념축하 대공연과 오방 최흥종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식도 개최됐다. 같은 해 조아라 여사가 주인공을 맡은 ‘안중근 열사’도 공연됐다.
1948년에는 권투 경기도 열렸다. 일본 미들급 챔피언 문춘성의 시범 경기였다. 전남일보(현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전국학생연극제도 1956년 첫 선을 보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여성국극의 전성기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성국극단 ‘임춘앵과 그 일행’ 김진진이 출연하는 ‘여성국극단 진경’의 공연이 이어졌다. 1970년대는 ‘쇼’의 시대였다. ‘격노! 주먹! 폭소! 통쾌액숀스타쇼’, 새해맞이 미 8군 쇼, 송창식과 하춘화 쇼가 관객들을 흥분시켰다.
넓은 무대 공간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극장측은 매년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음악으로 通하다’ 행사를 통해 프랑스 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중이다.
현재 광주극장(864석)은 1968년 10월 4일 재개관했다. 그해 1월18일 새벽 극장에 침입한 절도범이 전기모터를 훔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아쉽게도 이 때 1968년까지의 자료도 함께 불타버렸다.
광주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게 좋다. 건물 구석 구석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다.극장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층 객석에서 눈여겨 볼 곳은 맨 뒤에 자리한 ‘임검석’. 일제 시대 영화 검열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이들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간판을 그리는 곳이 광주극장이다. 극장 곳곳에는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가 박태규씨의 작은 간판 작품이 놓여 있다. ‘여로’, ‘빙점’, ‘와영자의 전성시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익숙한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극장 건물 외벽에는 박씨가 관객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 ‘어머니’ 대형 간판이 걸려 있다.
3층에 걸린 사진들은 광주극장 8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다. 1956년 광주극장이 제작한 ‘산유화’ 상영 당시 광주극장을 찾은 배우 복혜숙의 사진, 간판쟁이라 불리던 시절의 추억이 서린 1955년 극장 미술실 풍경, 극장에서 제일 군기가 셌던 기도실 풍경, 1937년 여름 남조선 축구대회 우승 기념촬영 모습 등을 흑백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신문에 실린 영화 광고를 걸어둔 공간도 흥미롭다. ‘특별 봉사요금 65원 균일-다섯개의 단검’(1971), ‘어머니 주름살에 자란 아들아! 자식이면 이 한편을 생전에 어머니앞에 선물로 드리자’(모정에 우는 두 아들·1972), ‘스크린의 연인, 문희 은퇴 기념 작품’(지금은 남이지만·1971) 등 재미있는 문구와 김지미·장동휘 등 유명 배우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광주극장은 식민지 시대 전국에서 문을 연 극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관극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는 단성사(1907년 개관)도 문을 닫고 인천 애관극장(1923년 개관), 대구 만경관(1922년 개관)도 모두 멀티플렉스로 변신했어요. 지금까지 단관 형태를 유지하며 한번도 문을 닫거나 영화 상영을 중지한 적이 없이,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 대단하죠.”
‘광주의 극장 문화사’를 쓴 위경혜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관객들을 만나는 지금 광주극장의 모습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충장로 4가와 5가와 문화의 거리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80년이 넘은 지금도 광주극장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흐른다. 소소한 감동을 함께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이들이 언제나 함께여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