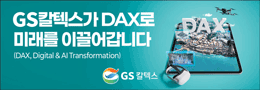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이홍재의 세상만사] 소리 없이 성공한 완도 해조류 박람회
‘바다의 채소’ ‘바다의 보물’
밥도둑은 간장게장만이 아니었다. 김 한 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었다. 그야말로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연탄불에 구울 때는 그 구수한 냄새가 입안에 침을 돌게 하고. 장에 찍어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공기가 사라지곤 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다소 ‘있는 집안’의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
김은 바닷속(海) 바위에 이끼(苔)처럼 붙어 자라기 때문에 해태(海苔)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해우’란 말을 더 많이 썼다. 물론 표준어는 해의(海衣)다. 옛 사람들은 바위에 붙은 김을 보고 얇은 옷(衣)을 연상했나 보다. 세종실록엔 해의(海衣)가 중국으로 보낼 물품 중 하나로 나와 있다.
김은 왜 김이라 했을까. 이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김여익이란 사람이 있었다. 처음으로 김 양식법을 찾아내 보급한 사람이다.
그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이후 태인도에 숨어 살았다. 그러던 중 바닷물에 밀려온 김이 바위에 붙어 사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친다. 소나무 가지 등을 이용한 김 양식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이후 김은 왕실에 바치는 인기 높은 특산물이 됐다. 하루는 임금이 김을 맛있게 드신 후 이름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한 신하가 “광양 땅에 사는 김 아무개가 만든 음식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럼 앞으로 이 바다풀을 그 사람 성을 따서 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라고 했단다.
그럼 우리는 김을 언제부터 먹게 됐을까. 기록으로만 따지면 신라시대부터다. 그 당시 동해 바닷가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해초를 따러 나갔다가 신발을 벗고 바위섬에 올라섰다. 한데 갑자기 바위섬이 움직이더니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일본에 간 그는 왕이 되었다.
이후 아내도 남편을 찾아 바닷가에 나갔다가 바위섬에 오른다. 이번에도 바위섬이 움직이고 그녀는 남편을 만나 귀비(貴妃)가 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 이야기다.
이야기 중에 “하루는 연오가 해초를 따고 있었다”(一日延烏歸海採藻)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해초(藻)가 바로 김이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게 미역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산모가 미역을 먹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사람들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고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 당나라 때 편찬된 ‘초학기’(初學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갓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삼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 고래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는 미역이 산후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이를 당시 구전돼 오던 이야기라면서 기록에 남겼다.
김과 미역, 톳과 다시마, 파래와 톳, 우뭇가사리와 매생이 등등. 이를 통틀어 해조류(海藻類)라 한다. 여기에서의 ‘조’(藻)는 ‘물 속의 풀’을 뜻하는 한자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로 여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다의 보물’이다.
우리는 해조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미노산·불포화지방산·식이섬유·요오드 등이 풍부하다. 그래서 변비와 빈혈 그리고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좋다. 이런 것쯤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해조류 소비왕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長壽) 국가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서양의학계는 해조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몰랐던 것은 따로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500여 종의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여 종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몸에 해롭지 않은 엠에스지(msg) 가 해조류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밖에 바다 식물이 지구 산소의 70%를 만들어 낸다는 것. 게다가 해조류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언젠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러니 다시마나 우뭇가사리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주유소에서 해조류 연료가 판매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이라.
더욱 놀라운 것은 우뭇가사리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제 앞으론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황홀한 발명이고 환상적인 발명품인가.” 소설가 조정래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칼럼을 좀 더 읽어보자. “어서 해초 종이가 대량 생산되어 원고지를 수만 장 쌓아 놓고 싶다. 거기서 바다 내음이 그윽하고 아슴하게 풍겨올 것이다.”
완도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온, 상온에 두어도 일정 시간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봉지에 담긴 액체를 물에 짜내면, 그대로 국수 가락으로 변하는 신기한 해조류 국수.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흥행 요소도 충분했다.
세계 유일,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개막 5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그리하여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라는 말을 쉽사리 입에 꺼낼 수 없었음에도. 한 달 동안 53만 명이 다녀갔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성공’이었다. 우리도 몰랐던 완도 해조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김종식 완도군수는 “박람회가 완도의 역사를 바꿨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완도의 새로운 길 위에서 늘 행복했다”며 감회에 젖었다.
그런 김 군수가 오늘 퇴임식을 ‘북 콘서트’로 대체한다고 한다. 3선 12년의 열정과 애환을 담은 회고록 ‘창조의 길을 열다’라는 책을 들고서.
(이 글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미뤄 놓았던, 뒤늦게 김종식 군수에게 바치는 헌사(獻辭)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은 왜 김이라 했을까. 이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김여익이란 사람이 있었다. 처음으로 김 양식법을 찾아내 보급한 사람이다.
그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이후 태인도에 숨어 살았다. 그러던 중 바닷물에 밀려온 김이 바위에 붙어 사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친다. 소나무 가지 등을 이용한 김 양식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럼 우리는 김을 언제부터 먹게 됐을까. 기록으로만 따지면 신라시대부터다. 그 당시 동해 바닷가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해초를 따러 나갔다가 신발을 벗고 바위섬에 올라섰다. 한데 갑자기 바위섬이 움직이더니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일본에 간 그는 왕이 되었다.
이후 아내도 남편을 찾아 바닷가에 나갔다가 바위섬에 오른다. 이번에도 바위섬이 움직이고 그녀는 남편을 만나 귀비(貴妃)가 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 이야기다.
이야기 중에 “하루는 연오가 해초를 따고 있었다”(一日延烏歸海採藻)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해초(藻)가 바로 김이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게 미역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산모가 미역을 먹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사람들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고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 당나라 때 편찬된 ‘초학기’(初學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갓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삼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 고래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는 미역이 산후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이를 당시 구전돼 오던 이야기라면서 기록에 남겼다.
김과 미역, 톳과 다시마, 파래와 톳, 우뭇가사리와 매생이 등등. 이를 통틀어 해조류(海藻類)라 한다. 여기에서의 ‘조’(藻)는 ‘물 속의 풀’을 뜻하는 한자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로 여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다의 보물’이다.
우리는 해조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미노산·불포화지방산·식이섬유·요오드 등이 풍부하다. 그래서 변비와 빈혈 그리고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좋다. 이런 것쯤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해조류 소비왕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長壽) 국가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서양의학계는 해조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몰랐던 것은 따로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500여 종의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여 종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몸에 해롭지 않은 엠에스지(msg) 가 해조류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밖에 바다 식물이 지구 산소의 70%를 만들어 낸다는 것. 게다가 해조류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언젠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러니 다시마나 우뭇가사리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주유소에서 해조류 연료가 판매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이라.
더욱 놀라운 것은 우뭇가사리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제 앞으론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황홀한 발명이고 환상적인 발명품인가.” 소설가 조정래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칼럼을 좀 더 읽어보자. “어서 해초 종이가 대량 생산되어 원고지를 수만 장 쌓아 놓고 싶다. 거기서 바다 내음이 그윽하고 아슴하게 풍겨올 것이다.”
완도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온, 상온에 두어도 일정 시간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봉지에 담긴 액체를 물에 짜내면, 그대로 국수 가락으로 변하는 신기한 해조류 국수.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흥행 요소도 충분했다.
세계 유일,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개막 5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그리하여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라는 말을 쉽사리 입에 꺼낼 수 없었음에도. 한 달 동안 53만 명이 다녀갔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성공’이었다. 우리도 몰랐던 완도 해조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김종식 완도군수는 “박람회가 완도의 역사를 바꿨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완도의 새로운 길 위에서 늘 행복했다”며 감회에 젖었다.
그런 김 군수가 오늘 퇴임식을 ‘북 콘서트’로 대체한다고 한다. 3선 12년의 열정과 애환을 담은 회고록 ‘창조의 길을 열다’라는 책을 들고서.
(이 글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미뤄 놓았던, 뒤늦게 김종식 군수에게 바치는 헌사(獻辭)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