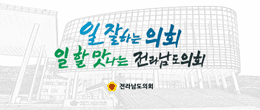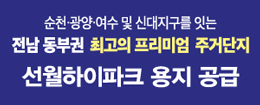고급 어종 대량 양식 … 황금어장 만드는 ‘골든 씨드’
〈6부〉 수산업, 지금이 기회다 ⑧ 수산종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짱뚱어 등 종묘 생산 잇따라 성공
강진군, 유휴 갯벌 100ha 개불 이식 100억원 소득 기대
고흥지소, 무지개송어 양식 … 휴어기 바다 이모작 길 열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짱뚱어 등 종묘 생산 잇따라 성공
강진군, 유휴 갯벌 100ha 개불 이식 100억원 소득 기대
고흥지소, 무지개송어 양식 … 휴어기 바다 이모작 길 열어
“실제로 보니 벌레 같이 기괴하게 생긴 것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SF 만화에 나올 만한 형상이었다.” 음식만화 대표작인 ‘미스터 초밥왕’을 그린 일본 만화가 데라사와 다이스케(寺澤大介)씨는 한국방문때 의충(蟻蟲)동물인 개불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모양새가 개불알처럼 생겼다 해 개불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한다. 개불은 독특한 생김새와 달리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바다에서 나는 겨울철 강장 해산물, 국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미노산중 글리신·알라닌·글루탐산을 많이 함유해 씹을 때 달콤한 맛이 난다.
◇강장식품 개불, 인공양식 성공=매년 1∼2월,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복섬 인근 마을어장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주민 수 백명이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속에서 호미와 채얼개미를 이용해 맨손으로 개불잡이를 하는 것.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불을 잡을 수 있는 날은 연중 2∼3일에 불과하다. 사초리 개불은 타 지역산보다 맛이 뛰어나 가격도 20∼30% 높게 거래된다.
지난 2010년 2월, 사초리 주민들의 개불잡이 현장을 찾았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지소장 김도기) 김용만(42) 연구담당은 문득 ‘왜 다른 지역에는 개불이 안 살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긴 김 연구담당은 사초리 어촌계앞 은둔여에 시험어장을 조성해 자연산 어미 개불을 이식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2011년 10월 개불을 자연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인공번식을 통해 생산한 개불 종묘를 갯벌에 이식해 양식화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연맹’(UPOV) 품종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에서 수산 종자(종묘)를 ‘골든 씨드’(golden seed)화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물 양식과 인공 종묘 생산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수산종묘는 벼 농사로 치면 ‘볍씨’이다.
26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짱뚱어 인공종묘 생산 성공(2011년 6월) ▲새조개 인공종묘 생산 성공(2011년 7월) ▲바지락 인공종묘 기술 개발(2011년 8월) ▲가리맛조개 인공종묘 성공(2011년 10월) ▲토종어류 ‘박대’ 인공종묘 성공(2011년 11월) ▲인공종묘 1세대 꼬막 종묘생산 성공(2012년 3월) ▲개불 인공번식 성공(2012년 5월) ▲톳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2012년 8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개불자원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진군수협 개불 계통출하량을 보면 지난 2008년 1만2744㎏였던 것이 2009년 8452㎏, 2010년 7317㎏, 2011년 6718㎏으로 3년만에 개불자원이 50%정도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패류자원의 감소는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개불 자연번식과 인공번식 성공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새로운 개불 양식어장을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개불과 바지락을 한곳에서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진군은 개불어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신전면 사초리와 대구면 백사어촌계 등 2개소, 올해 2개소 등 총 4개 어촌계에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개불 이식사업을 추진했다.
개불 자연번식으로 4∼5년후 1ha기준 8000만∼1억원 가량의 어가 소득이 예상된다. 군은 강진만 유휴 갯벌 100ha에 개불을 이식하면 1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바지락양식보다 10배이상 높은 고소득이다. 개불이 치충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려면 최소 4∼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앞으로 수산종묘 전쟁 치열=꼬막어업권의 98%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꼬막 생산량은 1990년대만 해도 2만t에 달했으나, 현재는 4000t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전남지역 꼬막생산을 위해서는 1500t의 종패를 뿌려야하지만 300t정도만 뿌려질 정도로 자연산 종패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꼬막 인공종묘 생산기술 정립은 꼬막을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인공종묘는 자연산(7∼8월) 보다 일찍 산란(4∼5월)하기 때문에 양성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여를 앞당길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는 자연산 어획에만 의존하는 능성어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앞으로 초기 생존률 향상과 기형률 저하 등 완전한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능성어 산업화와 수출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고흥지소는 민물 냉수성 어종인 무지개송어를 바다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휴어기(休漁期)인 겨울철에 ‘바다 이모작’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염도를 점차 높여가며 바닷물에 길들이는 순치(順治)기술이 핵심이다.
강진지소 김용만 연구담당은 “누가, 어떤 우수 종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산종묘 전쟁이라 봐도 된다”면서 “2030년이면 인구가 100억명에 달하는 등 육지의 식량생산은 한계가 있다. 수산양식이 미래 식량산업을 책임지는 현실이 올 것이다. 기본적인 종묘 어미를 관리하면서 품종개량 등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강진=남철희기자 choul@
모양새가 개불알처럼 생겼다 해 개불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한다. 개불은 독특한 생김새와 달리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바다에서 나는 겨울철 강장 해산물, 국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미노산중 글리신·알라닌·글루탐산을 많이 함유해 씹을 때 달콤한 맛이 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긴 김 연구담당은 사초리 어촌계앞 은둔여에 시험어장을 조성해 자연산 어미 개불을 이식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2011년 10월 개불을 자연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인공번식을 통해 생산한 개불 종묘를 갯벌에 이식해 양식화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연맹’(UPOV) 품종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에서 수산 종자(종묘)를 ‘골든 씨드’(golden seed)화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물 양식과 인공 종묘 생산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수산종묘는 벼 농사로 치면 ‘볍씨’이다.
26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짱뚱어 인공종묘 생산 성공(2011년 6월) ▲새조개 인공종묘 생산 성공(2011년 7월) ▲바지락 인공종묘 기술 개발(2011년 8월) ▲가리맛조개 인공종묘 성공(2011년 10월) ▲토종어류 ‘박대’ 인공종묘 성공(2011년 11월) ▲인공종묘 1세대 꼬막 종묘생산 성공(2012년 3월) ▲개불 인공번식 성공(2012년 5월) ▲톳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2012년 8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개불자원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진군수협 개불 계통출하량을 보면 지난 2008년 1만2744㎏였던 것이 2009년 8452㎏, 2010년 7317㎏, 2011년 6718㎏으로 3년만에 개불자원이 50%정도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패류자원의 감소는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개불 자연번식과 인공번식 성공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새로운 개불 양식어장을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개불과 바지락을 한곳에서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진군은 개불어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신전면 사초리와 대구면 백사어촌계 등 2개소, 올해 2개소 등 총 4개 어촌계에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개불 이식사업을 추진했다.
개불 자연번식으로 4∼5년후 1ha기준 8000만∼1억원 가량의 어가 소득이 예상된다. 군은 강진만 유휴 갯벌 100ha에 개불을 이식하면 1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바지락양식보다 10배이상 높은 고소득이다. 개불이 치충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려면 최소 4∼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앞으로 수산종묘 전쟁 치열=꼬막어업권의 98%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꼬막 생산량은 1990년대만 해도 2만t에 달했으나, 현재는 4000t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전남지역 꼬막생산을 위해서는 1500t의 종패를 뿌려야하지만 300t정도만 뿌려질 정도로 자연산 종패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꼬막 인공종묘 생산기술 정립은 꼬막을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인공종묘는 자연산(7∼8월) 보다 일찍 산란(4∼5월)하기 때문에 양성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여를 앞당길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는 자연산 어획에만 의존하는 능성어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앞으로 초기 생존률 향상과 기형률 저하 등 완전한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능성어 산업화와 수출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고흥지소는 민물 냉수성 어종인 무지개송어를 바다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휴어기(休漁期)인 겨울철에 ‘바다 이모작’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염도를 점차 높여가며 바닷물에 길들이는 순치(順治)기술이 핵심이다.
강진지소 김용만 연구담당은 “누가, 어떤 우수 종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산종묘 전쟁이라 봐도 된다”면서 “2030년이면 인구가 100억명에 달하는 등 육지의 식량생산은 한계가 있다. 수산양식이 미래 식량산업을 책임지는 현실이 올 것이다. 기본적인 종묘 어미를 관리하면서 품종개량 등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강진=남철희기자 ch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