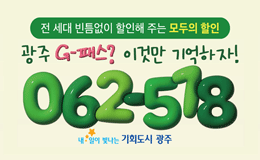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수필의 향기] 어느 날 버스에서- 김향남 수필가
 |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어느새 봄빛이 완연했다. 옅으락 짙으락, 이 꽃 저 꽃 보기 좋게 어우러지는 중이었다. 하지만 휙휙 지나가는 풍경은 그리 감동적이지는 못했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마감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퇴고를 못 해서였다. 다행히 책상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가는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괜찮을 것도 같았다. 광주에서 서울, 거리가 멀긴 하지만 식장이 바로 터미널 옆이라니 그것도 다행이었다.
버스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옆자리의 남자는 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다. 통로 옆 가운데 자리라 창밖으로 시선을 두기도 그렇고 책을 보기도 지루한지, 몇 장을 휘리릭 넘기기도 하고 가만히 멈춰 있기도 하였다.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다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몇 시간을 동행해야 하는 건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다. 나란히 앉아서라면 더더욱….
휴게소였다. 화장실에도 가고 뜨거운 커피도 마셨다. 다시 차에 올라 무심히 앉아 있는데 옆자리의 남자가 생글거리며 들어왔다. 머리칼이 반나마 희끗했다. 그가 들고 있는 봉다리 안에 두 종류의 음료가 각각 두 개씩 들어 있는 게 보였다. 그중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방금 마신 뜨거운 커피가 채 내려가기도 전인데 내키지도 않았다.
“그럼 이거라도.”
이번엔 옥수수차를 내밀었다.
막무가내의 친절이었다. 나는 다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드시지요.”
이런 무례가 있나. 남자는 허락도 없이 내 무릎 위에 음료수를 올려놓고 뜬금없이 물었다.
“베르디 아시지요? 이탈리아 음악가.”
“…….”
내가 엉거주춤하는 사이 남자는 벌써 다음 말로 건너가고 있었다.
“베르디는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리골레토, 춘희 등 대단한 명곡들을 남겼지요. 그런데 그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냐면, 베르디가 살았던 당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때 80세의 노인이었던 그 양반이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미 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오페라를 작곡했느냐고요. 베르디가 대답했죠.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완벽을 추구해 왔다. 완벽에 도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를 느꼈다, 라고요.”
남자는 자신이 곧 베르디라도 된 듯했다. 베르디의 도전에 축하라도 보내는 듯 손바닥으로 연신 자신의 무릎을 쳤다. 그리고는 또 건너뛰고 있었다.
“아, 근데 혹시 작가분 아니십니까? 아까부터 뭐를 계속 쓰고 계시던데. 혹시 발표한 작품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주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건 또 뭔가, 남자는 넘겨짚는 재주도 뛰어난 모양이었다. 내가 줄곧 끄적이고 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짝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서 예의 그 음료를 좌석에 부착된 그물주머니로 내려놨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내 반응에 남자 역시 별다른 말은 없었다.
나는 옆자리의 남자가 심히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음료든 대화든 뭔가를 기꺼이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가는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매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인 불청객? 아니 웬 치한? 생각은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더욱 끔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투로 보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는가.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숫제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긴 하겠지만, 남자는 멈출 줄을 몰랐다. 계속하여 그는 알고 있는 작가들을 늘어놓았고,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의 외로움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문득 동의를 구해 왔다. 말은 저 혼자 떠돌다 저 혼자 스러졌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을 빠져나오듯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휴게소였다. 화장실에도 가고 뜨거운 커피도 마셨다. 다시 차에 올라 무심히 앉아 있는데 옆자리의 남자가 생글거리며 들어왔다. 머리칼이 반나마 희끗했다. 그가 들고 있는 봉다리 안에 두 종류의 음료가 각각 두 개씩 들어 있는 게 보였다. 그중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아, 아닙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방금 마신 뜨거운 커피가 채 내려가기도 전인데 내키지도 않았다.
“그럼 이거라도.”
이번엔 옥수수차를 내밀었다.
막무가내의 친절이었다. 나는 다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드시지요.”
이런 무례가 있나. 남자는 허락도 없이 내 무릎 위에 음료수를 올려놓고 뜬금없이 물었다.
“베르디 아시지요? 이탈리아 음악가.”
“…….”
내가 엉거주춤하는 사이 남자는 벌써 다음 말로 건너가고 있었다.
“베르디는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리골레토, 춘희 등 대단한 명곡들을 남겼지요. 그런데 그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냐면, 베르디가 살았던 당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때 80세의 노인이었던 그 양반이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미 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오페라를 작곡했느냐고요. 베르디가 대답했죠.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완벽을 추구해 왔다. 완벽에 도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를 느꼈다, 라고요.”
남자는 자신이 곧 베르디라도 된 듯했다. 베르디의 도전에 축하라도 보내는 듯 손바닥으로 연신 자신의 무릎을 쳤다. 그리고는 또 건너뛰고 있었다.
“아, 근데 혹시 작가분 아니십니까? 아까부터 뭐를 계속 쓰고 계시던데. 혹시 발표한 작품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주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건 또 뭔가, 남자는 넘겨짚는 재주도 뛰어난 모양이었다. 내가 줄곧 끄적이고 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짝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서 예의 그 음료를 좌석에 부착된 그물주머니로 내려놨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내 반응에 남자 역시 별다른 말은 없었다.
나는 옆자리의 남자가 심히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음료든 대화든 뭔가를 기꺼이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가는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매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인 불청객? 아니 웬 치한? 생각은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더욱 끔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투로 보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는가.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숫제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긴 하겠지만, 남자는 멈출 줄을 몰랐다. 계속하여 그는 알고 있는 작가들을 늘어놓았고,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의 외로움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문득 동의를 구해 왔다. 말은 저 혼자 떠돌다 저 혼자 스러졌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을 빠져나오듯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