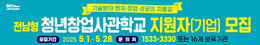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수필의 향기] 쥐눈이콩 인형-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
며칠째 감기를 앓고 있다. 독한 약도 녀석은 의연하게 견디며 껌딱지처럼 내 몸에 딱 붙어 있다. 며칠 새 핼쑥해졌다. 그나마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오래도록 아픈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었다.
그 아인 결석이 잦았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더 값지게 여기던 때였다. 하얀 피부에 유독 눈이 쥐눈이콩처럼 까만 애였다. 공부보다 손재주가 많았다. 자투리만 있어도 뚝딱 무엇을 만들었는데, 애 손에 잡힌 천 조각들은 알록달록 고양이도 되고 강아지도 되었다.
어느 하교 시간이었다. 그 애가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인형이었다. 애지중지 아끼던 진짜 인형이었다. 처음 받은 선물, 아니 그 애를 쏙 닮은 인형이었다.
수줍음 많은 난 누가 볼세라. 얼른 책보에 싸서 등에 매고,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향해 달렸다. 룰루랄라 너무 신나 신작로에 몇 차례 넘어졌지만 다행히 인형은 멀쩡했다. 그날 이후, 나도 무얼 보답하고 싶었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돼지 저금통을 뜯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쥐눈이콩 애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종일 옆 의자에는 초겨울 스산함만 먼지처럼 쌓였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 앤 결석을 했다. 난 준비한 선물만 만지작거렸다.
“이거 며칠 먹으면 힘이 쑥쑥 솟을 거야”
약국 아저씨가 그랬다. 난 내일은 그 애가 산다는 저 산 너머를 꼭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겨울 방학이었다.
마지막 출근 날이다. 직원들이 모두 환호성과 박수로 퇴사를 축하해 주었다. 난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표시를 하고 꽃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30여 년 직장 생활을 기념했다. 그때 최 과장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게 불쑥 인형을 내민다.
‘웬 인형?’
작고 깜찍한 꼬마 인형이었다. 순간 그 아이가 떠올랐다. 까만 쥐눈이콩 눈을 깜빡이며 인형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몇 차례 기회가 있었건만 난 그 애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퇴직하면 내일부터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고 하네요. 말동무 하세요”
난 그 인형을 옆구리에 껴안고 껄껄껄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애가 사는 마을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자기도 오래 전 들었단다.
“감기가 감기만이 아니란다. 오래되면 폐렴이 되고 심하면….”
병원은커녕 약국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하늘에서 그녀가 까만 쥐눈이콩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번뜩 그 인형이 궁금해졌다.
‘그 쥐눈이콩 인형은 어디로 갔을까?’
내 방에 오신 어머니는 저 인형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진다며 나무라셨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몸살감기가 왔다. 감기를 앓고서야 처음으로 그녀가 되어 보았다. 몸도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의 근육을 타고난 이가 있듯이 육체도 비슷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 애도 훗날 내가 혹여 외로울까봐 말동무 하라고 인형을 만들어 주었을지 모른다.
통장을 털어 어렵게 산 그 비타민은 끝내 그녀에게 가지 못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 영양제는 그녀에게 애타게 가고 싶었을 게다. 사랑은 보석처럼 영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비타민처럼 유효기간이 있을까. 무엇보다 난 지금 그 애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면 지금 내 사랑은 얼마라도 남아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아인 결석이 잦았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더 값지게 여기던 때였다. 하얀 피부에 유독 눈이 쥐눈이콩처럼 까만 애였다. 공부보다 손재주가 많았다. 자투리만 있어도 뚝딱 무엇을 만들었는데, 애 손에 잡힌 천 조각들은 알록달록 고양이도 되고 강아지도 되었다.
수줍음 많은 난 누가 볼세라. 얼른 책보에 싸서 등에 매고,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향해 달렸다. 룰루랄라 너무 신나 신작로에 몇 차례 넘어졌지만 다행히 인형은 멀쩡했다. 그날 이후, 나도 무얼 보답하고 싶었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돼지 저금통을 뜯기로 했다.
“이거 며칠 먹으면 힘이 쑥쑥 솟을 거야”
약국 아저씨가 그랬다. 난 내일은 그 애가 산다는 저 산 너머를 꼭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겨울 방학이었다.
마지막 출근 날이다. 직원들이 모두 환호성과 박수로 퇴사를 축하해 주었다. 난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표시를 하고 꽃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30여 년 직장 생활을 기념했다. 그때 최 과장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게 불쑥 인형을 내민다.
‘웬 인형?’
작고 깜찍한 꼬마 인형이었다. 순간 그 아이가 떠올랐다. 까만 쥐눈이콩 눈을 깜빡이며 인형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몇 차례 기회가 있었건만 난 그 애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퇴직하면 내일부터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고 하네요. 말동무 하세요”
난 그 인형을 옆구리에 껴안고 껄껄껄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애가 사는 마을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자기도 오래 전 들었단다.
“감기가 감기만이 아니란다. 오래되면 폐렴이 되고 심하면….”
병원은커녕 약국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하늘에서 그녀가 까만 쥐눈이콩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번뜩 그 인형이 궁금해졌다.
‘그 쥐눈이콩 인형은 어디로 갔을까?’
내 방에 오신 어머니는 저 인형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진다며 나무라셨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몸살감기가 왔다. 감기를 앓고서야 처음으로 그녀가 되어 보았다. 몸도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의 근육을 타고난 이가 있듯이 육체도 비슷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 애도 훗날 내가 혹여 외로울까봐 말동무 하라고 인형을 만들어 주었을지 모른다.
통장을 털어 어렵게 산 그 비타민은 끝내 그녀에게 가지 못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 영양제는 그녀에게 애타게 가고 싶었을 게다. 사랑은 보석처럼 영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비타민처럼 유효기간이 있을까. 무엇보다 난 지금 그 애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면 지금 내 사랑은 얼마라도 남아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