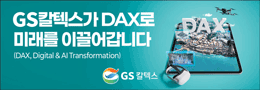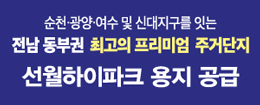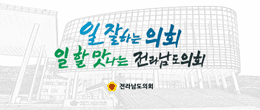펭수, 우리 마음의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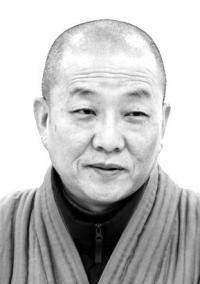 |
펭수가 외교부까지 접수했다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펭수를 접하였다. 그 뒤로 갑자기 펭수가 여기저기서 출몰하기 시작했다. MBC, SBS, JTBC 같은 곳에도 출연했다. 유명세가 대단한 정도를 넘어 어마어마하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펭수에게 열광하는지 궁금해서 펭수 관련 동영상들을 찾아보았다. 여러 동영상을 보던 중에 모 방송국 피디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왜 펭수를 좋아하는지 여기저기서 진지하게 분석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겁니다. 그뿐입니다”라며 그 피디는 몹시 펭수스러운 어투로 펭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글쎄, 과연 그냥 좋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 하나의 현상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록 반응이 뜨겁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상명하복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적인 질서 하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도 아니다. 봉건적 권위가 사회를 주도하지도 않지만,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감싸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보편화되지도 않았다. 각자의 주장과 요구는 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제각각의 목소리만 강하다. 제각각인 목소리는 기존의 권위를 해체시킬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일수록 탈권위를 향한 욕망은 강하기 마련이다.
펭수는 거침없고 당당하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권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펭수의 주장은 항상 단순명쾌하다. 과거 한때 해외 뉴스나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으로 미국의 문화를 접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이 참 별 거 아닌 걸로 소송을 걸고 또 말도 안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며 참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우리들이 미국을 따라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역시 일상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 펭수는 일상적인 갈등과 온갖 억지 주장 그리고 본질을 가리는 궤변에 환멸감을 느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 근본적으로 사회생활에 주눅이 든 우리들은 항상 타인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펭수의 모습에 환호하며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대리 분출한다.
왜 펭수는 선배, 사장 같은 일상적 권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Person’은 그리스어로 가면을 뜻하는 ‘persona’에서 비롯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가면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타인에게 연출한다. 가면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데 불과하지만 인형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숨길 수 있다. 펭수는 가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형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매사에 눈치 볼 일이 없다.
펭수의 성격적 특징은 한마디로 ‘어른이’이다. ‘어른이’는 가면을 쓰고 사회의 각종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펭수는 우리 안의 어른이들이 만들어 낸 캐릭터이다. ‘어른이’같은 펭수의 모습은 어린이나 장년층 보다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나 펭수의 솔직담백하고 단순명쾌한 주장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한다.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려면 대화의 원칙과 윤리, 규범과 기술이 필요하다. 궤변이나 억지 주장도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지만 펭수식으로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펭수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펭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일이다.
펭수의 또 다른 특징은 표정 없음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극히 사회적이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인간의 표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펭수는 무표정이다. 눈썹도 없기 때문에 무표정함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SNS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표정이 필요없다. 펭수의 표정 없음은 SNS와 인터넷에 둘러 쌓여 성장한 세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대들에게 무표정한 얼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래저래 펭수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기성세대는 뉴스를 통해서 펭수를 접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될지 아니면 뽀로로처럼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펭수 역시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얼굴, 아니 마음을 그린 자화상이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펭수에게 열광하는지 궁금해서 펭수 관련 동영상들을 찾아보았다. 여러 동영상을 보던 중에 모 방송국 피디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왜 펭수를 좋아하는지 여기저기서 진지하게 분석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겁니다. 그뿐입니다”라며 그 피디는 몹시 펭수스러운 어투로 펭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글쎄, 과연 그냥 좋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 하나의 현상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록 반응이 뜨겁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왜 펭수는 선배, 사장 같은 일상적 권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Person’은 그리스어로 가면을 뜻하는 ‘persona’에서 비롯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가면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타인에게 연출한다. 가면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데 불과하지만 인형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숨길 수 있다. 펭수는 가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형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매사에 눈치 볼 일이 없다.
펭수의 성격적 특징은 한마디로 ‘어른이’이다. ‘어른이’는 가면을 쓰고 사회의 각종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펭수는 우리 안의 어른이들이 만들어 낸 캐릭터이다. ‘어른이’같은 펭수의 모습은 어린이나 장년층 보다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나 펭수의 솔직담백하고 단순명쾌한 주장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한다.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려면 대화의 원칙과 윤리, 규범과 기술이 필요하다. 궤변이나 억지 주장도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지만 펭수식으로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펭수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펭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일이다.
펭수의 또 다른 특징은 표정 없음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극히 사회적이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인간의 표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펭수는 무표정이다. 눈썹도 없기 때문에 무표정함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SNS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표정이 필요없다. 펭수의 표정 없음은 SNS와 인터넷에 둘러 쌓여 성장한 세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대들에게 무표정한 얼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래저래 펭수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기성세대는 뉴스를 통해서 펭수를 접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될지 아니면 뽀로로처럼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펭수 역시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얼굴, 아니 마음을 그린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