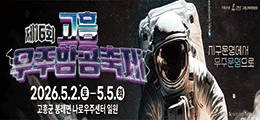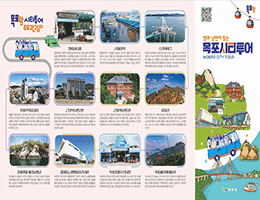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4> 폴리 투어- ① 장동 사거리 ‘소통의 오두막’
삭막한 교통섬 ‘도심 오아시스’ 되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폴리투어행사 ‘셸 위 폴리’ |
광주시 서구 주월동에 사는 주부 조미애(45)씨는 요즘 ‘시내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이기도 하지만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폴리(이하 폴리)들을 찬찬히 둘러 보기 위해서다. 새봄이 시작되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광주 곳곳에 들어선 30개의 폴리를 답사하기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조씨를 보고 주변에선 신기해 하는 눈치다.
그녀가 처음부터 폴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친구의 손에 이끌려 폴리투어에 참가하게 된 게 계기가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광주 금남로와 장동 일대의 폴리들을 얼핏 본 적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조각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축물도 아닌 게 낯설게 느껴졌다. 오히려 어떤 조형물들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눈에 거슬리기도 했다. 그러니 ‘거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폴리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과 공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난해 여름,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투어 콘서트 ‘셸위 폴리’(Shall we Folly)는 폴리의 숨겨진 매력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광주시 동구 장동 로터리의 ‘소통의 오두막’(후안 헤레로스작)’에서 펼쳐진 무대는 단순한 음악행사가 아니었다. 회색빛 도심의 교통섬을 매력적인 소공원으로 디자인한 ‘소통의 오두막’은 나무와 건축, 음악이 어우러져 색다른 감흥을 주었다. 마치 시골의 정자에 둘러 앉은 것 마냥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흐르는 동안 정담을 나누며 마음을 열었다. 말 그대로 도심의 오아시스였다.
이날 폴리 도슨트로 부터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건축가의 설계컨셉을 전해 들은 조씨는 다른 폴리들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올 봄 그녀가 폴리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다.
‘소통의 오두막’은 1차 광주폴리의 최고 ‘히트상품’이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프로젝트로 탄생된 11개의 폴리 가운데 장소성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일부 폴리가 주변 환경과 동선 등 장소성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달리 화제를 모았다.
‘광주읍성, 광주의 사라진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옛 광주읍성터에 설치된 1차 폴리는 역사성 회복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이 목표였다. 당시 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이었던 승효상 건축가는 큐레이터 김영준, 라몬 프랏(Ramon Prat)과 공동으로 폴리 동선 등 큰 틀을 잡았다. 승 감독은 “디자인은 단지 보기 좋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폴리 프로젝트는 디자인이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어번폴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1차 폴리에는 도미니크 페로 등 6개국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10명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 가운데 삭막한 장동의 교통섬에 주목한 건축가는 스페인 출신의 후안 헤레로스였다. 우리에겐 노르웨이의 뭉크 미술관 설계자로 잘 알려진 그는 1985년 마드리드 건축학교를 졸업한 후 마드리드 도시건축상 3회 수상, 뉴욕 콜럼비아 대학, 프리스턴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파나마 중앙은행 타워, 콜롬비아 보고타 아고라 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히 그의 손에서 탄생된 뭉크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명소가 됐다.
후안 헤레로스는 설계 전 소쇄원을 둘러본 후 한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계곡물을 담 밑으로 흘러 보내고, 대나무 숲을 따라 지어진 소쇄원의 건축미에 영감을 얻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한옥의 굴뚝 이미지를 형상화 한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은 백미다.
그는 보잘 것 없는 교통섬의 가로수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 사이 사이의 공중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자연 친화적인 컨셉을 구현했다. 또한 이 곳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석조로 된 의자를 놓았고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도록 LED 조명을 설치했다. 사람과 사람,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문화공간을 탄생시킨 것이다.
‘소통의 오두막’이 들어선 이후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교통섬은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다. 낮에는 가로수와 거장의 건축미가 상생하는 공간, 밤에는 어두운 도심을 환하게 밝혀주는 ‘네온사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폴리 효과일까.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교통섬 주변은 점차 산뜻한 분위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철물점과 빈 가게들로 칙칙했던 동네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와 레스토랑, 편집숍, 액세서리숍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지난해 인근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맞은 편에 세계적인 조각가 우고 론디노네의작품 ‘ACC 매직 마운틴’이 설치되면서 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문화전당과 쿤스트라운지의 숄치 앤 융갤러리, 동명동의 크고 작은 문화공간과 연결된 거대한 벨트는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전남대 유우상(건축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분신인 폴리가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투어와 프로그램 등의 소극적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폴리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인근의 빈 건물들을 재단이나 지자체가 매입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이나 아지트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이날 폴리 도슨트로 부터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건축가의 설계컨셉을 전해 들은 조씨는 다른 폴리들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올 봄 그녀가 폴리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다.
‘소통의 오두막’은 1차 광주폴리의 최고 ‘히트상품’이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프로젝트로 탄생된 11개의 폴리 가운데 장소성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일부 폴리가 주변 환경과 동선 등 장소성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달리 화제를 모았다.
‘광주읍성, 광주의 사라진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옛 광주읍성터에 설치된 1차 폴리는 역사성 회복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이 목표였다. 당시 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이었던 승효상 건축가는 큐레이터 김영준, 라몬 프랏(Ramon Prat)과 공동으로 폴리 동선 등 큰 틀을 잡았다. 승 감독은 “디자인은 단지 보기 좋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폴리 프로젝트는 디자인이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어번폴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1차 폴리에는 도미니크 페로 등 6개국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10명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 가운데 삭막한 장동의 교통섬에 주목한 건축가는 스페인 출신의 후안 헤레로스였다. 우리에겐 노르웨이의 뭉크 미술관 설계자로 잘 알려진 그는 1985년 마드리드 건축학교를 졸업한 후 마드리드 도시건축상 3회 수상, 뉴욕 콜럼비아 대학, 프리스턴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파나마 중앙은행 타워, 콜롬비아 보고타 아고라 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히 그의 손에서 탄생된 뭉크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명소가 됐다.
후안 헤레로스는 설계 전 소쇄원을 둘러본 후 한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계곡물을 담 밑으로 흘러 보내고, 대나무 숲을 따라 지어진 소쇄원의 건축미에 영감을 얻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한옥의 굴뚝 이미지를 형상화 한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은 백미다.
그는 보잘 것 없는 교통섬의 가로수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 사이 사이의 공중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자연 친화적인 컨셉을 구현했다. 또한 이 곳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석조로 된 의자를 놓았고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도록 LED 조명을 설치했다. 사람과 사람,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문화공간을 탄생시킨 것이다.
‘소통의 오두막’이 들어선 이후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교통섬은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다. 낮에는 가로수와 거장의 건축미가 상생하는 공간, 밤에는 어두운 도심을 환하게 밝혀주는 ‘네온사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폴리 효과일까.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교통섬 주변은 점차 산뜻한 분위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철물점과 빈 가게들로 칙칙했던 동네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와 레스토랑, 편집숍, 액세서리숍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지난해 인근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맞은 편에 세계적인 조각가 우고 론디노네의작품 ‘ACC 매직 마운틴’이 설치되면서 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문화전당과 쿤스트라운지의 숄치 앤 융갤러리, 동명동의 크고 작은 문화공간과 연결된 거대한 벨트는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전남대 유우상(건축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분신인 폴리가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투어와 프로그램 등의 소극적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폴리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인근의 빈 건물들을 재단이나 지자체가 매입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이나 아지트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