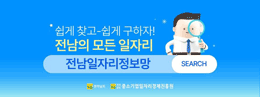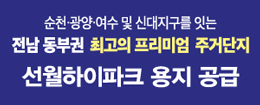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신호남지 - 제9부 미술] ① 불상에 깃든 미학-월출산 국보 마애불
구름으로 빚은 연좌 위 마애불, 천년의 숨결 살아있네
 국보 제114호 ‘영암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 |
소백산맥의 끝에 위치한 월출산은 전남 영암군과 강진군의 경계를 이룬 명산(名山)이다. 기암괴석이 많아 남국(南國)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때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 때에는 월생산(月生山)이라 불러 지명이 달(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출산은 골산(骨山·돌산)이기 때문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경주 남산과 비교될 만큼 여러 가지 불교 유적과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남지방에서 단일산으로 월출산만큼 불교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산도 없다. 불교의 유입은 백제시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수용은 통일신라 중대 이후이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불교문화가 더욱 꽃을 피우고 있다.
월출산의 불교문화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와 부분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불상은 마애불 7구, 석조불 2구, 대형 석불편 1, 금동불 2구, 목불 다수 등이 있으며, 석탑은 3층석탑 5개, 5층석탑 3개, 폐석탑 3개소 등 11개가 있다. 그리고 건물지의 발굴조사, 석탑의 복원, 새로운 문헌자료의 등장 등으로 계속해서 자료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불교문화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월출산의 주봉인 천황봉(해발 809m)의 서쪽 능선방향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한 구정봉(九井峯, 해발 738m)의 서쪽 중턱에 옛 절터가 있고, 그 위의 큰 바위면에 새겨진 불상(마애불)이 있다. 이 마애불은 1970년(동아일보 2월18일자)에 발견되어 ‘영암 월출산 마애불’(높이 8.6m)이라 이름 지어졌고, 마애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조각 기법도 우수하여 1972년에 국보 제144호로 지정되었다.
마애불 아래에 위치한 절터는 언제 창건되어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 절의 창건과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애불 주변에서 출토된 문자기와와 조선후기의 문헌 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용암사 관련 최초의 기록은 고려 초기의 기와에서 찾게 되었다. 고려 초기의 평기와편에 ‘ ’(용암사도솔)과 ‘統和二十五年丁未’(통화이십오년정미)란 글자가 새겨진 것을 현장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절터에서 ‘ ’와 ‘統和’명의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統和二十五年丁未’명의 기와를 1999년 마애불 뒤편에서 필자가 수습하였다. 통화이십오년정미는 1007년(요나라 성종 25, 고려 목종 10)으로 간지까지 정확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기와의 존재는 마애불을 조성하고 마애불을 보호하였던 목조전실이 있었던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용암사’란 이름의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절의 창건 때 이름은 ‘용암사’가 확실하다. 하지만 용암사의 창건을 알려주는 문헌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애불의 공반유물인 기와에서나마 이 절의 첫 출발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역시 용암사 관련 문헌은 찾아 볼 수 없어 어느 시기엔가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사되었던 용암사는 임진왜란 직후인 1604년에 중창되어 3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였으며, 금불(金佛) 1구가 봉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정호가 1862년에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암사는 19세기 후반 경에 폐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월출산 마애불은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장중한 인상을 주며,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기법과 더불어 박진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옆으로 길게 표현된 눈, 어깨와 팔의 느슨한 표현,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은 듯한 경직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 후기, 나말여초 혹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모두 불상의 양식만을 파악하여 마애불의 편년을 설정한 견해들이다. 이처럼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문화재는 어느 시기에 조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그 문화재와 공반되는 유물이 있다면 편년을 설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행히도 마애불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된 기와는 당초문과 연화문 암막새, 연화문 수막새 5종류, 문자기와, 13종류의 암·수키와 등으로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이 기와들 가운데 절 이름과 절대연대를 알려주고 있는 ‘ ’(용암사)와 ‘統和二十五年丁未’(통화이십오년정미)명의 평기와가 가장 중요하다. 절을 창건하면서 마애불도 같이 조성하였는데 절 이름은 ‘용암사’였으며, 창건은 고려 목종 10년인 1007년에 이루워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월출산 국보 마애불은 나말여초의 애매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고려 전기인 1007년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도선국사의 삼한통일의 ‘비기’(秘記)에 의하여 세워진 삼암사(三岩寺)의 하나였던 용암사가 바로 이 절터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현재 이 마애불의 문화재 명칭은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애불이 있던 절이 ‘용암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영암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 최인선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순천대 사학과 교수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이사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한국기와학회 회장
월출산의 불교문화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와 부분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불상은 마애불 7구, 석조불 2구, 대형 석불편 1, 금동불 2구, 목불 다수 등이 있으며, 석탑은 3층석탑 5개, 5층석탑 3개, 폐석탑 3개소 등 11개가 있다. 그리고 건물지의 발굴조사, 석탑의 복원, 새로운 문헌자료의 등장 등으로 계속해서 자료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불교문화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애불 아래에 위치한 절터는 언제 창건되어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 절의 창건과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애불 주변에서 출토된 문자기와와 조선후기의 문헌 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용암사 관련 최초의 기록은 고려 초기의 기와에서 찾게 되었다. 고려 초기의 평기와편에 ‘ ’(용암사도솔)과 ‘統和二十五年丁未’(통화이십오년정미)란 글자가 새겨진 것을 현장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절터에서 ‘ ’와 ‘統和’명의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統和二十五年丁未’명의 기와를 1999년 마애불 뒤편에서 필자가 수습하였다. 통화이십오년정미는 1007년(요나라 성종 25, 고려 목종 10)으로 간지까지 정확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기와의 존재는 마애불을 조성하고 마애불을 보호하였던 목조전실이 있었던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용암사’란 이름의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절의 창건 때 이름은 ‘용암사’가 확실하다. 하지만 용암사의 창건을 알려주는 문헌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애불의 공반유물인 기와에서나마 이 절의 첫 출발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역시 용암사 관련 문헌은 찾아 볼 수 없어 어느 시기엔가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사되었던 용암사는 임진왜란 직후인 1604년에 중창되어 3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였으며, 금불(金佛) 1구가 봉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정호가 1862년에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암사는 19세기 후반 경에 폐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월출산 마애불은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장중한 인상을 주며,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기법과 더불어 박진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옆으로 길게 표현된 눈, 어깨와 팔의 느슨한 표현,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은 듯한 경직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 후기, 나말여초 혹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모두 불상의 양식만을 파악하여 마애불의 편년을 설정한 견해들이다. 이처럼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문화재는 어느 시기에 조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그 문화재와 공반되는 유물이 있다면 편년을 설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행히도 마애불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된 기와는 당초문과 연화문 암막새, 연화문 수막새 5종류, 문자기와, 13종류의 암·수키와 등으로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이 기와들 가운데 절 이름과 절대연대를 알려주고 있는 ‘ ’(용암사)와 ‘統和二十五年丁未’(통화이십오년정미)명의 평기와가 가장 중요하다. 절을 창건하면서 마애불도 같이 조성하였는데 절 이름은 ‘용암사’였으며, 창건은 고려 목종 10년인 1007년에 이루워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월출산 국보 마애불은 나말여초의 애매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고려 전기인 1007년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도선국사의 삼한통일의 ‘비기’(秘記)에 의하여 세워진 삼암사(三岩寺)의 하나였던 용암사가 바로 이 절터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현재 이 마애불의 문화재 명칭은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애불이 있던 절이 ‘용암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영암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 최인선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순천대 사학과 교수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이사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한국기와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