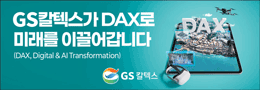[신호남지 - 제8부 여행과 문학] ③ 조선시대 옛 선비의 명산 감성유람
심시 수양하고 세상 통찰하다
 |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영국의 젠틀먼(gentleman), 중국의 신사(紳士), 조선의 선비는 종종 시대 흐름의 비교서술에서 등장하곤 한다. 학술적인 고증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회적·문화적인 시대 흐름을 비교 서술하는데서 함께 언급하곤 한다.
조선시대 선비는 영국의 젠틀먼, 중국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세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외경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경세가를 지향하는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가르침과 ‘태산을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라는 공자의 정신에 따라 산수를 유람하면서 특히 명산을 즐기면서 심신을 수양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이 남긴 유산기(遊山記)에 대해서 정원림(鄭元霖;1731∼1800)의 ‘동국산수기’(東國山水記)(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본)를 편역한 전송열·허경진은 “인간이 자연에 들어가고 자연이 인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기록들이라고 말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기록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산을 유람하며 남긴 글들이 많다. 선비들은 금강산, 백두산, 지리산, 관악산 등 옛날에도 요즘에도 유명한 산들을 유람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남겼다.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 유몽인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이인상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 조호익의 ‘유묘향산록’(遊妙香山錄), 주세붕의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최익현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은 교통지리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에 명산을 쉽게 오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옛 선비들이 찾았던 산수유람 책 가운데는 전국의 명산에 대한 유산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산기 가운데 옛 선비들이 첫 번째로 찾았던 필독서는 전국 각지 유명한 산의 경치를 세밀히 담아낸 ‘와유록’(臥遊錄)이었다. ‘와유록’은 조선시대에 산수유람에 대한 선비들의 바람이 많아짐에 따라 유람의 안내서가 필요해 산수유람의 기록을 모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직접 산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국의 명산 유람을 대리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였다. ‘와유록’은 글자 그대로 누워서 유람하는 책이었다. 책 한 권으로 조선 팔도의 산수 절경을 그야말로 생생히 즐길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전국의 명산을 유람한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자신의 견문, 감상을 감성적으로 써서 다른 이들이 산을 유람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곤 했다. 예컨대, “내달리는 듯한 산세는 말(馬)과 비슷하고, 빽빽이 늘어서 절하는 듯한 바위와 절벽들은 부처와 같다”는 표현이다. 또한 용이 놀았다는 ‘용유담’(龍遊潭)에서는 “푸른 삼나무와 붉은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다시 칡넝쿨과 담쟁이넝쿨이 얽히고 설켰다. 길게 일자로 뻗은 커다란 바위가 두 벼랑을 갈라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로 동강(東江)이 흐르다가 쏟아지니 허연 포말들이 서로 찧고 부딪쳤다. 바위는 사나운 물결에 스치고 갈리어 움푹 파이기도 하고, 혹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며, 혹은 떡 벌어져 틈이 나 있기도 하고, 혹은 평평한 마당을 이루기도 하였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400여 년 전 무등산 유람기록에도 등장한다. 1574년(선조 7년) 제봉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보면, “네 모퉁이를 반듯하게 깎고 갈아 층층이 쌓아 올린 품이 마치 석수장이가 먹줄을 튕겨 다듬어서 포개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감성적으로 풀어쓰고 있다. 고경명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내리면서 16세기 무등산과 인근의 모습을 이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옛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명산을 찾아 자연을 외경하고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기르는 태도나 시대적인 상황, 선비들의 교유관계, 현실적인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을 고전에 대한 지적 편린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드러내거나 감성적인 문장으로 풀어내곤 했다.
황준량은 지리산 기행인 ‘유두류산기행편’(遊頭流山紀行篇)에서 “새에 어두워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관리)들도 어질지 못하지만 하늘을 넘어 날아다니는 새가 어찌 그물에 걸리겠는가”라고 표현하였는데, 관리들의 학정을 비판하면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다. 옛 선비들의 유람은 세상을 통찰하는데 동원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세상을 통찰하는데는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바라볼 때 더욱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선비들의 유산기에는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자연 외경, 호연지기, 시대적인 상황, 교유관계,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 말고도 오늘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전통유산에 대한 설명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특정한 산수의 풍광, 모습, 유적, 연혁 등을 자세히 적은 산수유기 뿐아니라 명산의 유람을 기록한 시나 문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예컨대,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백두(頭)에서 흘러온(流) 산’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智) 사람으로 달라진다(異)’는 의미까지도 있음을 소개한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거의 있지 않았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매김하면서 많이 등장하였다. 김기주의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까닭: 유학(儒學)과 유람(遊覽)’(남명학연구 46권, 2015)에 의하면,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동기는 세 가지인데, 첫째 배움, 둘째 휴식, 세째 선현을 닮기 위한 노력이다고 했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 전통은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끊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지게 되었고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유산기 전통 또한 사라졌다.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하여 선비들의 시대가 등장하고 선비들이 세상을 통찰하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세워지면서 함께 유산기의 전통도 등장하였지만 성리학적 질서가 끝나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졌기 때문에 유산기의 전통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 선비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선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선비들의 세상을 통찰하던 방식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정식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처장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광주전남협의회 정책위원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집행위원
조선시대 선비는 영국의 젠틀먼, 중국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세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외경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경세가를 지향하는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가르침과 ‘태산을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라는 공자의 정신에 따라 산수를 유람하면서 특히 명산을 즐기면서 심신을 수양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은 교통지리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에 명산을 쉽게 오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옛 선비들이 찾았던 산수유람 책 가운데는 전국의 명산에 대한 유산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산기 가운데 옛 선비들이 첫 번째로 찾았던 필독서는 전국 각지 유명한 산의 경치를 세밀히 담아낸 ‘와유록’(臥遊錄)이었다. ‘와유록’은 조선시대에 산수유람에 대한 선비들의 바람이 많아짐에 따라 유람의 안내서가 필요해 산수유람의 기록을 모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직접 산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국의 명산 유람을 대리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였다. ‘와유록’은 글자 그대로 누워서 유람하는 책이었다. 책 한 권으로 조선 팔도의 산수 절경을 그야말로 생생히 즐길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전국의 명산을 유람한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자신의 견문, 감상을 감성적으로 써서 다른 이들이 산을 유람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곤 했다. 예컨대, “내달리는 듯한 산세는 말(馬)과 비슷하고, 빽빽이 늘어서 절하는 듯한 바위와 절벽들은 부처와 같다”는 표현이다. 또한 용이 놀았다는 ‘용유담’(龍遊潭)에서는 “푸른 삼나무와 붉은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다시 칡넝쿨과 담쟁이넝쿨이 얽히고 설켰다. 길게 일자로 뻗은 커다란 바위가 두 벼랑을 갈라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로 동강(東江)이 흐르다가 쏟아지니 허연 포말들이 서로 찧고 부딪쳤다. 바위는 사나운 물결에 스치고 갈리어 움푹 파이기도 하고, 혹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며, 혹은 떡 벌어져 틈이 나 있기도 하고, 혹은 평평한 마당을 이루기도 하였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400여 년 전 무등산 유람기록에도 등장한다. 1574년(선조 7년) 제봉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보면, “네 모퉁이를 반듯하게 깎고 갈아 층층이 쌓아 올린 품이 마치 석수장이가 먹줄을 튕겨 다듬어서 포개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감성적으로 풀어쓰고 있다. 고경명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내리면서 16세기 무등산과 인근의 모습을 이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옛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명산을 찾아 자연을 외경하고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기르는 태도나 시대적인 상황, 선비들의 교유관계, 현실적인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을 고전에 대한 지적 편린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드러내거나 감성적인 문장으로 풀어내곤 했다.
황준량은 지리산 기행인 ‘유두류산기행편’(遊頭流山紀行篇)에서 “새에 어두워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관리)들도 어질지 못하지만 하늘을 넘어 날아다니는 새가 어찌 그물에 걸리겠는가”라고 표현하였는데, 관리들의 학정을 비판하면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다. 옛 선비들의 유람은 세상을 통찰하는데 동원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세상을 통찰하는데는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바라볼 때 더욱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선비들의 유산기에는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자연 외경, 호연지기, 시대적인 상황, 교유관계,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 말고도 오늘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전통유산에 대한 설명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특정한 산수의 풍광, 모습, 유적, 연혁 등을 자세히 적은 산수유기 뿐아니라 명산의 유람을 기록한 시나 문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예컨대,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백두(頭)에서 흘러온(流) 산’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智) 사람으로 달라진다(異)’는 의미까지도 있음을 소개한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거의 있지 않았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매김하면서 많이 등장하였다. 김기주의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까닭: 유학(儒學)과 유람(遊覽)’(남명학연구 46권, 2015)에 의하면,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동기는 세 가지인데, 첫째 배움, 둘째 휴식, 세째 선현을 닮기 위한 노력이다고 했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 전통은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끊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지게 되었고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유산기 전통 또한 사라졌다.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하여 선비들의 시대가 등장하고 선비들이 세상을 통찰하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세워지면서 함께 유산기의 전통도 등장하였지만 성리학적 질서가 끝나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졌기 때문에 유산기의 전통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 선비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선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선비들의 세상을 통찰하던 방식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정식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처장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광주전남협의회 정책위원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