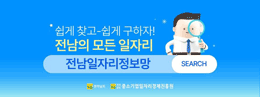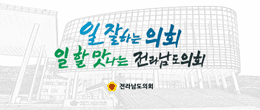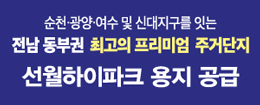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전라도 들여다보기] 문향 장흥과 보림사 - 김형주
장흥은 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문학의 고향이요, 문필의 고장이다. 장흥의 역사를 보면, 마한시대에는 이 곳에 건마국(乾馬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삼국시대에는 오아현(烏兒縣), 대로현(代勞縣), 마읍현(馬邑縣), 계수현(季水縣)으로 있었는데 모두 보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초에 오아현이 정안현으로, 마읍현이 수령현으로 고쳐져서 영암에 예속되었다. 또한 대로현은 회령현으로, 계수현은 장택현(長澤縣)으로 고쳐져 계속 보성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그 뒤 정안현은 인종 때 공예태후 임씨(恭睿太后任氏)의 고향이라 하여 장흥부로 승격되었다. 이 무렵 장흥부는 회령현·수령현·장택현과 영암군의 속현이었던 탐진현 등 4현을 이속시켜 거느리게 되었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1392년 부사 황보덕이 수령현의 중녕산에 성을 쌓아 장흥부의 치소를 만들었고, 1413년 장흥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중기 백광홍(白光弘)·백광훈 형제는 주옥같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후기 존재 위백규(魏伯珪) 선생은 경학·역사·지리·한의학에 통달한 호남의 실학자로서 문명을 떨쳤다.
문장과 학문의 전통은 해방 이후로도 면면히 계속되어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등 쟁쟁한 작가들을 배출하여 현대 한국문단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의 가지산파(迦智山派)에 속하는 보림사는 체징(體澄)선사에 의해 860년 창건되었다. 이후 중창을 거듭해 20채가 넘는 전각의 대사찰로 발전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사천왕문과 외호문을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다가 순차 복원되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 제44호인 보림사(寶林寺) 삼층석탑 및 석등, 국보 제117호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55호인 보림사 동부도(東浮屠), 보물 제156호인 보림사 서부도, 보물 제157호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보물 제158호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등 다수가 있다.
대적광전 앞 쌍탑 형식의 삼층석탑은 남탑이 높이 5.4m, 북탑은 5.9m이다. 석탑의 중간에 위치한 석등은 높이 3m로서 지대석, 간주석, 화사석, 보주 등을 갖추고 있다. 북탑에서 발견된 명문으로 보아 87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과 석등은 단순 소박한 고졸미(古拙美)를 보여주며 오랜 세월에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불로 대좌와 광배를 잃고 불상만 남아 있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武州長沙·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의 시주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선종 불교의 성행으로 전국 곳곳에 사찰의 건립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철불은 금동불보다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까닭에 지방 유지들의 과감한 재원 출연으로 철불의 제작이 통일신라 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철불은 엄격한 형태미의 ‘중앙 양식’을 탈피해 서민정서에 부합되는 ‘지방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청명한 가을날 남도의 문향(文鄕) 장흥을 찾아서 그윽한 보림사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조선왕조를 개창한 1392년 부사 황보덕이 수령현의 중녕산에 성을 쌓아 장흥부의 치소를 만들었고, 1413년 장흥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중기 백광홍(白光弘)·백광훈 형제는 주옥같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후기 존재 위백규(魏伯珪) 선생은 경학·역사·지리·한의학에 통달한 호남의 실학자로서 문명을 떨쳤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의 가지산파(迦智山派)에 속하는 보림사는 체징(體澄)선사에 의해 860년 창건되었다. 이후 중창을 거듭해 20채가 넘는 전각의 대사찰로 발전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사천왕문과 외호문을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다가 순차 복원되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 제44호인 보림사(寶林寺) 삼층석탑 및 석등, 국보 제117호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55호인 보림사 동부도(東浮屠), 보물 제156호인 보림사 서부도, 보물 제157호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보물 제158호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등 다수가 있다.
대적광전 앞 쌍탑 형식의 삼층석탑은 남탑이 높이 5.4m, 북탑은 5.9m이다. 석탑의 중간에 위치한 석등은 높이 3m로서 지대석, 간주석, 화사석, 보주 등을 갖추고 있다. 북탑에서 발견된 명문으로 보아 87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과 석등은 단순 소박한 고졸미(古拙美)를 보여주며 오랜 세월에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불로 대좌와 광배를 잃고 불상만 남아 있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武州長沙·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의 시주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선종 불교의 성행으로 전국 곳곳에 사찰의 건립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철불은 금동불보다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까닭에 지방 유지들의 과감한 재원 출연으로 철불의 제작이 통일신라 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철불은 엄격한 형태미의 ‘중앙 양식’을 탈피해 서민정서에 부합되는 ‘지방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청명한 가을날 남도의 문향(文鄕) 장흥을 찾아서 그윽한 보림사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