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건축가,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이타미 준 지음, 김난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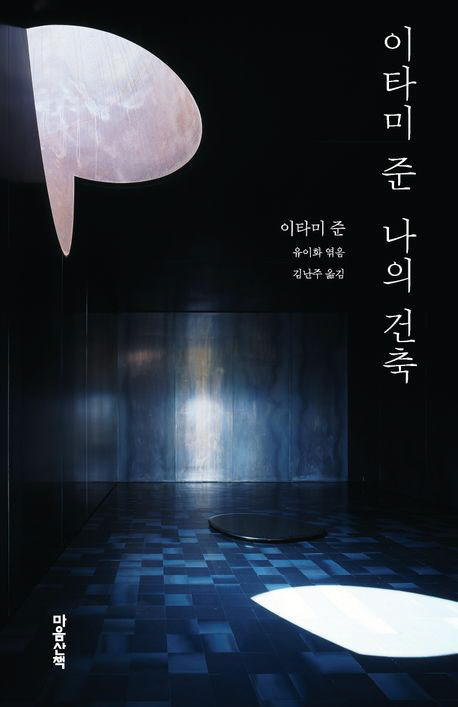 |
양방언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보면 제주에 가고 싶어진다. 치유와 명상의 공간 ‘수·풍·석 미술관’, 지형과 조응하며 낮게 엎드린 포도 호텔, 고요한 경건함의 세계 방주교회 등에 들러 그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 닿으면 번잡한 세상 일을 잊고 잠시 사색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재일 한국인 건축가 유동룡(1935~2011). 평생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그는 건축가로서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첫 한국 방문 당시 이용한 이타미 공항에서 성을, 절친 음악가 길옥윤의 한자 ‘윤(潤)’에서 이름을 따 건축가 이타미 준이 되었다.
그는 “건축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맥과 전통성 위에서만 현재의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고, “건축이 사회의 요구와 감각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 유이화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쓴 글을 선별해 엮은 책이다. 아버지와 토론하고 함께 작업하며, 또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런 사람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곤 했던 딸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의 철학을 담은 유동룡미술관을 세워 아버지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197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쓴 글을 모은 책은 ‘이타미 준, 유동룡’, ‘조선에 살다’, ‘영감의 탄생’, ‘나의 건축’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인 최초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개인전 개최,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 수훈, 재일 한국인 최초 일본 ‘무라노 도고상’ 수상 등의 업적을 이룬 이타미 준은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했다. 그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삶의 태도와 오랫동안 몰두했던 조선시대 예술에 대한 탐구,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유이화는 아버지에 대해 “건축이 삶이자 예술 그 자체였고, 건축가를 넘어 뼛속까지 예술가인 사람이었다. 수많은 예술가와 교류하며 그림을 그리는 한편 서예와 음악, 골동품 수집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아버지의 언어이자 삶의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예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평생 사랑했던 백자와 다완, 민화, 종묘 등 조선시대의 건축과 예술작품에 대한 찬사를 글로 남겼고 그가 소장했던 백자 등은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스스로를 ‘마지막 남은 손의 건축가’라고 여기며 컴퓨터 설계를 배제하고 선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던 그는 끝까지 아날로그 드로잉을 고수했고 책에 등장하는 그의 드로잉 작품들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온다.
역시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한 글들이다.
“‘흙으로 빚은 조형’을 주제로 설계, 소재로 사용한 흙은 나에게 공간에 대한 실마리로 존재하고, 시간의 두께인 동시에 지역성에 뿌리내린 사상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 온양미술관 , 예술의 조각가 하야미 시로의 작업실인 ‘조각가의 아틀리에’, 홋카이도현 도마코마이시 남부에 자리한 ‘석채의 교회’, 기도의 형태를 빌려 염원의 공간으로 설계한 ‘두손미술관’ 등이다.
그밖에 동양적 미니멀리즘의 대가 화가 곽인식, 시인 같은 건축가 김중업,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건축가 시라이 세이미치 등 평생 교류한 예술인들에 대한 글을 통해 그의 발전과 성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그를 이르는 호칭 중 하나인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가’를 주제로 한 긴 대담에서는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그의 삶과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마음산책·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는 “건축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맥과 전통성 위에서만 현재의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고, “건축이 사회의 요구와 감각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 유이화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쓴 글을 선별해 엮은 책이다. 아버지와 토론하고 함께 작업하며, 또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런 사람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곤 했던 딸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의 철학을 담은 유동룡미술관을 세워 아버지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아시아인 최초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개인전 개최,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 수훈, 재일 한국인 최초 일본 ‘무라노 도고상’ 수상 등의 업적을 이룬 이타미 준은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했다. 그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삶의 태도와 오랫동안 몰두했던 조선시대 예술에 대한 탐구,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이타미 준이 설계한 제주의 ‘두손미술관’ <김용관·마음산책 제공> |
스스로를 ‘마지막 남은 손의 건축가’라고 여기며 컴퓨터 설계를 배제하고 선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던 그는 끝까지 아날로그 드로잉을 고수했고 책에 등장하는 그의 드로잉 작품들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온다.
역시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한 글들이다.
“‘흙으로 빚은 조형’을 주제로 설계, 소재로 사용한 흙은 나에게 공간에 대한 실마리로 존재하고, 시간의 두께인 동시에 지역성에 뿌리내린 사상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 온양미술관 , 예술의 조각가 하야미 시로의 작업실인 ‘조각가의 아틀리에’, 홋카이도현 도마코마이시 남부에 자리한 ‘석채의 교회’, 기도의 형태를 빌려 염원의 공간으로 설계한 ‘두손미술관’ 등이다.
그밖에 동양적 미니멀리즘의 대가 화가 곽인식, 시인 같은 건축가 김중업,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건축가 시라이 세이미치 등 평생 교류한 예술인들에 대한 글을 통해 그의 발전과 성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그를 이르는 호칭 중 하나인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가’를 주제로 한 긴 대담에서는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그의 삶과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마음산책·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