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표현’ 상품-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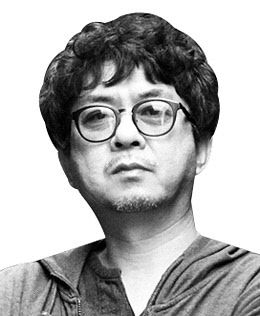 |
‘표현(表現)’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렇다. ‘의사나 감정 등을 드러내어 나타냄’……. ‘표(表)’에 ‘겉’의 의미가 있고 ‘현(現)’에 ‘나타내다, 밝히다’의 의미가 있으니 축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겉으로 나타냄’ 정도의 뜻이다. 국어학 공부를 다시 하자는 의도는 없지만 ‘나타내다’가 타동사란 점은 지적한다.
즉 이 동사는 나타낼 대상으로서의 목적어 곧 ‘~~~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이유로 ‘표현’의 사전적 의미에는 애초 그 단어가 품고 있지 않았던 ‘의사나 감정을’이라는 목적어가 첨언 되어 있다. 우리는 표현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가 품은 마음이나 생각이다.
‘표(表)’에 ‘겉’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거니와, ‘겉’이란 말은 ‘속’이란 말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속이 없다면 겉도 없다. 달리 말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표현이고, 이때 ‘속에 있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다. 그리고 이 말은 속과 겉의 일관성을 전제한다. 속과 겉이 일관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이 ‘올바르다’, ‘진실되다’, 혹은 ‘진정성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 ‘표현’의 범위와 자유를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2001헌가27) 언론과 출판의 범위는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 표현 또는 의사 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 수단이 ‘표현의 자유’에 포괄된다. 물론 그 다양한 표현 수단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속’과 ‘겉’이 다를 경우, 곧 표현된 바가 표현하는 자의 마음이나 생각과 다를 경우 말이다. 간단히 말해 ‘거짓말’, ‘허위 사실’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고 말면 그뿐일까? 문제는 많은 경우 그런 표현상의 비일관성(겉과 속이 다름)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때로는 다수에 의해 기대되기조차 한다는 점에 있다. 진실보다 거짓이 자극적이고 매혹적일 때가 많다는 점은 요즘의 세태가 증명한다. 떼돈 버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혹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럴 때 ‘표현’은 상품이 된다.
표현은 상품이다. 그저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래 상품에는 많은 사연(노동과 피와 눈물)이 감춰져 있다. 상품의 ‘속’이다. 그러나 이 원래의 사연으로부터 분리되어 가판대에 전시(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일정의 화폐가치로 교환이 가능한 사물, 곧 상품이 된다. 누구도 상품의 속을 묻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가격표가 상품의 속을 대신한다. 표현도 마찬가지다.
애초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 가졌던 마음과 생각, 곧 ‘속’과 무관하게 각종 매체에(특히 유튜브)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조회수에 비례한다) ‘쇼츠’와 ‘릴스’와 ‘짤’과 (좌우를 막론한) ‘뉴스-쇼’ 형태의 상품이 된다. 겉과 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고 관심도 없다. 이른바 탈진실의 정치란 이런 것이다. 누구도 표현의 속과 겉이 일치하는지, 곧 표현된 목적어가 사실에 합치하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묻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은 그런 세계를 ‘표현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사고파는 행태가 만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씁쓸하단 말로는 부족할 듯하다.
‘표(表)’에 ‘겉’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거니와, ‘겉’이란 말은 ‘속’이란 말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속이 없다면 겉도 없다. 달리 말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표현이고, 이때 ‘속에 있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다. 그리고 이 말은 속과 겉의 일관성을 전제한다. 속과 겉이 일관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이 ‘올바르다’, ‘진실되다’, 혹은 ‘진정성 있다’라고 평가한다.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 수단이 ‘표현의 자유’에 포괄된다. 물론 그 다양한 표현 수단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속’과 ‘겉’이 다를 경우, 곧 표현된 바가 표현하는 자의 마음이나 생각과 다를 경우 말이다. 간단히 말해 ‘거짓말’, ‘허위 사실’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고 말면 그뿐일까? 문제는 많은 경우 그런 표현상의 비일관성(겉과 속이 다름)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때로는 다수에 의해 기대되기조차 한다는 점에 있다. 진실보다 거짓이 자극적이고 매혹적일 때가 많다는 점은 요즘의 세태가 증명한다. 떼돈 버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혹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럴 때 ‘표현’은 상품이 된다.
표현은 상품이다. 그저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래 상품에는 많은 사연(노동과 피와 눈물)이 감춰져 있다. 상품의 ‘속’이다. 그러나 이 원래의 사연으로부터 분리되어 가판대에 전시(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일정의 화폐가치로 교환이 가능한 사물, 곧 상품이 된다. 누구도 상품의 속을 묻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가격표가 상품의 속을 대신한다. 표현도 마찬가지다.
애초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 가졌던 마음과 생각, 곧 ‘속’과 무관하게 각종 매체에(특히 유튜브)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조회수에 비례한다) ‘쇼츠’와 ‘릴스’와 ‘짤’과 (좌우를 막론한) ‘뉴스-쇼’ 형태의 상품이 된다. 겉과 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고 관심도 없다. 이른바 탈진실의 정치란 이런 것이다. 누구도 표현의 속과 겉이 일치하는지, 곧 표현된 목적어가 사실에 합치하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묻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은 그런 세계를 ‘표현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사고파는 행태가 만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씁쓸하단 말로는 부족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