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최대 부작용은 청년일자리 감소”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 교수 10명 중 6명 답변
경총 “노후소득 문제 책임은 기업 아닌 국가에”
경총 “노후소득 문제 책임은 기업 아닌 국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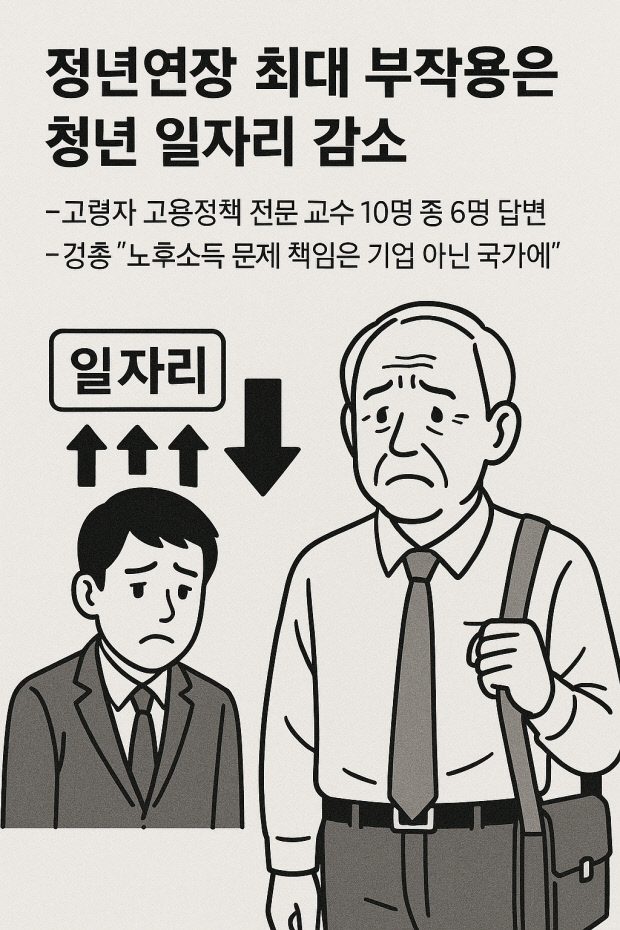 ChatGPT Image |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 경영·경제·법학 교수 10명 중 6명이 법정 정년 상향에 따른 최대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책임 주체에 대해선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 나왔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였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 68.1%, 고용유연성 제고 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年功性)이라는 답변이 66.7%로 가장 많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책임 주체에 대해선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 나왔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였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 68.1%, 고용유연성 제고 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을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