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인의 ‘소설처럼’] 그때 내가 그러했던 일 - 위수정 소설집 ‘우리에게 없는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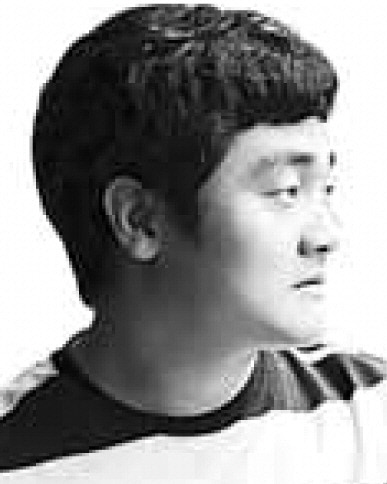 |
인생은 모두가 아는 특별한 순간에 엄청난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순간이나 결정이라는 건 엔트로피가 폭발하는 지점일 텐데, 그것은 이전에 숱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의 결정과 운명은 어쩌면 예전에 내가 쌓아 올린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불과할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로부터 크게 바꾸려면 더한 에너지의 변환이 필요하다. 어느 한순간의 결정과 충동적인 결심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삶은 죽음 직전까지 지속적이고 지난하게 복잡하다.
그럼에도 가끔은 과거의 특정한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 1999년 겨울이나 2022년 봄이면 어떨까. 그보다 좀 더 명확해도 괜찮을 것이다. 가령 그 시절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내 직업은 이게 아니지 않을까. 그날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그날 그에게 제대로 화를 냈다면 지금 와 내 마음은 더 나을까. 그날 길고양이를 구조해 키우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부질없는 일이지만 부질없어서 하릴없이 하고야 마는 생각들.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가…….
위수정 소설집 ‘우리에게 없는 밤’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인간의 여러 면모를 그려낸다. 시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판타지 소설은 아니다. 시간을 물리적으로 뒤트는 SF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위수정의 소설은 읽는 이의 시간을 뒤틀어 그사이를 오가게 한다. 지지부진한 인물, 맹목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의 시간과 운명을 따라가다 나의 시간과 운명을 생각하게 한다. 내 시간과 운명에 끌려 나와 함께 있게 된 곁의 사람의 눈을 보게 한다.
표제작 ‘우리에게 없는 밤’의 ‘지수’는 SNS를 통한 조건만남으로 돈을 번다. 사회적 통념은 지수를(지수의 성을 구매한 자들보다 우선하여) 공격하고 비판할 테지만, 소설의 세계는 잠시 멈추고 지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지수의 친구 ‘은선’은 이른바 ‘캣 맘’이다.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고, 길고양이를 돌본다. 지수는 일을 하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실제 위험보다 걱정하지는 않지만 은선은 고양이를 돌보며 맞닥뜨릴 수 있는 폭력에 사뭇 불안해한다. 팬데믹 시기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지킬 수 없는 법과 현실 앞에 무력하고, 그러한 현실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하다. 소설의 끝에서 지수는 끝내 SNS 계정을 폐쇄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쉽게 해석하긴 어렵다. 어떤 이들에게 이곳은 폐허뿐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리에 있다. 지수나 은선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아무도’의 주인공 ‘희진’은 남편이 아닌 사람을 원한다. 그리하여 남편 ‘수형’과 헤어짐을 결심한다. 희진은 수형을 설득해 별거를 결정한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홀로 살아가려 애쓴다. 그토록 원하는 그에게 연락하지만, 이 사랑에 미래가 없음도 안다. 도리어 생각한다. 미래가 없는 게 무얼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희진은 1999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소개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념은 희진을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소설은 또 한번 멈추어 바라볼 것을 권한다. 현재와 미래란 무엇인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은 미래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너무 차가운 나머지 뜨거운 고통을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 것인지.
‘멜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일상을 살던 40대 여성의 임신 이야기이다. 오직 축복이거나 혹은 현실의 고투여야 할 임신과 출산을 작가는 집요한 눈으로 좇는다. 축복과 고투 사이의 무엇을 작가는 내어놓는다. 그것은 다디단 멜론의 살이기도 하지만, 손에 묻어 불쾌하게 끈적한 과즙이기도 할 것이다. 소설은 삶의 시간을 이토록 뒤틀고 뒤집는다. 시기별 과업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준다. 그렇기에 소설은 특별한 순간, 엄청난 결정은 아니더라도, 삶의 속도와 방향에 예민한 감각 하나를 더할 수 있다. <시인>
표제작 ‘우리에게 없는 밤’의 ‘지수’는 SNS를 통한 조건만남으로 돈을 번다. 사회적 통념은 지수를(지수의 성을 구매한 자들보다 우선하여) 공격하고 비판할 테지만, 소설의 세계는 잠시 멈추고 지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지수의 친구 ‘은선’은 이른바 ‘캣 맘’이다.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고, 길고양이를 돌본다. 지수는 일을 하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실제 위험보다 걱정하지는 않지만 은선은 고양이를 돌보며 맞닥뜨릴 수 있는 폭력에 사뭇 불안해한다. 팬데믹 시기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지킬 수 없는 법과 현실 앞에 무력하고, 그러한 현실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하다. 소설의 끝에서 지수는 끝내 SNS 계정을 폐쇄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쉽게 해석하긴 어렵다. 어떤 이들에게 이곳은 폐허뿐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리에 있다. 지수나 은선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아무도’의 주인공 ‘희진’은 남편이 아닌 사람을 원한다. 그리하여 남편 ‘수형’과 헤어짐을 결심한다. 희진은 수형을 설득해 별거를 결정한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홀로 살아가려 애쓴다. 그토록 원하는 그에게 연락하지만, 이 사랑에 미래가 없음도 안다. 도리어 생각한다. 미래가 없는 게 무얼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희진은 1999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소개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념은 희진을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소설은 또 한번 멈추어 바라볼 것을 권한다. 현재와 미래란 무엇인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은 미래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너무 차가운 나머지 뜨거운 고통을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 것인지.
‘멜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일상을 살던 40대 여성의 임신 이야기이다. 오직 축복이거나 혹은 현실의 고투여야 할 임신과 출산을 작가는 집요한 눈으로 좇는다. 축복과 고투 사이의 무엇을 작가는 내어놓는다. 그것은 다디단 멜론의 살이기도 하지만, 손에 묻어 불쾌하게 끈적한 과즙이기도 할 것이다. 소설은 삶의 시간을 이토록 뒤틀고 뒤집는다. 시기별 과업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준다. 그렇기에 소설은 특별한 순간, 엄청난 결정은 아니더라도, 삶의 속도와 방향에 예민한 감각 하나를 더할 수 있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