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인의 ‘소설처럼’] 우리를 살려내는 빛 - 조해진 장편소설 ‘빛과 멜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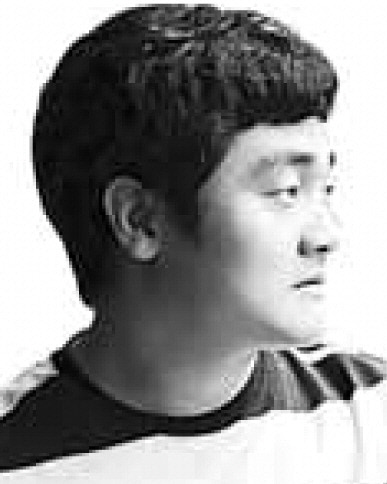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국제 증시를 걱정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을 가했을 때 사람들은 국제 유가를 신경 썼다. 우크라이나 어느 도시, 미사일 공격으로 뼈대만 남은 아파트와 폭발의 잔해에 둘러싸인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시소가 뉴스 화면에 보였다. 하단 자막에는 나스닥 증시가 파란색으로 물결쳤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 다음 뉴스에서는 더러워 보이는 천에 덮인 채 낡디 낡은 들것에 실려 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손목이 보였다. 자막에서는 미국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였다. 그리고 다음 소식, 불볕더위가 계속되니 바깥출입을 삼가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뉴스는 전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쯤은 모두 알 것만 같았지만…….
나치 히틀러는 인류 최악의 전쟁 범죄라 일컫는 홀로코스트를 벌였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서 독일의 도시 드레스덴을 소이탄으로 융단 폭격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폭격할 장소를 찾아 비행하고, 팔레스타인 곳곳에는 학교와 병원을 막론하고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 난민과 테러가 발생한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는 인류의 습성이자 전통 같은 것일까? 이런 우리에게 희망과 연대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마냥 그렇다 대답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다른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해진의 소설을 읽어봐도 좋겠다. 10년 전 발표한 ‘빛의 호위’를 확장하며 갱신한 장편소설 ‘빛의 멜로디’가 그것이다. ‘승준’은 기자로 일하며 특히 인터뷰에 흥미와 성과를 보인다. 그중 분쟁 지역에서 사진 작업을 해온 ‘권은’과의 인터뷰는 시간이 지났어도 잊지 못한다. 바로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권은은 승준과 동창이고, 승준이 그 시절 권은에게 건넨 카메라가 권은을 살게 했다. 그날의 호의는 빛의 호위가 되었다. 권은 카메라로 빛을 포착하고 모았으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려고 했다. 본디 그것은 권은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꼬마 반장으로 시작된 빛은 사람의 힘으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와 영국에까지 이른다. 작가의 말처럼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은 그 사람에게마저 동등하게 곁을 내준다. 가령, 승준의 아내 민영은 전쟁통에 있지 않지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불화하며 전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활동가이자 사진작가인 게리의 아버지는 군인 시절, 드레스텐 폭격에 참여했다. 아들과 일생을 불화한 그가, 아들에게 끝내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도…… 사람을 죽이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지.” 숱한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시대를 관통하며 넓은 장소를 횡단하는 이 빛은 조해진 작가 특유의 강단 있는 다정함으로 묶여 하나의 멜로디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인간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진실을 믿는 한, 이 빛은 전달될 것이다. 소설에서는 승준과 민영의 딸 지유와 런던의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여성 나스차의 아이에게 그 빛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닿는다.
조해진 장편소설 ‘빛과 멜로디’는 뉴스가 앙상하게 전달하는 장면에 스치는 빛을 붙잡는다. 그 빛에는 ‘가망 없음’을 ‘희망 있음’으로 기필코 바꾸는 악력이 있다. 폭격의 한가운데에서 다친 사람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손, 전쟁통에 태어나 힘찬 울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아기의 손, 고통에 사로잡혀 스노볼을 안은 채 잠든 어린아이의 손…… 그 손들에 빛이 발한다. <시인>
꼬마 반장으로 시작된 빛은 사람의 힘으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와 영국에까지 이른다. 작가의 말처럼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은 그 사람에게마저 동등하게 곁을 내준다. 가령, 승준의 아내 민영은 전쟁통에 있지 않지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불화하며 전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활동가이자 사진작가인 게리의 아버지는 군인 시절, 드레스텐 폭격에 참여했다. 아들과 일생을 불화한 그가, 아들에게 끝내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도…… 사람을 죽이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지.” 숱한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시대를 관통하며 넓은 장소를 횡단하는 이 빛은 조해진 작가 특유의 강단 있는 다정함으로 묶여 하나의 멜로디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인간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진실을 믿는 한, 이 빛은 전달될 것이다. 소설에서는 승준과 민영의 딸 지유와 런던의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여성 나스차의 아이에게 그 빛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닿는다.
조해진 장편소설 ‘빛과 멜로디’는 뉴스가 앙상하게 전달하는 장면에 스치는 빛을 붙잡는다. 그 빛에는 ‘가망 없음’을 ‘희망 있음’으로 기필코 바꾸는 악력이 있다. 폭격의 한가운데에서 다친 사람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손, 전쟁통에 태어나 힘찬 울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아기의 손, 고통에 사로잡혀 스노볼을 안은 채 잠든 어린아이의 손…… 그 손들에 빛이 발한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