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특정한 기억이나 정서 뛰어넘는 한 개인의 우주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집을 위한 인문학
노은주·임형남 지음
노은주·임형남 지음
 저자들은 집에는 일상과 기억, 정신까지 담겨 있다고 본다. 겉에서 보면 2층집이지만 4개의 레벨를 가진 구례의 4층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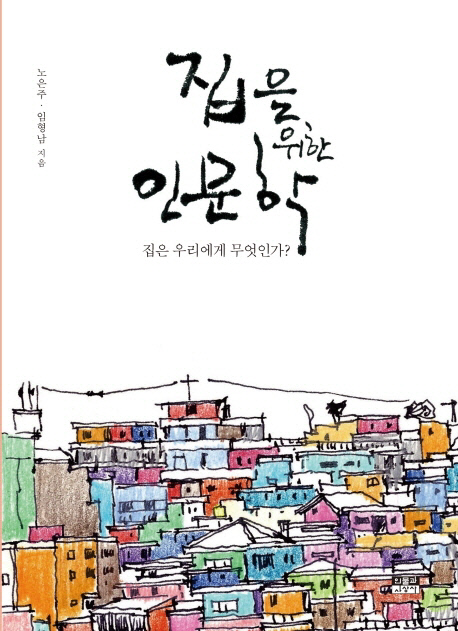 |
프랑스의 건축가 폴 앙드뢰는 이런 말을 했다. “나를 품어주었던 집, 내가 자랐던 집은 그 후 내 속에 있고 나와 더불어 세월의 지평선으로 사라진다.”
폴 앙드뢰의 말은 단순한 건물과 공간의 의미만을 상정하지 않는다. 한 인간의 역사와 흔적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전제한다.
홍익대 건축학과 동문이자 가온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노은주·임형남 부부의 말이다. 이들에게 건축은 “땅이 꾸는 꿈이고, 사람들의 삶에서 길어 올리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이들은 ‘골목 인문학’, ‘생각을 담은 집 한옥’, ‘사람을 살리는 집’과 같은 책을 펴냈다. “가장 편안하고, 인간답고, 자연과 어우러진 집을 궁리”하기 위해 골목을 거닐고 도시를 산책했다.
‘한 개인의 우주’라는 말이 주는 울림은 만만치 않다. 일상과 삶을 아우르고 기억과 추억, 한 인간의 모든 정신까지도 담겨 있다는 의미다. 집이 단순한 자재와 설계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정신과 정서로 쌓아올린 총체물이라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일까?
먼저 집은 가족을 품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이 말만큼 따뜻한 표현은 없다. 구례에는 3대가 사는 전통적인 가족을 위한 집이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바깥에서 보면 2층집이지만 4개의 레벨를 가진 집이다. 반층 씩 물린 4층의 집으로 할머니의 공간과 가족의 공간, 부부의 방, 아이의 방이 있다. 여기에 남편의 공간이자 취미를 위한 공간도 있다.
“그리고 거실 앞에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별채를 만들었다. 가족들의 공간이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시선이 맞닿는 곳에서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갖도록 한 것이다.”
 ‘고요히 머무르며 우러른다’는 뜻의 하동의 ‘적이재’. <인물과사상사 제공> |
두 번째로 집은 사람을 품는다. 경남 하동의 ‘적이재’는 산과 강이 함께 한다. ‘고요히 머무르며 우러른다’는 의미는 오래된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년을 맞이한 어느 가장이 서울 살림을 거두고 부인의 고향 하동으로 낙향을 했다.
주인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후 어린 시절 살았던 농촌의 마루가 있고 텃밭과 마당이 있는 집을 원했다. 그로 인해 외관은 한옥을 모티브로 삼았다. 저자는 “건축의 온도는 무엇이고 삶의 온도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이하던 밥 짓는 연기처럼,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처럼, 가꾸지 않아도 편안한 마당처럼, 가족들이 아랫목에 발을 맞대고 하릴없이 떠드는 말의 온기처럼,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집은 자연을 품는다. 충남 아산시 동정리 ‘선의 집’은 수평으로 뻗어나간 집과 원래 자리에 있던 수직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산이 적당하게 둘러서 있으며 저수지 인근에 논밭이 있다. 하나의 땅에 세 채의 집이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른 풍경은 자연과의 조화를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집은 이야기를 품는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답과는 무관하다. 집이 생명력을 얻고 기억되는 것은 그 안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던 빈 땅에 선이 그어지고 벽이 올라오고 지붕이 덮이기까지의 과정은 낯선 골목에서 여기저기 들어가 보고 되돌아 나오며 마침내 출구를 찾을 때까지 헤매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누가 정의해주고 알려주지 않아도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지식들을 모아 큰 줄기를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나간다”고 강조한다. <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