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화가 … ‘문예 부흥’ 이끈 전문지식인
조선의 중인들
허경진 지음
허경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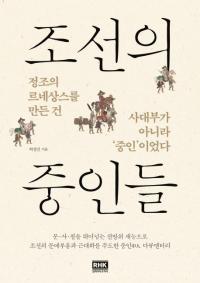 |
“김수팽이 어느 날 서류를 결재 받으려고 판서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판서는 마침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김수팽이 결재해 달라고 청했지만, 판서는 머리만 끄덕일 뿐 여전히 바둑만 두었다. 수팽이 섬돌에 뛰어올라가 손으로 바둑판을 쓸어버리고, 뜰로 내려와 아뢰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랏일은 늦출 수가 없으니, 저를 파직시키고 다른 아전을 시켜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즉시 하직하고 나가버렸다. 판서가 쫓아와 사과하며 그를 붙들었다.” (본문 중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동시통역사, 공인회계사 등은 조선시대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師, 士)’ 자 돌림은 여전히 선망의 직종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들은 한낱 중인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 신분 계층은 양반, 중인, 평민·천민으로 나뉘었다. 중인(中人)은 글자 그대로 양반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평민이나 천민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경계인에 지나지 않았다.
관원인 중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들은 평생 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했다. 자연히 한 곳에서 근무하므로 전문성이 뛰어났다.(승진할 때마다 다른 관청으로 옮기는 양반과 근무 방식이 달랐다.)
일례로 왕의 진료를 책임지는 내의원 경우만 하더라도 책임자인 도제조는 재상이 겸하고 부제조는 승지가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문 역할만 했을 뿐, 정작 치료는 의원이 담당했다. 한마디로 중인은 관청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중인을 선발하는 과거를 잡과(雜科)라 천시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생원과 진사 합격자에게는 국보(國寶)를 찍은 백패를 주었지만, 잡과 합격자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주었을 뿐이다. 천문학, 지리학 등을 전공한 기술관과 화원, 악공 등 예능인이 이에 속했다.
연세대 허경진(국문과) 교수가 중인을 다룬 책을 발간했다. ‘조선의 중인들’은 문사철을 뛰어넘는 재능으로 조선의 문예부흥과 근대화를 주도한 중인에 초점을 둔다.
저자는 중인이 왕실과 사대부를 보좌하는데 그쳤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평한다. “정조의 르네상스를 만든 건 사대부가 아니라 ‘중인’이었다”는 관점이다.
신필(神筆)로 유명한 ‘달마도’의 화가 김명국, 우리나라 서화를 집대성한 오세창, 그림값을 많이 주면 되레 돈을 내던졌던 화가 최북, ‘가객원류’를 편찬한 가객 박효관 등은 저마다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했던 예인들이었다.
중인의 활약은 예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다. 침술의 대가 허임, 신의(神醫)라 불릴 만큼 의술이 뛰어났던 백광현, 전염병 마마로부터 왕실을 구한 유상,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천재 국수(國手) 유찬홍 등은 계급의 질곡에 맞섰던 전문지식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중인들의 활약은 대륙과 바다를 넘나들며 확대되었다. 17, 18세기 한류를 일으킨 역관시인 홍세태, 통신사 최고의 무예사절 마상재,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변수는 신분의 벽을 넘어 신세계를 꿈꾸었다. 책에 등장하는 중인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문헌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은 조금의 인위적 가감이나 재배치가 없다.
“조선의 문예부흥기였던 정조대왕 시대도 그 뒤안길에서 중인이 르네상스인으로 활동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이 시대에 중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의사, 약사, 변호사, 동시통역사, 공인회계사 등은 조선시대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師, 士)’ 자 돌림은 여전히 선망의 직종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들은 한낱 중인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 신분 계층은 양반, 중인, 평민·천민으로 나뉘었다. 중인(中人)은 글자 그대로 양반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평민이나 천민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경계인에 지나지 않았다.
일례로 왕의 진료를 책임지는 내의원 경우만 하더라도 책임자인 도제조는 재상이 겸하고 부제조는 승지가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문 역할만 했을 뿐, 정작 치료는 의원이 담당했다. 한마디로 중인은 관청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중인을 선발하는 과거를 잡과(雜科)라 천시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생원과 진사 합격자에게는 국보(國寶)를 찍은 백패를 주었지만, 잡과 합격자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주었을 뿐이다. 천문학, 지리학 등을 전공한 기술관과 화원, 악공 등 예능인이 이에 속했다.
연세대 허경진(국문과) 교수가 중인을 다룬 책을 발간했다. ‘조선의 중인들’은 문사철을 뛰어넘는 재능으로 조선의 문예부흥과 근대화를 주도한 중인에 초점을 둔다.
저자는 중인이 왕실과 사대부를 보좌하는데 그쳤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평한다. “정조의 르네상스를 만든 건 사대부가 아니라 ‘중인’이었다”는 관점이다.
신필(神筆)로 유명한 ‘달마도’의 화가 김명국, 우리나라 서화를 집대성한 오세창, 그림값을 많이 주면 되레 돈을 내던졌던 화가 최북, ‘가객원류’를 편찬한 가객 박효관 등은 저마다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했던 예인들이었다.
중인의 활약은 예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다. 침술의 대가 허임, 신의(神醫)라 불릴 만큼 의술이 뛰어났던 백광현, 전염병 마마로부터 왕실을 구한 유상,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천재 국수(國手) 유찬홍 등은 계급의 질곡에 맞섰던 전문지식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중인들의 활약은 대륙과 바다를 넘나들며 확대되었다. 17, 18세기 한류를 일으킨 역관시인 홍세태, 통신사 최고의 무예사절 마상재,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변수는 신분의 벽을 넘어 신세계를 꿈꾸었다. 책에 등장하는 중인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문헌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은 조금의 인위적 가감이나 재배치가 없다.
“조선의 문예부흥기였던 정조대왕 시대도 그 뒤안길에서 중인이 르네상스인으로 활동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이 시대에 중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