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 조선 … 사실은 동방노예지국?
조선노비열전
이상각 지음
이상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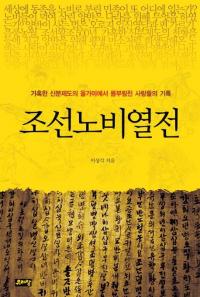 |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인데 재물로 취급하여 우마와 맞바꾸곤 합니다. 요즘에는 말 한 필로 노비 두세 명을 사고도 남으니 우마가 사람보다 귀중한 것입니까? 공자께서는 마구간이 불타자 ‘사람이 다쳤는가?’라고 물었을 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니, 곧 사람을 가축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노비 매매를 금하지 않으면 세상의 도리가 혼미해져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조선노비열전’ 중에서)
조선은 동방노예지국이었다? 무슨 말인가. 익히 아는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소 과장일지 모르지만 사회 신분제의 관점에서 조선이 노비사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노비여도 대대손손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속담에 “개 꼬리 삼 년 묵혀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다. 태생이 천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별 수 없다는 의미다. 조선시대 노비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이보다 안타까운 속담은 없을 듯하다.
저자는 조선 양반들이 고조선의 ‘팔조금법’을 들어 노비제도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본다. 고대 은나라 현자인 기자(箕子)가 사회정화와 문명 개조 차원에서 노비를 들여왔다는 것이다. ‘한서’에 수록된 팔조법금에 따르면 도둑질하다 잡힌 남자는 노(奴)가 되고 여자는 비(婢)가 되어야 했다. 또한 후대 부여에서는 살인자는 처형했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었다. 고구려 미천왕은 현토군을 공격해 8000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이 노비가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신라는 포로노비, 인신매매, 세습노비가 뒤섞인 노예국가의 전형이었다. 고려도 사노비와 공노비를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세습과 매매가 되었고 후자는 반역 등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신분이 바뀌었다.
조선 노비제도의 근간은 반상제(班常制)와 양천제(良賤制)의 이원적 구조였다. 법제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반상제를 내세우면서 양인과 천민이라는 양천제를 병행했다. 이후 양인은 다시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것은 양반·중인의 구분은 기득권층의 흥망성쇠와 연계되었다. 천민은 ‘인간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으로 규정되었는데 짐승처럼 거래되는 노비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강고한 신분제에서 대부분 노비들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위정자들은 시스템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기존 질서에 따르지 않는 ‘이단아’가 있기 마련. 제도의 허점이나 거센 저항을 통해 ‘팔자’를 바꾸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물론 성공한 이후에도 별종으로 취급되거나 비주류를 면하지 못했지만)
서인의 제갈량으로 통했던 송익필, 상례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던 유희경, 천재 시인 홍세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천민 출신에서 과학자로 발돋움한 장영실, 조선 최대 토목전문가 박자청, 침구술의 대가 의관 허임 등도 특별한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노비제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1729년(영조5) 경상도 울산 호적대장에는 양반호가 26.29%이던 것이 1867년(고종4년)에 65.48%로, 노비호는 13.93%에서 0.96%로 줄어들었다. 백성의 99%가 양인화되었다는 방증이다.
두 번의 큰 전쟁(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지배층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 시장경제의 발달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했다. 여기에 곡식을 헌납하면 면천을 허락하는 납속책의 시행과 국가 행정력이 미비로 신분세탁이 가능해진 탓이다. 결정적으로 노비제도가 철폐된 것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1894년(고종31년) 친일내각이 갑오객혁을 단행되면서였다.
저자는 조선의 멸망을 시대 탓이거나 외침으로 보지 않는다. “노비가 마소보다 싸구려로 팔릴 때가 조선의 전성기였다면 양반이 개잘량이라 조소받으며 곁불을 쬘 때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혹자는 시대를 말하고 외침을 들먹어지만 조선의 비정상적인 신분제도는 그 자체로 멸망의 씨앗을 잔뜩 품고 있었다.”
〈유리창·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은 동방노예지국이었다? 무슨 말인가. 익히 아는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소 과장일지 모르지만 사회 신분제의 관점에서 조선이 노비사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노비여도 대대손손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속담에 “개 꼬리 삼 년 묵혀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다. 태생이 천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별 수 없다는 의미다. 조선시대 노비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이보다 안타까운 속담은 없을 듯하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었다. 고구려 미천왕은 현토군을 공격해 8000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이 노비가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신라는 포로노비, 인신매매, 세습노비가 뒤섞인 노예국가의 전형이었다. 고려도 사노비와 공노비를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세습과 매매가 되었고 후자는 반역 등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신분이 바뀌었다.
조선 노비제도의 근간은 반상제(班常制)와 양천제(良賤制)의 이원적 구조였다. 법제적으로 양반과 상민의 반상제를 내세우면서 양인과 천민이라는 양천제를 병행했다. 이후 양인은 다시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것은 양반·중인의 구분은 기득권층의 흥망성쇠와 연계되었다. 천민은 ‘인간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으로 규정되었는데 짐승처럼 거래되는 노비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강고한 신분제에서 대부분 노비들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위정자들은 시스템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기존 질서에 따르지 않는 ‘이단아’가 있기 마련. 제도의 허점이나 거센 저항을 통해 ‘팔자’를 바꾸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물론 성공한 이후에도 별종으로 취급되거나 비주류를 면하지 못했지만)
서인의 제갈량으로 통했던 송익필, 상례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던 유희경, 천재 시인 홍세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천민 출신에서 과학자로 발돋움한 장영실, 조선 최대 토목전문가 박자청, 침구술의 대가 의관 허임 등도 특별한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노비제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1729년(영조5) 경상도 울산 호적대장에는 양반호가 26.29%이던 것이 1867년(고종4년)에 65.48%로, 노비호는 13.93%에서 0.96%로 줄어들었다. 백성의 99%가 양인화되었다는 방증이다.
두 번의 큰 전쟁(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지배층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 시장경제의 발달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했다. 여기에 곡식을 헌납하면 면천을 허락하는 납속책의 시행과 국가 행정력이 미비로 신분세탁이 가능해진 탓이다. 결정적으로 노비제도가 철폐된 것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1894년(고종31년) 친일내각이 갑오객혁을 단행되면서였다.
저자는 조선의 멸망을 시대 탓이거나 외침으로 보지 않는다. “노비가 마소보다 싸구려로 팔릴 때가 조선의 전성기였다면 양반이 개잘량이라 조소받으며 곁불을 쬘 때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혹자는 시대를 말하고 외침을 들먹어지만 조선의 비정상적인 신분제도는 그 자체로 멸망의 씨앗을 잔뜩 품고 있었다.”
〈유리창·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