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 있으라 … 침묵하면 비극은 또 일어난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프리모 레비 지음·이소영 옮김
프리모 레비 지음·이소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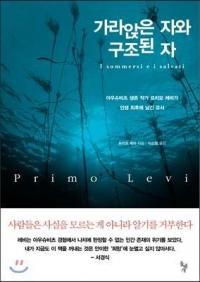 |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는 유대인, 집시, 장애인, 성적 소수자, 정치적 반대파 등이 대량학살됐다.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재앙이다.
유대계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1919∼1987)는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다. 그는 1947년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 문학의 고전 ‘이것이 인간인가’를 펴냈다.
20세기 처참한 정치 폭력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의 책무로 받아들였던 그가 수용소에서 풀려난지 40년만인 1987년 발표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가 번역·출간됐다. 저자는 책 출간 1년 후 토리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작 ‘이것이 인간인가’가 그랬듯, 책은 생생한 수용소의 삶과 나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는 수용소안에서 인간 존재의 위기를 보았고, 이후 철저한 자기 성찰과 비판 정신으로 그 질문을 현재의 우리에게 던진다.
책은 서문과 ‘상처의 기억’을 시작으로 회색지대, 수치, 소통하기, 쓸 데없는 폭력, 아우슈비츠의 지식인 등 8장과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수용소의 ‘고문자’에 집착하지만 ‘아우슈비츠는 나와 당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한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 평균적 인간이었고, 평균적 지능을 지녔고 평균적으로 약한 사람들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정신적 나태함 때문에, 근시안적 타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국민적 자부심 때문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은 2장 ‘회색지대’다. 출간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수용소에서 처음 받은 위협, 첫 모욕, 첫 구타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자신과 똑같은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동료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그는 억압의 체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체제를 닮아 가는지에 대해, 권력과 위신에 쉽게 현혹되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결론에서 말한다.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불관용과 권력에 대한 욕망, 경제적 이유,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광신, 인종적 마찰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조류 속에서 미래에 면역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벼리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삶과 저작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서경석은 “실제 경험, 폭넓은 지식과 교양, 안이한 선입견을 배제한 과학자의 고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사고, 그 바탕에 대한 깔려 있는 ‘인간성’에 대한 이유 있는 절망과 힘겨운 기대로 가득찬 글”이라고 추천했다.
〈돌베개·1만 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대계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1919∼1987)는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다. 그는 1947년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 문학의 고전 ‘이것이 인간인가’를 펴냈다.
전작 ‘이것이 인간인가’가 그랬듯, 책은 생생한 수용소의 삶과 나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는 수용소안에서 인간 존재의 위기를 보았고, 이후 철저한 자기 성찰과 비판 정신으로 그 질문을 현재의 우리에게 던진다.
저자는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수용소의 ‘고문자’에 집착하지만 ‘아우슈비츠는 나와 당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한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 평균적 인간이었고, 평균적 지능을 지녔고 평균적으로 약한 사람들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정신적 나태함 때문에, 근시안적 타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국민적 자부심 때문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은 2장 ‘회색지대’다. 출간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수용소에서 처음 받은 위협, 첫 모욕, 첫 구타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자신과 똑같은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동료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그는 억압의 체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체제를 닮아 가는지에 대해, 권력과 위신에 쉽게 현혹되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결론에서 말한다.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불관용과 권력에 대한 욕망, 경제적 이유,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광신, 인종적 마찰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조류 속에서 미래에 면역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벼리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삶과 저작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서경석은 “실제 경험, 폭넓은 지식과 교양, 안이한 선입견을 배제한 과학자의 고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사고, 그 바탕에 대한 깔려 있는 ‘인간성’에 대한 이유 있는 절망과 힘겨운 기대로 가득찬 글”이라고 추천했다.
〈돌베개·1만 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